목차
Ⅰ. 이육사의 약력과 업적
Ⅱ. 이육사의 시와 주리론에서 ꡐ이(理)ꡑ의 성격
1. ꡐ이귀기천(理貴氣賤)ꡑ과 시어
2. ꡐ형이상자(形而上者)ꡑ와 이미지
Ⅲ. 이육사의 작품 연구
1. 청포도
2. 절정
3. 시와 초극 의지
4. 자유 신문과 그 외의 것들
Ⅳ. 이육사의 시 평가
참고문헌
Ⅱ. 이육사의 시와 주리론에서 ꡐ이(理)ꡑ의 성격
1. ꡐ이귀기천(理貴氣賤)ꡑ과 시어
2. ꡐ형이상자(形而上者)ꡑ와 이미지
Ⅲ. 이육사의 작품 연구
1. 청포도
2. 절정
3. 시와 초극 의지
4. 자유 신문과 그 외의 것들
Ⅳ. 이육사의 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슴을 열고 고달픈 나그네를 맞아들여 휴식과 위안(慰安)을 제공해 주는 고장(故障)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고장이 맞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서 한가롭게 놀다가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의 고달픔은 그러나 뜻있는 삶을 영위(榮衛)하는 과정에서 생긴 고달픈 몸이므로 그는 고통과 절망의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청포를 입은 희망의 사자(使者)로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포의 나그네는 어디까지나 손님이니까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뒤 언제든지 때가 오면 또다시 자신의 과업(課業)을 성취하기 위해 떠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청포도 고장에서 청포의 나그네를 맞아 베푸는 잔치는 은쟁반이니 모시수건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사치하지도 지나치게 구차하지도 않은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향연(香煙)인 것이다.
이 작품이 설정하는 내 고장은 아마도 유년(幼年)의 육사가 체험하였을, 그리고 어두운 시대의 억압을 벗어나 회복되어야 할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만만치 않은 것은 여기를 찾아오리라는 고달픈 손님의 의미이다. 그는 이 화해로운 삶의 자리와 분리되어 유랑(流浪)하는 고달픈 장이다. 이 괴로운 분열이 육사가 체험했던 당대 현실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때, 투쟁(鬪爭)하는 지사들은 고달픈 손님을 포괄(包括)하는 의미의 일부일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조국 광복을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比喩)를 통해 드러낸 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님을 기다리는 한국적 여인상이 이 시에 나타나면서 이 시를 읽는 나에게 촉촉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느낌이 매우 좋았다. 일본 군국주의의 파시즘화로 인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문제의 지배에 의한 탄압의 기둥은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1930년대 중반까지 진보적인 문학 운동을 이끌어 왔던 카프가 해산됨에 따라 문학 운동의 중심이 해체되었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은 불가능해 졌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창작(創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시인이나 작가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시인, 소설가들이 진보적인 세계관과 민족 해방에의 의욕(意慾)을 상실한 채 체제 속으로 편입(編入)되어 갔고, 설사 그러한 길을 밟지 않은 시인과 작가일지라도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沈潛)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2.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①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상징시, 참여시
③ 성격 : 지사적, 상징적, 저항적, 남성적, 의지적
④ 율격 : 내재율, 4음보의 한시적 율격
⑤ 어조 : 절제된 균형 감각 속에 비장감을 지닌 지사적, 대륙적, 남성적 어조
⑥ 심상 : 미각적, 촉각적 심상
⑦ 제재 : 겨울(현실적 극한 상황)
⑧ 주제 : 압제의 절박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
일제 강점기에는 혹독한 식민지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생계 수단을 잃고 만주, 북간도 등지로 살 길을 찾아 떠나갔다. 이 시는 그 절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현실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상황이 극한적인 만큼 그에 맞서려는 의지 또한 절정에 이른 것이다. 이 시의 구조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이라는 한시의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연이 극한 상황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라면, 2연은 그 극한적인 상태의 최첨단에 시인이 서 있음을 나타낸다. 3연은 이러한 극한적 상황에 대한 내면적 인식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4연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아울러 마침내, 휩쓸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서릿발 칼날진, 강철로 된같은 수식구들이 논리적 의미를 크게 보강하여 함축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강철로 된 무지개는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절로, 강철의 강인하고 어두운 이미지와 무지개의 현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결합시켜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낸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 이 시는 간결한 시행으로 생략과 압축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극의 극한점에 선 한 인간의 심경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서정적 자아는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비극의 극한점에서 오히려 달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즉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겨울을 무지개로 보고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구조(짜임)로 보아 셋째 연의 둘째 줄이 절정에 해당하며, 여기야말로 현실의 막다른 곳,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넷째 연의 첫째 줄은 시상이 전환되는 곳으로 눈 감아 생각해 봄으로써 새로운 세계에로의 개안이 이루어진다. 절망뿐인 현실에서 초월의 세계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시인의 의식 공간과 현실적 삶의 영역이 축소·무화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투쟁적 삶을 새로이 확대시키는 역설과 변증법적 초월의 세계를 제시했다.
3. 시와 초극 의지
이육사의 시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과 자기 확인의 과정을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던 시인의 정신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의 확립과 그 인식은 자아의식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현실이 함께 포괄되고 있다. 그의 시 세계가 정신적인 자기 확립의 단계에 들어설 무렵에 이루어진 「노정기(路程記)」와 같은 작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여진 배쪼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였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올랐다.
항상 흐렷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이 작품이 설정하는 내 고장은 아마도 유년(幼年)의 육사가 체험하였을, 그리고 어두운 시대의 억압을 벗어나 회복되어야 할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만만치 않은 것은 여기를 찾아오리라는 고달픈 손님의 의미이다. 그는 이 화해로운 삶의 자리와 분리되어 유랑(流浪)하는 고달픈 장이다. 이 괴로운 분열이 육사가 체험했던 당대 현실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때, 투쟁(鬪爭)하는 지사들은 고달픈 손님을 포괄(包括)하는 의미의 일부일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조국 광복을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比喩)를 통해 드러낸 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님을 기다리는 한국적 여인상이 이 시에 나타나면서 이 시를 읽는 나에게 촉촉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느낌이 매우 좋았다. 일본 군국주의의 파시즘화로 인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문제의 지배에 의한 탄압의 기둥은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1930년대 중반까지 진보적인 문학 운동을 이끌어 왔던 카프가 해산됨에 따라 문학 운동의 중심이 해체되었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은 불가능해 졌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창작(創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시인이나 작가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시인, 소설가들이 진보적인 세계관과 민족 해방에의 의욕(意慾)을 상실한 채 체제 속으로 편입(編入)되어 갔고, 설사 그러한 길을 밟지 않은 시인과 작가일지라도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沈潛)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2.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①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상징시, 참여시
③ 성격 : 지사적, 상징적, 저항적, 남성적, 의지적
④ 율격 : 내재율, 4음보의 한시적 율격
⑤ 어조 : 절제된 균형 감각 속에 비장감을 지닌 지사적, 대륙적, 남성적 어조
⑥ 심상 : 미각적, 촉각적 심상
⑦ 제재 : 겨울(현실적 극한 상황)
⑧ 주제 : 압제의 절박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
일제 강점기에는 혹독한 식민지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생계 수단을 잃고 만주, 북간도 등지로 살 길을 찾아 떠나갔다. 이 시는 그 절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현실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상황이 극한적인 만큼 그에 맞서려는 의지 또한 절정에 이른 것이다. 이 시의 구조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이라는 한시의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연이 극한 상황을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라면, 2연은 그 극한적인 상태의 최첨단에 시인이 서 있음을 나타낸다. 3연은 이러한 극한적 상황에 대한 내면적 인식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4연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아울러 마침내, 휩쓸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서릿발 칼날진, 강철로 된같은 수식구들이 논리적 의미를 크게 보강하여 함축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강철로 된 무지개는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절로, 강철의 강인하고 어두운 이미지와 무지개의 현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결합시켜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낸 역설적 표현인 것이다. 이 시는 간결한 시행으로 생략과 압축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극의 극한점에 선 한 인간의 심경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서정적 자아는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비극의 극한점에서 오히려 달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즉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겨울을 무지개로 보고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구조(짜임)로 보아 셋째 연의 둘째 줄이 절정에 해당하며, 여기야말로 현실의 막다른 곳,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넷째 연의 첫째 줄은 시상이 전환되는 곳으로 눈 감아 생각해 봄으로써 새로운 세계에로의 개안이 이루어진다. 절망뿐인 현실에서 초월의 세계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시인의 의식 공간과 현실적 삶의 영역이 축소·무화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투쟁적 삶을 새로이 확대시키는 역설과 변증법적 초월의 세계를 제시했다.
3. 시와 초극 의지
이육사의 시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과 자기 확인의 과정을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던 시인의 정신이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의 확립과 그 인식은 자아의식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상으로서의 현실이 함께 포괄되고 있다. 그의 시 세계가 정신적인 자기 확립의 단계에 들어설 무렵에 이루어진 「노정기(路程記)」와 같은 작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여진 배쪼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였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올랐다.
항상 흐렷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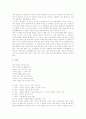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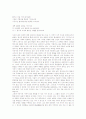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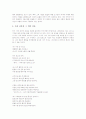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