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생애
(1)청소년 수학기
(2)경원류배와 두문불출
(3)영덕류배와 은둔기
(4)재출사와 논쟁기
2.시대적 배경
(1)광해군의 난정과 병진소의 파문
(2)병자호란과 고산의 대응활동
3.문학관
(1)시, 가에 대한 기본 인식
(2)도본문말론
4.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1)작가론적 접근
2.작품론적 관점
(1)자연관
(2)어부사시사
5.작품연구
(1)사상적 배경
1)불교적 작품
2)도가적 작품
(3)유교적 작품
6.시조작품론
(1)의의식의 탐구
(1)자연, 서경적인 작품
(2)생활, 서정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3)리념, 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
6.고산에 대한 종합적 이해
참고문헌
(1)청소년 수학기
(2)경원류배와 두문불출
(3)영덕류배와 은둔기
(4)재출사와 논쟁기
2.시대적 배경
(1)광해군의 난정과 병진소의 파문
(2)병자호란과 고산의 대응활동
3.문학관
(1)시, 가에 대한 기본 인식
(2)도본문말론
4.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1)작가론적 접근
2.작품론적 관점
(1)자연관
(2)어부사시사
5.작품연구
(1)사상적 배경
1)불교적 작품
2)도가적 작품
(3)유교적 작품
6.시조작품론
(1)의의식의 탐구
(1)자연, 서경적인 작품
(2)생활, 서정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3)리념, 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
6.고산에 대한 종합적 이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사용하여 장난삼아 우선사를 짓고 이해창에게 회답을 바란다”는 뜻의 내용이다. 이 작품은 물과 구름 속에 띠집지어 살고 거칠지만 자연식물 그대로 먹고 살며 낮에는 술잔이나 기울이며 기자곡을 연주하고 밤에는 관솔불 옆에서 주역을 읽는 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선놀음이다. 또 자기자신을 소옹과 두씨노인에 비유한 것도 특이할 만하다. 소동파는 산수의 경치 좋은 영주에 설당을 짓고 살았고 두보에게는 간신들이 임금의 밝은 총명을 가린다고 불평한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니 고산이 그 옛날의 중국 선인들의 시나 두보에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에서 현주는 제사를 지낼 때 술대신에 사용하는 맑은 물을 가리킨다. 이를 무슬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흔히 속인들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맑은 물일 뿐인 신선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선의 삶을 누렸다는 소식과 두보의 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선유와 비기고 있다. 이어서 ‘옥을 먹고 산다’함은 선인의 삶을 가리킨 손옥을 의미한다. ‘선술에 능한 살마은 옥을 먹고 산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말이다.
그리고 연단은 옛날 도가에서 장생불사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남전사는 옥의 산출로 유명하여 예부터 남전출옥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명산을 말하고 참동계는 한나라의 우백양이 주역의 효상을 빌려 쇠 부리는 법을 쓴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두 도가에서 이르는 말인데 고산이 참동계의 내용을 익히겠다고 함은 도가의 책에 심취하고자 함을 뜻하는 것이다.
위 시에서 ‘월굴’은 달 속에 있다는 바위굴을 가리키는데 월굴은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곳이다. 당나라의 이백이 그의 시에서 ‘목이 마르면 월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요기한다’고 함은 이같은 신선들의 삶을 형용한 시구이다.
그리고 ‘금정’은 불로불사약을 연단한다는 솥이고 ‘낭풍’은 요지와 함께 쓰이는 선어로서 신선이 산다는 곳이며 ‘현포’ 역시 중국 곤륜산 위에 있는 신선이 거처한다는 선향이다. 아울러 ‘봉애’와 ‘영주’도 방장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진 신선세계의 지칭이다. 이 작품에서 윤선도는 도가에서 말하는 선계의 가지가지를 들어 자신의 취향을 시에 담았다. 이로 보아 사상적 배경으로 도교 사상의 영향이 적지않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3)유교적 작품
수신하는 대법은 <소학> 한 권에 거의 다 있고 나라를 위하는 태도는 <중용>과 <대학>의 두 글이면 족합니다.......
이는 고산이 66세때 시급한 일 여덟가지를 들어 효종에게 올린 <진시무팔조서> 가운데 <전학유요>의 부분인데 이를 보면 유가서의 기본이 되는 사서삼경을 수신고 치국의 대요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학>은 례의범절과 수신도덕의 격언, 그리고 충신, 효자의 사적 등을 유교경전을 비롯한 고금의 へ에서 뽑아 엮은 것이므로 오히려 유교서의 표본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산은 윤리실천의 교과서로 그처럼 <소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그는 위의 글에서 유학의 중심과제는 원래 수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치국평천하에 이른 실천인데 이를 위한 학문의 길은 중용과 대학이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처럼 사서삼경의 가르침을 수신과 정치, 아울러 문학의 지침서로 삼았기 때문에 고산의 정신적 이념과 그 실천에 유학을 주된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서 효제충신이나 인, 의, 예, 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는 많이 있다. 인간의 오륜을 추구하면서 인과 예를 기본으로 한 공자와 맹자의 철학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예를 들면
어버이 그릴 줄 처음부터 알건마는
임 향한 뜻도 하늘이 낳으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인가 여기네
32세때 경원에 유배되어 지은 <견회요> 5수 중 3수가 충효의식을 주제로 한 시인데 그 중에 하나이다. 이 무렵에 지은 차낙망운에서 ‘오직 나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몸 가벼이 하기는 쉽고 어버이의 그림움 때문에 눈물 참기는 어렵네’지록애국경신이 종위사친인루난
라고 한 작품은 모두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한 윤리관에서 나온 것이다. 또 60세때 자신의 회포를 읊은 <용전운령회>의 함련에서 ‘의는 곧 사나이 나아가는 길이요, 인은 천하대장부의 살 집입니다’의시남자로 인위천하대장부거
라 한 시구는 유학에서 인간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던 인의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6.시조작품론
(1)의의식의 탐구
(1)자연, 서경적인 작품
츄셩딘호루 밧긔 우러녜 뎌시내야
무 호리라 듀야의 흐르다
님 향 내 뜯을 조차 그칠 뉘 모로다견회요<3>
뫼 길고길고 믈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디셔 외기러기 울고울고 가니견회요<4>
여기 작품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은 뫼, 물, 외기러기등이 있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어떤 미의식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견회요3>은 충으로 충만된 사상의 표출이다. 비록 나라의 최북단에 와있어도 임금을 그리는 연군지정은 변함이 없다는 고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것>은 주야로 울면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은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현실에서의 부조화를 그대로 반영한 예는 시냇물이다. 즉 전자는 근워적으로 현실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의 갈등이 ‘비장미’로 나타난다. 더구나 그것은 임향한 내 뜻과 합일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미’인 것이다. 그러니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견회요4>에서 <현실적인 것>은 어버이에 대한 효성심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이고 <이상적인 것>은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문맥을 미루어 보면 어버이께 효도할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사친이효’를 아는 이상적 유교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적인 것>에의 축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슬픔과 고독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영원히 상충되고 모순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비장미를 형성시킨다.
산슈간 바회아래 띠집을 짓노라 니
그 모든 들은
시에서 현주는 제사를 지낼 때 술대신에 사용하는 맑은 물을 가리킨다. 이를 무슬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흔히 속인들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맑은 물일 뿐인 신선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선의 삶을 누렸다는 소식과 두보의 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선유와 비기고 있다. 이어서 ‘옥을 먹고 산다’함은 선인의 삶을 가리킨 손옥을 의미한다. ‘선술에 능한 살마은 옥을 먹고 산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말이다.
그리고 연단은 옛날 도가에서 장생불사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남전사는 옥의 산출로 유명하여 예부터 남전출옥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명산을 말하고 참동계는 한나라의 우백양이 주역의 효상을 빌려 쇠 부리는 법을 쓴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두 도가에서 이르는 말인데 고산이 참동계의 내용을 익히겠다고 함은 도가의 책에 심취하고자 함을 뜻하는 것이다.
위 시에서 ‘월굴’은 달 속에 있다는 바위굴을 가리키는데 월굴은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곳이다. 당나라의 이백이 그의 시에서 ‘목이 마르면 월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요기한다’고 함은 이같은 신선들의 삶을 형용한 시구이다.
그리고 ‘금정’은 불로불사약을 연단한다는 솥이고 ‘낭풍’은 요지와 함께 쓰이는 선어로서 신선이 산다는 곳이며 ‘현포’ 역시 중국 곤륜산 위에 있는 신선이 거처한다는 선향이다. 아울러 ‘봉애’와 ‘영주’도 방장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진 신선세계의 지칭이다. 이 작품에서 윤선도는 도가에서 말하는 선계의 가지가지를 들어 자신의 취향을 시에 담았다. 이로 보아 사상적 배경으로 도교 사상의 영향이 적지않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3)유교적 작품
수신하는 대법은 <소학> 한 권에 거의 다 있고 나라를 위하는 태도는 <중용>과 <대학>의 두 글이면 족합니다.......
이는 고산이 66세때 시급한 일 여덟가지를 들어 효종에게 올린 <진시무팔조서> 가운데 <전학유요>의 부분인데 이를 보면 유가서의 기본이 되는 사서삼경을 수신고 치국의 대요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학>은 례의범절과 수신도덕의 격언, 그리고 충신, 효자의 사적 등을 유교경전을 비롯한 고금의 へ에서 뽑아 엮은 것이므로 오히려 유교서의 표본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산은 윤리실천의 교과서로 그처럼 <소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그는 위의 글에서 유학의 중심과제는 원래 수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치국평천하에 이른 실천인데 이를 위한 학문의 길은 중용과 대학이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처럼 사서삼경의 가르침을 수신과 정치, 아울러 문학의 지침서로 삼았기 때문에 고산의 정신적 이념과 그 실천에 유학을 주된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서 효제충신이나 인, 의, 예, 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는 많이 있다. 인간의 오륜을 추구하면서 인과 예를 기본으로 한 공자와 맹자의 철학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예를 들면
어버이 그릴 줄 처음부터 알건마는
임 향한 뜻도 하늘이 낳으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인가 여기네
32세때 경원에 유배되어 지은 <견회요> 5수 중 3수가 충효의식을 주제로 한 시인데 그 중에 하나이다. 이 무렵에 지은 차낙망운에서 ‘오직 나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몸 가벼이 하기는 쉽고 어버이의 그림움 때문에 눈물 참기는 어렵네’지록애국경신이 종위사친인루난
라고 한 작품은 모두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한 윤리관에서 나온 것이다. 또 60세때 자신의 회포를 읊은 <용전운령회>의 함련에서 ‘의는 곧 사나이 나아가는 길이요, 인은 천하대장부의 살 집입니다’의시남자로 인위천하대장부거
라 한 시구는 유학에서 인간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던 인의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6.시조작품론
(1)의의식의 탐구
(1)자연, 서경적인 작품
츄셩딘호루 밧긔 우러녜 뎌시내야
무 호리라 듀야의 흐르다
님 향 내 뜯을 조차 그칠 뉘 모로다견회요<3>
뫼 길고길고 믈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디셔 외기러기 울고울고 가니견회요<4>
여기 작품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은 뫼, 물, 외기러기등이 있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 어떤 미의식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견회요3>은 충으로 충만된 사상의 표출이다. 비록 나라의 최북단에 와있어도 임금을 그리는 연군지정은 변함이 없다는 고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것>은 주야로 울면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은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현실에서의 부조화를 그대로 반영한 예는 시냇물이다. 즉 전자는 근워적으로 현실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의 갈등이 ‘비장미’로 나타난다. 더구나 그것은 임향한 내 뜻과 합일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미’인 것이다. 그러니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견회요4>에서 <현실적인 것>은 어버이에 대한 효성심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이고 <이상적인 것>은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문맥을 미루어 보면 어버이께 효도할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사친이효’를 아는 이상적 유교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적인 것>에의 축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슬픔과 고독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영원히 상충되고 모순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비장미를 형성시킨다.
산슈간 바회아래 띠집을 짓노라 니
그 모든 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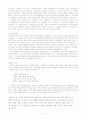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