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흥부전
1) 작품해설
2) 형성과 발전과정
3) 근원설화 유형
< 다른 작품군과 비교 >
Ⅱ. 흥보씨
1) 줄거리
2) 등장인물 분석
3) 재해석
Ⅲ. 흥부전의 재해석 놀부뎐
1) 줄거리
2) 서사구조
3) 원전과의 비교
4) 의의 1.2.3
5) 특징 1.2.3
6) 정리
1) 작품해설
2) 형성과 발전과정
3) 근원설화 유형
< 다른 작품군과 비교 >
Ⅱ. 흥보씨
1) 줄거리
2) 등장인물 분석
3) 재해석
Ⅲ. 흥부전의 재해석 놀부뎐
1) 줄거리
2) 서사구조
3) 원전과의 비교
4) 의의 1.2.3
5) 특징 1.2.3
6) 정리
본문내용
이삭 빼기 등 놀부의 심술이 오해라는 대변을 한다.
최인훈은 놀부뎐에서 고전 모티브와 동일한 행동의 결과 앞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흥부전과 놀부뎐은 차이가 없지만 행동의 동기에 있어서는 흥부전에 반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상난 집에서 춤을 추기는 추되, ‘남의 빚 못 갚는 신세에 상감국상 치르듯’ 허례허식 하는 집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또 해산한 집에서 개, 닭을 잡되 ‘미역 꼬투리 하나 없어소 피기 한답시고 개보살 꼬꾜신주 모시는’ 비합리적인 미신을 믿고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흥부가 가난하다가 횡재를 한다거나, 놀부가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가 흥부전과 놀부뎐에서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며 결과에 따른 과정과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액자식 구성과 놀부의 시점을 통한 패러디
이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이 사실과는 다르며 그래서 고전소설 흥부전의 감추어진 일면을 다시 밝힌다’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흥부전을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흥부전이 허구일 따름임을 밝히는 겉 구조와 실제의 흥부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속구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의 방법과 놀부의 시점을 채택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비판
현실의 삶은 그대로 반복되며 문학예술은 그 파편화된 삶을 완결된 꿈의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삶을 끊임없이 환기하게 한다는 문학관, 혹은 세계관이 내재해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문학을 이원화시키고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회의하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징)
- 주제에 인해서의 반전의 문제
흥부전에서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독자는 없겠지만 패러디 텍스트의 주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흥부전에서의 주제는 고전의 전형적인 주제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놀부뎐에서 최인훈은 권선징악의 주제가 아닌 선인도 악인도 비극적 결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패러디텍스트 <놀부뎐>의 흥부와 놀부 옥사장면에 있어서이다.
그들은 옥사에 갇혀 있을 때 관리들이 돈을 갈취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고 놀부의 재물을 모두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최인훈은 봉건적 폐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현실적 세계관의 회복
흥부전에서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은 제비가 물어다준 보은박씨 때문이었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고 그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보은박씨를 물어다주고, 열린 박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흥부가 제비의 박씨라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몰락한 양반이 숨겨놓은 재물을 우연히 얻어 부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인식의 재비판
놀부뎐에서 게으르고 헤픈 흥부에 비해서 독자에게 긍정적 인물로 인식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독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다. 즉 그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인물이라고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물질 ‘돈’인 것이다. 여기에서 놀부의 결과 중심적인 경제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놀부는 모진 마음 독한 심사 도사려 먹고 남 잡으며 사는 길도 저 주기 십상이라 고 탄식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과 더불어 돈을 중요하지만 놀부는 과정과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시대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독자는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결과 중심의 경제관을 놀부의 모습을 통해 비판할 수 있다. 즉 놀부뎐에서는 놀부를 원텍스트보다는 긍정적으로 변명하고 끌어올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놀부를 결과 중심적인 물질만능주의자로 그림으로써 독자에게 현실 인식의 재피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
옥중 원혼이 된 놀부를 화자로 삼아 ‘세상의 벗님네’라는 가상의 독자를 향해 <흥부전>을 뒤집어 읽고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노출된 작품이다.
원전의 놀부 심술 묘사 장면을 방불케 하는 흥부의 거동 묘사를 통해 흥부의 게으름과 무능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흥부를 내치고 각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놀부의 본심을 작가가 나서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놀부의 실용적인 가치관, 비판적인 현실 인식은 세상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각자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또, 원전과는 달리 흥부의 처는 희화화된 인물로, 놀부의 처는 근면하고 후덕한 인물로 바꾸어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물 성격의 변개는 행/불행이 역전되는 원전의 서사 단락 내용을 전도시킨 것과 맞물린다. 제비의 박씨로 인한 사건의 전환이 아니라 흥부가 산에서 발견한 보물 궤짝으로 인해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제비의 박씨는 나무하러 간 흥부가 우연히 발견한 파직된 양반이 숨겨 놓았던 보물로 바뀐다. 제비의 박씨 덕이라는 흥부의 말을 믿지 않는 놀부가 보물 궤짝을 제자리에 두려고 갔다가 당하게 되는 옥고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놀부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 된다. 동시에 권선징악의 고전적 논리가 사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놀부가 악인상의 대표로 그려진 것을 주변 인물과 무책임한 작가들의 탓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반, 벼슬아치, 글쟁이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놀부는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긍정적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된 기인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결말에서 놀부가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를 부정하고 세상의 오묘한 이치에 대하여 생각에 잠기는 모습은 바로 작품의 주제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판소리 문체를 차용하고 부분적으로 시조를 첨가하여 인물의 내면에 담긴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를 원용한 작가의 수준 높은 창작 기법이라 여겨진다.
최인훈은 놀부뎐에서 고전 모티브와 동일한 행동의 결과 앞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흥부전과 놀부뎐은 차이가 없지만 행동의 동기에 있어서는 흥부전에 반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상난 집에서 춤을 추기는 추되, ‘남의 빚 못 갚는 신세에 상감국상 치르듯’ 허례허식 하는 집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또 해산한 집에서 개, 닭을 잡되 ‘미역 꼬투리 하나 없어소 피기 한답시고 개보살 꼬꾜신주 모시는’ 비합리적인 미신을 믿고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흥부가 가난하다가 횡재를 한다거나, 놀부가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가 흥부전과 놀부뎐에서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며 결과에 따른 과정과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액자식 구성과 놀부의 시점을 통한 패러디
이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이 사실과는 다르며 그래서 고전소설 흥부전의 감추어진 일면을 다시 밝힌다’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흥부전을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흥부전이 허구일 따름임을 밝히는 겉 구조와 실제의 흥부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속구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의 방법과 놀부의 시점을 채택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현된다.
비판
현실의 삶은 그대로 반복되며 문학예술은 그 파편화된 삶을 완결된 꿈의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삶을 끊임없이 환기하게 한다는 문학관, 혹은 세계관이 내재해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문학을 이원화시키고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회의하는 허무주의적 세계관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징)
- 주제에 인해서의 반전의 문제
흥부전에서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독자는 없겠지만 패러디 텍스트의 주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흥부전에서의 주제는 고전의 전형적인 주제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놀부뎐에서 최인훈은 권선징악의 주제가 아닌 선인도 악인도 비극적 결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패러디텍스트 <놀부뎐>의 흥부와 놀부 옥사장면에 있어서이다.
그들은 옥사에 갇혀 있을 때 관리들이 돈을 갈취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고 놀부의 재물을 모두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최인훈은 봉건적 폐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현실적 세계관의 회복
흥부전에서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은 제비가 물어다준 보은박씨 때문이었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고 그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보은박씨를 물어다주고, 열린 박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흥부가 제비의 박씨라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몰락한 양반이 숨겨놓은 재물을 우연히 얻어 부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인식의 재비판
놀부뎐에서 게으르고 헤픈 흥부에 비해서 독자에게 긍정적 인물로 인식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독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다. 즉 그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인물이라고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물질 ‘돈’인 것이다. 여기에서 놀부의 결과 중심적인 경제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놀부는 모진 마음 독한 심사 도사려 먹고 남 잡으며 사는 길도 저 주기 십상이라 고 탄식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과 더불어 돈을 중요하지만 놀부는 과정과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시대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독자는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결과 중심의 경제관을 놀부의 모습을 통해 비판할 수 있다. 즉 놀부뎐에서는 놀부를 원텍스트보다는 긍정적으로 변명하고 끌어올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놀부를 결과 중심적인 물질만능주의자로 그림으로써 독자에게 현실 인식의 재피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
옥중 원혼이 된 놀부를 화자로 삼아 ‘세상의 벗님네’라는 가상의 독자를 향해 <흥부전>을 뒤집어 읽고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노출된 작품이다.
원전의 놀부 심술 묘사 장면을 방불케 하는 흥부의 거동 묘사를 통해 흥부의 게으름과 무능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흥부를 내치고 각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놀부의 본심을 작가가 나서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놀부의 실용적인 가치관, 비판적인 현실 인식은 세상 인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각자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또, 원전과는 달리 흥부의 처는 희화화된 인물로, 놀부의 처는 근면하고 후덕한 인물로 바꾸어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인물 성격의 변개는 행/불행이 역전되는 원전의 서사 단락 내용을 전도시킨 것과 맞물린다. 제비의 박씨로 인한 사건의 전환이 아니라 흥부가 산에서 발견한 보물 궤짝으로 인해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제비의 박씨는 나무하러 간 흥부가 우연히 발견한 파직된 양반이 숨겨 놓았던 보물로 바뀐다. 제비의 박씨 덕이라는 흥부의 말을 믿지 않는 놀부가 보물 궤짝을 제자리에 두려고 갔다가 당하게 되는 옥고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놀부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 된다. 동시에 권선징악의 고전적 논리가 사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놀부가 악인상의 대표로 그려진 것을 주변 인물과 무책임한 작가들의 탓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반, 벼슬아치, 글쟁이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놀부는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긍정적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된 기인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결말에서 놀부가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를 부정하고 세상의 오묘한 이치에 대하여 생각에 잠기는 모습은 바로 작품의 주제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판소리 문체를 차용하고 부분적으로 시조를 첨가하여 인물의 내면에 담긴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를 원용한 작가의 수준 높은 창작 기법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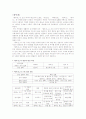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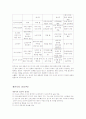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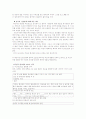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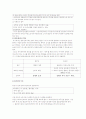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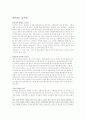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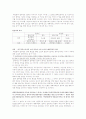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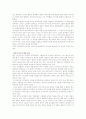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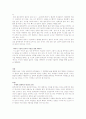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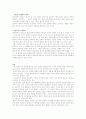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