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본문내용
였다 함.
에 가시어 락음수 락(악)음수: 미풍이 닿으면 나뭇잎이 움직여 우아한 소리가 난다는 데서 이 이름이 붙음.
아래 계신 큰 비구 팔천 명과 함께 있으시더니 보살 보살: [범] Bodhisattva.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을 뜻하나 이후 불교의 발전에 따라 흔히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다름의 경지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을 뜻하게 됨. (=보리살타, 보살마하살, 각유정)
마하살 마하살: [범] Mah sattva. 마하살타의 준말로 큰 보살 혹은 보살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부처를 제하고 중생 가운데서 맨 윗자리에 있으므로 대(大)자를 더해 대중생(大衆生), 대유정(大有情), 대사(大士)의 뜻을 지님. \'마하\'는 대(大), 다(多), 승(勝)의 의미를 지님.
삼만 육천과
<형태소 분석>
● 가샤: 가- +샤(주체높임 선어말어미)
● 겨샤: 겨시- 겨시다: ‘계시다’의 옛말.
+아(연결어미)
● 굴근: 굵- 굵-: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형용사 ‘굵다’의 어원을 석보상절의 ‘굴근’의 ‘굵-’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의미는 ‘크다’이다.
+은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 쓰인다.
● : 교재에는 ‘함께’라고 해석이 되어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 ‘한데’의 옛말로 ‘한 곳에’, ‘한 군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 (관형사) +(의존명사)
● 잇더시니 잇더시니: 현대국어에서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가 회상법의 선어말어미의 앞에 오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 반대이다.
: 잇- +더(회상법 선어말어미)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니(연결어미)
원문: 摩망訶항薩 굴근 菩뽕薩이시다 논 마리라
해석: 마하살은 큰 보살이시다 하는 말이다.
<형태소 분석>
● 이시다: 이(서술격조사)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다(평서형 종결어미)
● 논: - 다: ‘하다’의 옛말. (cf. 하다는 ‘많다’의 옛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오(대상법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마리라: 말 +이(서술격조사) +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國귁王과 大뗑臣씬과 婆빵羅랑門문과 居겅士와
해석: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 바라문: 고대 인도의 가장 높은 지위인 승려 계급으로 제사와 교법을 다스림.
(승려)과 거사와
※ 공동격조사인 ‘와/과’의 쓰임이 드러난다. 체언의 음운조건에 따라 모음어간인 경우, 체언 말음이 ‘ㄹ’일 경우에는 ‘와’를 쓰고, 체언의 음운조건에 따라 자음어간인 경우에는 ‘과’를 쓴다.
원문: 居겅는 살씨니 居겅士 쳔 만히 두고 가며 사 사미라
해석: 거는 사는 것이니 거사는 재물을 많이 두고 부요(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
<형태소 분석>
● 살씨니 살씨니: ‘살-’의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본다.
: 살- +ㄹ(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ㅣ(서술격조사) +니(연결어미)
● 가며: 가며- 가며다: \'가멸다\'의 옛말. (부유하다는 뜻.) ‘가멸다’ 혹은 ‘가며다’로 쓰였다.
+어(부사 파생 접미사)
● 사: 사-(살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사미라: 사 +이(서술격조사) +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天텬龍 夜양叉창 人非빙人 等등 無뭉量량 大땡衆O이 恭공敬경야 園繞거늘
해석: 천룡 야차 야차 :[범] Yaksa. 인도 고대부터 알려진 반신반귀(半神半鬼). 불교에 들어와 나찰(羅刹)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다문천(多聞天)의 권속이 되었다.
인비인 인비인: 사람과 사람 아닌 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비구·비구니 등 사중(四衆)은 인(人)이고, 천(天)·용(龍) 따위는 비인(非人)이다.
등 많은(무량) 대중들이 공경하여 (부처님을) 둘러 싸와 있거늘
<형태소 분석>
● 園윙繞거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아 잇(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 + 거늘 거늘: 원인과 이유의 연결어미 ‘거늘/거’은 어떤 상황이 전제되고 그것이 뒷문장의 이유가 되거나 대조가 됨을 보이는 어미이다.
(연결어미)
● 無뭉量량大땡衆O이: 이(주격조사)
원문: 人非빙人 사과 사 아닌 것과 논 마리니 八部뿡를 어울워 니르니라
해석: ‘인비인’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하는 말이니 팔부 팔부: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건달바(乾婆), 비사사(毘舍), 구반다(鳩槃茶), 아귀, 제용중, 부단나(富單那), 야차(夜叉), 나찰(羅刹)이다.
를 어울러 이르는 말이라
<형태소 분석>
● 논: (하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오(대상법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마리니: 말 +이니(연결어미)
● 어울워: 어울- +우(사동 접미사) +어(부사파생 접미사)
● 니르니라: 니르- 니르다: ‘이르다’의 옛말. ‘니르다’ 혹은 ‘니다’로 쓰였다.
+니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위야 說法법더시니 그 : ‘때’의 옛말.
文문殊쓩師利링 世솅尊존 샤
해석: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더니 그 때에 문수사리 문수사리: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 사보살의 하나이다. 제불(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과 함께 삼존불(三尊佛)을 이룬다.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나 보통 사자를 타고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길상금강, 묘덕, 문수보살, 문수)
가 세존 세존: 석가모니와 같은 말.
께 여쭙되
<형태소 분석>
● 위야 : 위(爲) + +야(연결어미)
● 더시니: - +더(회상법의 선어말어미)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니(종속적 연결어미)
● 샤: - 다: ‘사뢰다, 여쭙다’의 옛말.
+()샤(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오 오: ‘샤’는 모음어미 앞에 오기 때문에 그냥 ‘’가 아닌 ‘오’가 되어야 한다.
(연결어미)
원문: 부로 일훔과 本본來ㅅ 큰 願과
해석: 부처님의 이름과 본래의 큰 소망과
<형태소 분석>
● 부로: 부텨 +ㅅ(존칭의 소유격조사)
● 일훔과: 일훔 일훔: ‘이름’의 옛말.
+과(공동격조사)
● 本본來ㅅ: ㅅ(무정물의 소유격조사)
● 큰: 크-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원문 : 됴신 功德득을 불어 니샤
해석 : 가장 좋으신 공덕을 펴 이르시어
<형태소 분석>
● 됴신 :
에 가시어 락음수 락(악)음수: 미풍이 닿으면 나뭇잎이 움직여 우아한 소리가 난다는 데서 이 이름이 붙음.
아래 계신 큰 비구 팔천 명과 함께 있으시더니 보살 보살: [범] Bodhisattva.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을 뜻하나 이후 불교의 발전에 따라 흔히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다름의 경지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을 뜻하게 됨. (=보리살타, 보살마하살, 각유정)
마하살 마하살: [범] Mah sattva. 마하살타의 준말로 큰 보살 혹은 보살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부처를 제하고 중생 가운데서 맨 윗자리에 있으므로 대(大)자를 더해 대중생(大衆生), 대유정(大有情), 대사(大士)의 뜻을 지님. \'마하\'는 대(大), 다(多), 승(勝)의 의미를 지님.
삼만 육천과
<형태소 분석>
● 가샤: 가- +샤(주체높임 선어말어미)
● 겨샤: 겨시- 겨시다: ‘계시다’의 옛말.
+아(연결어미)
● 굴근: 굵- 굵-: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형용사 ‘굵다’의 어원을 석보상절의 ‘굴근’의 ‘굵-’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의미는 ‘크다’이다.
+은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 쓰인다.
● : 교재에는 ‘함께’라고 해석이 되어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결과 ‘한데’의 옛말로 ‘한 곳에’, ‘한 군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 (관형사) +(의존명사)
● 잇더시니 잇더시니: 현대국어에서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가 회상법의 선어말어미의 앞에 오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 반대이다.
: 잇- +더(회상법 선어말어미)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니(연결어미)
원문: 摩망訶항薩 굴근 菩뽕薩이시다 논 마리라
해석: 마하살은 큰 보살이시다 하는 말이다.
<형태소 분석>
● 이시다: 이(서술격조사)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다(평서형 종결어미)
● 논: - 다: ‘하다’의 옛말. (cf. 하다는 ‘많다’의 옛말.)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오(대상법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마리라: 말 +이(서술격조사) +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國귁王과 大뗑臣씬과 婆빵羅랑門문과 居겅士와
해석: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 바라문: 고대 인도의 가장 높은 지위인 승려 계급으로 제사와 교법을 다스림.
(승려)과 거사와
※ 공동격조사인 ‘와/과’의 쓰임이 드러난다. 체언의 음운조건에 따라 모음어간인 경우, 체언 말음이 ‘ㄹ’일 경우에는 ‘와’를 쓰고, 체언의 음운조건에 따라 자음어간인 경우에는 ‘과’를 쓴다.
원문: 居겅는 살씨니 居겅士 쳔 만히 두고 가며 사 사미라
해석: 거는 사는 것이니 거사는 재물을 많이 두고 부요(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
<형태소 분석>
● 살씨니 살씨니: ‘살-’의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본다.
: 살- +ㄹ(관형사형 어미) +(의존명사) +ㅣ(서술격조사) +니(연결어미)
● 가며: 가며- 가며다: \'가멸다\'의 옛말. (부유하다는 뜻.) ‘가멸다’ 혹은 ‘가며다’로 쓰였다.
+어(부사 파생 접미사)
● 사: 사-(살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사미라: 사 +이(서술격조사) +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天텬龍 夜양叉창 人非빙人 等등 無뭉量량 大땡衆O이 恭공敬경야 園繞거늘
해석: 천룡 야차 야차 :[범] Yaksa. 인도 고대부터 알려진 반신반귀(半神半鬼). 불교에 들어와 나찰(羅刹)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다문천(多聞天)의 권속이 되었다.
인비인 인비인: 사람과 사람 아닌 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비구·비구니 등 사중(四衆)은 인(人)이고, 천(天)·용(龍) 따위는 비인(非人)이다.
등 많은(무량) 대중들이 공경하여 (부처님을) 둘러 싸와 있거늘
<형태소 분석>
● 園윙繞거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아 잇(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 + 거늘 거늘: 원인과 이유의 연결어미 ‘거늘/거’은 어떤 상황이 전제되고 그것이 뒷문장의 이유가 되거나 대조가 됨을 보이는 어미이다.
(연결어미)
● 無뭉量량大땡衆O이: 이(주격조사)
원문: 人非빙人 사과 사 아닌 것과 논 마리니 八部뿡를 어울워 니르니라
해석: ‘인비인’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하는 말이니 팔부 팔부: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건달바(乾婆), 비사사(毘舍), 구반다(鳩槃茶), 아귀, 제용중, 부단나(富單那), 야차(夜叉), 나찰(羅刹)이다.
를 어울러 이르는 말이라
<형태소 분석>
● 논: (하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오(대상법 선어말어미)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 마리니: 말 +이니(연결어미)
● 어울워: 어울- +우(사동 접미사) +어(부사파생 접미사)
● 니르니라: 니르- 니르다: ‘이르다’의 옛말. ‘니르다’ 혹은 ‘니다’로 쓰였다.
+니라(평서형 종결어미)
원문: 위야 說法법더시니 그 : ‘때’의 옛말.
文문殊쓩師利링 世솅尊존 샤
해석: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더니 그 때에 문수사리 문수사리: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 사보살의 하나이다. 제불(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과 함께 삼존불(三尊佛)을 이룬다.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나 보통 사자를 타고 오른손에 지검(智劍),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길상금강, 묘덕, 문수보살, 문수)
가 세존 세존: 석가모니와 같은 말.
께 여쭙되
<형태소 분석>
● 위야 : 위(爲) + +야(연결어미)
● 더시니: - +더(회상법의 선어말어미) +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 +니(종속적 연결어미)
● 샤: - 다: ‘사뢰다, 여쭙다’의 옛말.
+()샤(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오 오: ‘샤’는 모음어미 앞에 오기 때문에 그냥 ‘’가 아닌 ‘오’가 되어야 한다.
(연결어미)
원문: 부로 일훔과 本본來ㅅ 큰 願과
해석: 부처님의 이름과 본래의 큰 소망과
<형태소 분석>
● 부로: 부텨 +ㅅ(존칭의 소유격조사)
● 일훔과: 일훔 일훔: ‘이름’의 옛말.
+과(공동격조사)
● 本본來ㅅ: ㅅ(무정물의 소유격조사)
● 큰: 크- +ㄴ(관형사형 전성어미)
원문 : 됴신 功德득을 불어 니샤
해석 : 가장 좋으신 공덕을 펴 이르시어
<형태소 분석>
● 됴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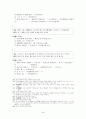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