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본문내용
드러난 한국인의 자연관은 중국의 그것과 달리, 인간과 자연의 상보(相補)상자적(相資的) 관계로 포착된다.113) 그러나 세간에서 인식되는 민중 풍수설에서는 여러 단계의 자연관에서 천명론적 자연관이나 상보적 자연관에 머물지 않는다. 때로는 대단히 훌륭한 풍수가 명당을 잡아서 묘를 썼는 데도 발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발생한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풍수는 스스로 무능을 자각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패철을 부수려고 하자, 하늘에서 또는 산신령이 자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살인한 죄인이므로 오히려 앙화를 입는 것이 마땅하니 패철을 부수지 말라’고 한다.114) 풍수인 사람의 역량과 판단으로는 명당이 틀림없지만, 하늘의 판단으로는 명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늘의 이치 또는 자연이 풍수의 이치 또는 사람을 이긴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인간이 풍수지리의 이치에 맞게 변형시켜 인간에게 필요한 길지로 만드는 풍수의 실천이 있다. 이른바 비보압승의 풍수는 하늘의 이치대로 생긴 자연을 풍수의 이치대로 사람들이 변형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흠결 있는 자연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늘을 이기는 인위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하늘은 만물을 낳은 일을 직능으로 삼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직능으로 하며, 이 직능 사이의 관계를 ‘상교승(相交勝)’이라고 한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교섭하되 하늘이 사람을 이길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늘을 이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연관이 ‘천인상교승론(天人相交勝論)’이다.115) 그러므로 풍수설의 자연관은 한국철학에서 포착된 천명론이나 상보적 자연관에 머물지 않고 천인상교승론의 자연관으로까지 나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명론의 자연관과 천인상교승론의 자연관은 사실상 상보적 자연관과 다른 독립적인 자연관이 아니라. 상보적 자연관의 좌우 두 축을 이루며 인접해 있는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천명론이 없어서는 상보적 자연관에 이를 수 없고, 상보적 자연관이 있는 한 천인상교론적 자연관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이들 세 자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수설의 자연관을 하나로 일반화하여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생태학적으로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상보적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관은 사람들에게 생태학적 삶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적 선행을 권유하게 된다.
부자로 복록을 누리던 사람들도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은 생태학적 자연인식에 의한 것이다. 음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택의 생기도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적 윤리인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삼합이 맞아야 음택의 명당이 발복한다고 믿듯이, 가족들이 모두 착실해야 양택의 명당도 온전하게 음덕을 내린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부잣집 맏며느리가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자연물을 훼손하게 됨으로써 집구석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결국 양택풍수의 이치보다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행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좋은 지리적 조건 속에서 복록을 누리던 집안도 마음씨 나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서 괜한 자연물을 깨뜨리는 바람에 일시에 망한다는 것이 양택풍수의 논리이다.
이처럼 양택풍수든 음택풍수든 인간의 실제 삶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자연에 영향을 끼치는 상호교감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민중풍수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풍수의 자연관은 생태학적 자연 질서와 인간적 도덕률을 서로 독립시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합시켜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수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곧 훌륭한 자연과 만나는 삶이며 자연친화적 삶이 곧 인간다운 삶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9. 풍수지리설을 공부하며 깨달은 사람들
풍수지리설 자체에서 드러난 자연관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연관도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명당을 찾아서 이주를 하고 자리를 잡아 취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풍수설 인식이나 자연관은 실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풍수설에 대한 인식도 크게 엇갈린다.
그러한 사례의 보기로, 정감록(鄭鑑錄)의 십승지지설(十勝之地說)에 따라 이주해 사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풍기의 금계동(金鷄洞)을 대표적인 정감록촌으로 믿고, 이북에서 이주해와 살고 있다.116) 금계동 사람들처럼 정감록 비결을 믿는 이들은, 십승지지에 살게 되면 흉년이 들지 않고 난리도 겪지 않을뿐더러 수삼년 안에 정도령이 출현하여 신천지를 마련할 것이므로, 터만 잘 잡아서 몸을 숨기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길지를 찾아 산간에 숨어사는 은거주의(隱居主義)에 빠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비결의 내용과 달리 명당이 아니어서 복록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오래 전에 금계동을 떠나버린 이들도 있다. 길지를 찾아 이주해온 사람이라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다시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주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117) 명당 덕만 보려는 편벽된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아직까지 금계동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 달밭골 산골짜기 은폐된 곳에 외따로 집을 짓고 사는 최현철 할아버지 역시 정감록 비결을 믿는 부친을 따라 이북에서 이주해 왔지만 산골짜기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있다. 왜냐하면 길지와 삶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길지를 찾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건 덕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덕을 쌓아야 길지가 발복한다는 뜻이다. “잘 사는 것은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118)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길지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이다. 금계촌에 지금껏 머물러 사는 강경빈 할아버지의 생각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예전에 이북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갖구 돈 싸짊어지고 와서, 땅값이 다락
이와 반대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인간이 풍수지리의 이치에 맞게 변형시켜 인간에게 필요한 길지로 만드는 풍수의 실천이 있다. 이른바 비보압승의 풍수는 하늘의 이치대로 생긴 자연을 풍수의 이치대로 사람들이 변형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흠결 있는 자연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늘을 이기는 인위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하늘은 만물을 낳은 일을 직능으로 삼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직능으로 하며, 이 직능 사이의 관계를 ‘상교승(相交勝)’이라고 한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교섭하되 하늘이 사람을 이길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늘을 이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연관이 ‘천인상교승론(天人相交勝論)’이다.115) 그러므로 풍수설의 자연관은 한국철학에서 포착된 천명론이나 상보적 자연관에 머물지 않고 천인상교승론의 자연관으로까지 나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명론의 자연관과 천인상교승론의 자연관은 사실상 상보적 자연관과 다른 독립적인 자연관이 아니라. 상보적 자연관의 좌우 두 축을 이루며 인접해 있는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천명론이 없어서는 상보적 자연관에 이를 수 없고, 상보적 자연관이 있는 한 천인상교론적 자연관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이들 세 자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수설의 자연관을 하나로 일반화하여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생태학적으로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상보적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관은 사람들에게 생태학적 삶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적 선행을 권유하게 된다.
부자로 복록을 누리던 사람들도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은 생태학적 자연인식에 의한 것이다. 음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택의 생기도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적 윤리인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삼합이 맞아야 음택의 명당이 발복한다고 믿듯이, 가족들이 모두 착실해야 양택의 명당도 온전하게 음덕을 내린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부잣집 맏며느리가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자연물을 훼손하게 됨으로써 집구석이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결국 양택풍수의 이치보다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행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좋은 지리적 조건 속에서 복록을 누리던 집안도 마음씨 나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서 괜한 자연물을 깨뜨리는 바람에 일시에 망한다는 것이 양택풍수의 논리이다.
이처럼 양택풍수든 음택풍수든 인간의 실제 삶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자연에 영향을 끼치는 상호교감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민중풍수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풍수의 자연관은 생태학적 자연 질서와 인간적 도덕률을 서로 독립시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합시켜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수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곧 훌륭한 자연과 만나는 삶이며 자연친화적 삶이 곧 인간다운 삶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9. 풍수지리설을 공부하며 깨달은 사람들
풍수지리설 자체에서 드러난 자연관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연관도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명당을 찾아서 이주를 하고 자리를 잡아 취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풍수설 인식이나 자연관은 실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풍수설에 대한 인식도 크게 엇갈린다.
그러한 사례의 보기로, 정감록(鄭鑑錄)의 십승지지설(十勝之地說)에 따라 이주해 사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가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풍기의 금계동(金鷄洞)을 대표적인 정감록촌으로 믿고, 이북에서 이주해와 살고 있다.116) 금계동 사람들처럼 정감록 비결을 믿는 이들은, 십승지지에 살게 되면 흉년이 들지 않고 난리도 겪지 않을뿐더러 수삼년 안에 정도령이 출현하여 신천지를 마련할 것이므로, 터만 잘 잡아서 몸을 숨기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길지를 찾아 산간에 숨어사는 은거주의(隱居主義)에 빠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비결의 내용과 달리 명당이 아니어서 복록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오래 전에 금계동을 떠나버린 이들도 있다. 길지를 찾아 이주해온 사람이라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다시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주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117) 명당 덕만 보려는 편벽된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아직까지 금계동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 달밭골 산골짜기 은폐된 곳에 외따로 집을 짓고 사는 최현철 할아버지 역시 정감록 비결을 믿는 부친을 따라 이북에서 이주해 왔지만 산골짜기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있다. 왜냐하면 길지와 삶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길지를 찾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건 덕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덕을 쌓아야 길지가 발복한다는 뜻이다. “잘 사는 것은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118)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길지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이다. 금계촌에 지금껏 머물러 사는 강경빈 할아버지의 생각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예전에 이북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갖구 돈 싸짊어지고 와서, 땅값이 다락
추천자료
 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학)의 개념과 원리, 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학)의 용어와 영향, 풍수지...
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학)의 개념과 원리, 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학)의 용어와 영향, 풍수지... 풍수(풍수지리학)의 개념, 풍수(풍수지리학)의 용어, 풍수(풍수지리학) 논리, 풍수(풍수지리...
풍수(풍수지리학)의 개념, 풍수(풍수지리학)의 용어, 풍수(풍수지리학) 논리, 풍수(풍수지리...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정의,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원리,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용어, 풍수지...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정의,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원리,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용어, 풍수지...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명칭, 풍수(풍수지리사상)의 흐름,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목적, 풍수(...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명칭, 풍수(풍수지리사상)의 흐름, 풍수(풍수지리사상)의 목적, 풍수(...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기원과 목적,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명칭,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기원과 목적,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명칭,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풍수지리설(풍수지리사상) 의미와 원리, 풍수지리설(풍수지리사상) 이론, 풍수지리설(풍수지...
풍수지리설(풍수지리사상) 의미와 원리, 풍수지리설(풍수지리사상) 이론, 풍수지리설(풍수지... [풍수][풍수지리학][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설]풍수(풍수지리학, 풍수지리사상)의 개념, 풍수...
[풍수][풍수지리학][풍수지리사상][풍수지리설]풍수(풍수지리학, 풍수지리사상)의 개념, 풍수...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유형,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이론,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술법, ...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유형,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 이론, 풍수지리(풍수지리사상)술법, ...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의의,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역사,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영향, 풍수지...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의의,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역사, 풍수지리(풍수지리설) 영향, 풍수지... 풍수지리(풍수지리학)의 형태와 흐름, 풍수지리(풍수지리학)의 용어, 풍수지리(풍수지리학) ...
풍수지리(풍수지리학)의 형태와 흐름, 풍수지리(풍수지리학)의 용어, 풍수지리(풍수지리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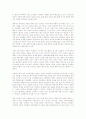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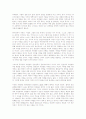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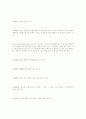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