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어찌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를 닦으며 기다리련다.
죽음에 다가갈수록 삶은 의미로 반짝인다
신라인의 무덤을 보면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빛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타고 갈 물건을 넣어두었다.
그런 풍류도의 세계관에 불교의 윤회관이 포개진다. 윤회란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업의 원리에 따라 시작도 없던 때로부터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삶이 돌고 도는 영겁의 순환임을 나타낸다.
한 조각 티끌 속에 세상이 담겨 있듯 월명은 누이의 죽음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통찰하였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사라졌다고 하는가? 그처럼 삶이란 결코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어 자리하는 것이 아닐까? 신라인은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였다.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도를 닦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듯 신라인은 그리 삶을 바라보았다. 죽음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의미로 꼭꼭 채워진 삶을 살고자 하였다.
안민가 (安民歌)
삼국유사 - 권2
(당나라에서) 《덕경(德經)》등을 보내오자 대왕은 예를 갖추어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이 되던 해에 오악삼산(五岳三山)의 심들이 때때로 나타나 궁전 뜰에서 대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은 귀정문(歸正門) 누각 위에 오라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승려 한 명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때 마침 위엄과 풍모가 깨끗한 한 고승이 배회하며 가고 있었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와 뵙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말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승려가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앵통(櫻筒)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보고 누각 위로 맞아 들였다. 통 안을 살펴보니 다구(茶具)가 가득 들어 있었다. 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누구인가?”
승려가 아뢰었다.
“소승은 충담(忠談)이라 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승려가 아뢰었다.
“소승은 매년 중삼일(重三日), 중구일(重九日)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彌勒世尊)께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에게도 차 한 잔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승려는 이에 차를 끓여 바쳤는데, 찻잔 속에서 향내가 풍겼다. 왕이 말하였다.
“짐은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耆婆郞)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의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짐을 위해 안민가(安民歌)를 지어보라.”
충담은 곧바로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아름답게 여겨 왕사(王師)로 봉했으나, 그는 삼가 재배하여 간곡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로 여기면,
모든 백성들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중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
이 나라가 보전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는 태평을 지속하리.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삼국유사 - 권2
배경설화는 《안민가(安民歌)》의 배경설화와 함께 삽입되어 다. 이 작품은 충담사가 신라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기파랑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연물에 빗대 표현하여 향가 특유의 숭고미 숭고미 : 기본적인 미적 범주의 하나로 인간의 보통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경이(경이), 외경(외경), 위대(위대) 따위의 느낌을 주는 것을 이른다.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
를 자아내고 있다. 작가는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하늘에 높이 뜬 달 높은 잣가지에 비유하고, 서리에도 굽히지 않을 화반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냇물의 조약돌에 깃들인 그 인품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찬기파랑가에서 보이는 고도의 상징적 표현은 향가의 문학성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는 다음과 같다.
울어지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쯤
모래 가른 나루터에
기랑의 모습 같은 숲이여
수모내 조약돌에
낭이 지니고 계시던
마음의 끝이라도 좇고 싶습니다.
아으,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여.
도천수대비가(도천수관음가)
신라 경덕왕(경덕왕) 때 희명(희명)이 지었다는 십구체 향가(향가).
경덕왕(경덕왕) 때 한기리(한기리)에 살던 희명이란 여자의 아들이 난 지 5년 만에 눈이 멀어 분황사 천수관음(천수관음) 앞에서 이 노래를 지어 아이에게 부르게 하자 눈을 떴다고 한다. 향가를 영이(령이)한 것으로 신성시하던 당시의 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무루플 고조며
둘손바당 모호누아
천수관음 전아해
비살블 두누오다
즈믄 손 즈믄 눈흘
하단할 노하 하단할 더압디
둘 업는 내라
하단자 그즈지 고티누옷다라
아으으 나애 기티샬단
노태 쑬 자비여 큰고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와
천수관음(천수관음) 전에
비옴을 두노이다
천 손에 천 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옵길
눈이 둘다 없는 내라
하나 만으로 그으기 고칠 것이다
아으으 내게 끼쳐 주시면
눈을 놓아 주시되 쓸 자비여
원왕생가(원왕생가)
* 작자 : 광덕(광덕의 처)
* 연대 : 신라 문무왕 때
* 갈래 : 10구체 향가
* 주제 :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설화
광덕이 죽은 뒤에 친구인 중 엄장이 광덕의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하였으나 그녀는 “스님
이 서방정토(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면서 광덕을 본받으라고 호되게 나무랐다. 엄장은 깊이 뉘우쳐 이후 수도에 열중하였고 마침내 서쪽으로 올라다고 한다. 이 향가의 작자가 광덕의 아내라는 이설(이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원전
달하 이뎨
서방까장 가샤리고
무량수불 전에
못 다 이르고 어찌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를 닦으며 기다리련다.
죽음에 다가갈수록 삶은 의미로 반짝인다
신라인의 무덤을 보면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빛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타고 갈 물건을 넣어두었다.
그런 풍류도의 세계관에 불교의 윤회관이 포개진다. 윤회란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업의 원리에 따라 시작도 없던 때로부터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삶이 돌고 도는 영겁의 순환임을 나타낸다.
한 조각 티끌 속에 세상이 담겨 있듯 월명은 누이의 죽음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통찰하였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사라졌다고 하는가? 그처럼 삶이란 결코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어 자리하는 것이 아닐까? 신라인은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였다.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도를 닦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듯 신라인은 그리 삶을 바라보았다. 죽음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의미로 꼭꼭 채워진 삶을 살고자 하였다.
안민가 (安民歌)
삼국유사 - 권2
(당나라에서) 《덕경(德經)》등을 보내오자 대왕은 예를 갖추어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이 되던 해에 오악삼산(五岳三山)의 심들이 때때로 나타나 궁전 뜰에서 대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은 귀정문(歸正門) 누각 위에 오라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승려 한 명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때 마침 위엄과 풍모가 깨끗한 한 고승이 배회하며 가고 있었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와 뵙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말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승려가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앵통(櫻筒)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보고 누각 위로 맞아 들였다. 통 안을 살펴보니 다구(茶具)가 가득 들어 있었다. 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누구인가?”
승려가 아뢰었다.
“소승은 충담(忠談)이라 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승려가 아뢰었다.
“소승은 매년 중삼일(重三日), 중구일(重九日)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彌勒世尊)께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에게도 차 한 잔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승려는 이에 차를 끓여 바쳤는데, 찻잔 속에서 향내가 풍겼다. 왕이 말하였다.
“짐은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耆婆郞)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의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짐을 위해 안민가(安民歌)를 지어보라.”
충담은 곧바로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이 아름답게 여겨 왕사(王師)로 봉했으나, 그는 삼가 재배하여 간곡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로 여기면,
모든 백성들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중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면
이 나라가 보전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는 태평을 지속하리.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삼국유사 - 권2
배경설화는 《안민가(安民歌)》의 배경설화와 함께 삽입되어 다. 이 작품은 충담사가 신라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기파랑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연물에 빗대 표현하여 향가 특유의 숭고미 숭고미 : 기본적인 미적 범주의 하나로 인간의 보통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경이(경이), 외경(외경), 위대(위대) 따위의 느낌을 주는 것을 이른다.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
를 자아내고 있다. 작가는 기파랑의 숭고한 인품을 하늘에 높이 뜬 달 높은 잣가지에 비유하고, 서리에도 굽히지 않을 화반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냇물의 조약돌에 깃들인 그 인품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이상을 강조하고 있다. 찬기파랑가에서 보이는 고도의 상징적 표현은 향가의 문학성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는 다음과 같다.
울어지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쯤
모래 가른 나루터에
기랑의 모습 같은 숲이여
수모내 조약돌에
낭이 지니고 계시던
마음의 끝이라도 좇고 싶습니다.
아으,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여.
도천수대비가(도천수관음가)
신라 경덕왕(경덕왕) 때 희명(희명)이 지었다는 십구체 향가(향가).
경덕왕(경덕왕) 때 한기리(한기리)에 살던 희명이란 여자의 아들이 난 지 5년 만에 눈이 멀어 분황사 천수관음(천수관음) 앞에서 이 노래를 지어 아이에게 부르게 하자 눈을 떴다고 한다. 향가를 영이(령이)한 것으로 신성시하던 당시의 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무루플 고조며
둘손바당 모호누아
천수관음 전아해
비살블 두누오다
즈믄 손 즈믄 눈흘
하단할 노하 하단할 더압디
둘 업는 내라
하단자 그즈지 고티누옷다라
아으으 나애 기티샬단
노태 쑬 자비여 큰고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와
천수관음(천수관음) 전에
비옴을 두노이다
천 손에 천 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옵길
눈이 둘다 없는 내라
하나 만으로 그으기 고칠 것이다
아으으 내게 끼쳐 주시면
눈을 놓아 주시되 쓸 자비여
원왕생가(원왕생가)
* 작자 : 광덕(광덕의 처)
* 연대 : 신라 문무왕 때
* 갈래 : 10구체 향가
* 주제 :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설화
광덕이 죽은 뒤에 친구인 중 엄장이 광덕의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하였으나 그녀는 “스님
이 서방정토(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면서 광덕을 본받으라고 호되게 나무랐다. 엄장은 깊이 뉘우쳐 이후 수도에 열중하였고 마침내 서쪽으로 올라다고 한다. 이 향가의 작자가 광덕의 아내라는 이설(이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원전
달하 이뎨
서방까장 가샤리고
무량수불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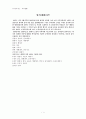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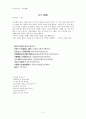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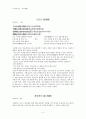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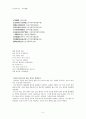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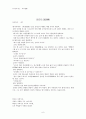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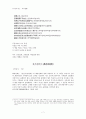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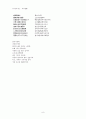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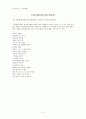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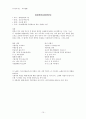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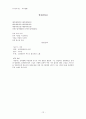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