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ㆍ상성ㆍ거성과 입성은 다르다고 말하였다. ③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끝소리에 쓰면 평성ㆍ상성ㆍ거성에 맞으며, 전청ㆍ차청ㆍ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끝소리에 쓰면 입성에 마땅한 것이니, ㆁㄴㅁㅇㄹㅿ의 여섯 글자는 평성ㆍ상성ㆍ거성의 끝소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끝소리가 된다 하였다. ④ 그러나 ㄱㆁㄷㄴㅂㅁㅅ의 여덟 자만으로 종성을 넉넉히 쓸 수 있다하였다. ⑤ ㅇ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반드시 종성에 쓰지 아니하여도 종성이 음을 이룰 있다하고, ㄷㄴㅂㅁㅅㄹ자의 받침(끝소리) 쓰기의 보기를 보였다. ⑥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각각 절로 상대가 된다 하였다. ⑦ 반혓소리 ‘ㄹ’은 우리 말에나 쓰이지 한자음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하였다. ⑧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된 4개 낱말의 보기를 들었다.
다섯째, 합자해에는 ① 초성ㆍ중성ㆍ종성의 세 소리가 합하여야 낱내를 이룬다는 원칙을 말하였다. ② 초성ㆍ중성ㆍ종성이 합하여 낱내를 이룰 때 각각 쓰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③ 병서의 규정,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의 서법을 말하였다. ④ 한문자와 우리 글자를 섞어 쓸 때 한자음에 따라서 중성(곧 ㅣ)이나 종성(곧 ㅅ)으로 보충하는 일이 있음을 보기를 들어 말하였다. ⑤ 우리말의 평성ㆍ상성ㆍ거성ㆍ입성을 보기를 들어 보였다. ⑥ 우리말의 사성인 평성ㆍ상성ㆍ거성ㆍ입성의 표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 하였다. ⑦ 중국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평성과 비슷하며 혹은 상성과 비슷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하다 하고, 이를 하나하나 보기를 들어 설명하되 그 점을 찍는 것은 평ㆍ상ㆍ거성의 경우와 같다고 말하였다. ⑧ 사성의 성조를 설명하였다. ⑨ 초성의 ㆆ과 ㅇ은 서로 비슷하니 우리말에서는 통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⑩ 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으나 운서의 자모는 한 가지뿐이고, 또 우리나라 말에는 가벼운 소리와 무거운 소리를 가르지 아니하나 다 소리를 이룰 수 있다. 입술가벼운소리의 보기에 따라 ‘ㅇ’을 ‘ㄹ’아래에 이어 쓰면 반혀가벼운소리가 되니, 이는 반혓소리 ‘ㄹ’ 도 경중이 있음이라 하였다. ⑪ ㆍㅡ 가 ㅣ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쓰임이 없으나 아이들의 말이나 변야의 말에서 혹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⑫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된 25개의 낱말의 보기를 들었다.
여섯째, 용자례에는, 실지 말을 표기하는 보기를 든 것으로서 초성에 34개 낱말, 중성에 44개 낱말, 종성에 16개 낱말, 도합 94개 낱말을 훈민정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인지의 해례 서문에는, ①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는 법이라는 말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② 각 나라마다 제각기 제 말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예악 문장이 중국과 견줄 만하나, 한자는 우리 글자가 아니므로 한자를 가지고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④ 신라 설총이 지었다는 이두도 한문 글자를 빌어 쓴 것이므로 한자 못지않게 불편하여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⑤ 정음 스물여덟 자는 세종대왕께서 세종 25년(1443) 겨울(음력 12월)에 창제하시었는데, 간략한 보기와 뜻을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⑥ 훈민정음은 꼴을 본뜨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고, 소리를 따라서 음을 일곱 가락에 어울리게 하니,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함이 다 포괄되어 있다 하였다. ⑦ 훈민정음은 평이라고 실용적인 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우수성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⑧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학자는 정인지ㆍ최항ㆍ박팽년ㆍ신숙주ㆍ성삼문ㆍ이개ㆍ이선로와 강희안을 포함하여 8인이라 말하였다. 훈민정음 신연구, p.29와 훈민정음과 문자론, p.95에도 포함
⑨ 이 해례는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스승이 없어도 훈민정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으나,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의 묘한 것에 있어서는 편찬자들이 자기들은 능히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⑩ 세종대왕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제도와 베푸심이 모든 임금에 뛰어나셨다고 하였다. ⑪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으심을 자연에서 이룩하신 창제라 말함과 동시에 세종의 영명한 성덕을 기리었다. ⑫ 끝에 가서 이 해례 서문은 정 인지 자신이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상한에 삼가 썼다고 하였다.
이 책을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실록본」이나「언해본(주해본)」등의 다른 진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원본은 반포된 이후 수백 년 동안 세사에 알려지지 않다가 1940년 7월경에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주하리 이한걸님 집에서 발견되어 서울의 고 전형필님의 서재로 들어가 현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간수되어 있다. 훈민정음 신연구 p.28, 훈민정음 연구 p.113,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p.66, 훈민정음과 문자론 p.96포함
이 책은 1 책으로 된 목판본인데, 책의 크기는 판광이 가로 16.9㎝, 세로 22.9㎝이고, 장수는 33장이며, 종이는 한지로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발견 당시 표지부터 책의 첫머리 두 장이 낙장되어 있어 이 낙장된 부분을 보사하였는데, 붓으로 쓸 때 실수로 세종대왕의 서문 끝부분인 ‘편어일용이’를 ‘편어일용의’라고 하여 ‘이’자를 ‘의’ 자로 잘못 썼고, 또 구두점도 두 군데나 잘못 찍었다. 훈민정음 신연구 p.28, 훈민정음과 문자론 p.96포함
그리고 해례편 중성해 결 서두에 ‘모자지음’을 ‘매자지음’의 오자로 보기도 하나, ‘모자’란 ‘자모자’로 보면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갑인자(1434년, 세종 16년 갑인에 주조된 동활자, 위부인자라고도 함)로 인쇄된 책이 아니라고 하여 혹시 원간본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회의적은 의견이 있으나, 상하 하향흑어미인 판심이나 글자체로 보아 어떤 한글 문헌보다도 가장 연대가 빠르고 지질 등으로 보아서도 15세기 중엽의 간본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한자음과 그 방점은 1447년(세종 29)에 이루어진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에 어긋나게 ‘
다섯째, 합자해에는 ① 초성ㆍ중성ㆍ종성의 세 소리가 합하여야 낱내를 이룬다는 원칙을 말하였다. ② 초성ㆍ중성ㆍ종성이 합하여 낱내를 이룰 때 각각 쓰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③ 병서의 규정,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의 서법을 말하였다. ④ 한문자와 우리 글자를 섞어 쓸 때 한자음에 따라서 중성(곧 ㅣ)이나 종성(곧 ㅅ)으로 보충하는 일이 있음을 보기를 들어 말하였다. ⑤ 우리말의 평성ㆍ상성ㆍ거성ㆍ입성을 보기를 들어 보였다. ⑥ 우리말의 사성인 평성ㆍ상성ㆍ거성ㆍ입성의 표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 하였다. ⑦ 중국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평성과 비슷하며 혹은 상성과 비슷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하다 하고, 이를 하나하나 보기를 들어 설명하되 그 점을 찍는 것은 평ㆍ상ㆍ거성의 경우와 같다고 말하였다. ⑧ 사성의 성조를 설명하였다. ⑨ 초성의 ㆆ과 ㅇ은 서로 비슷하니 우리말에서는 통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⑩ 반혓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으나 운서의 자모는 한 가지뿐이고, 또 우리나라 말에는 가벼운 소리와 무거운 소리를 가르지 아니하나 다 소리를 이룰 수 있다. 입술가벼운소리의 보기에 따라 ‘ㅇ’을 ‘ㄹ’아래에 이어 쓰면 반혀가벼운소리가 되니, 이는 반혓소리 ‘ㄹ’ 도 경중이 있음이라 하였다. ⑪ ㆍㅡ 가 ㅣ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쓰임이 없으나 아이들의 말이나 변야의 말에서 혹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⑫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된 25개의 낱말의 보기를 들었다.
여섯째, 용자례에는, 실지 말을 표기하는 보기를 든 것으로서 초성에 34개 낱말, 중성에 44개 낱말, 종성에 16개 낱말, 도합 94개 낱말을 훈민정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인지의 해례 서문에는, ①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는 법이라는 말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② 각 나라마다 제각기 제 말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예악 문장이 중국과 견줄 만하나, 한자는 우리 글자가 아니므로 한자를 가지고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④ 신라 설총이 지었다는 이두도 한문 글자를 빌어 쓴 것이므로 한자 못지않게 불편하여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⑤ 정음 스물여덟 자는 세종대왕께서 세종 25년(1443) 겨울(음력 12월)에 창제하시었는데, 간략한 보기와 뜻을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⑥ 훈민정음은 꼴을 본뜨되 글자는 옛날의 전자를 모방하고, 소리를 따라서 음을 일곱 가락에 어울리게 하니, 삼극의 뜻과 이기의 묘함이 다 포괄되어 있다 하였다. ⑦ 훈민정음은 평이라고 실용적인 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우수성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⑧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학자는 정인지ㆍ최항ㆍ박팽년ㆍ신숙주ㆍ성삼문ㆍ이개ㆍ이선로와 강희안을 포함하여 8인이라 말하였다. 훈민정음 신연구, p.29와 훈민정음과 문자론, p.95에도 포함
⑨ 이 해례는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스승이 없어도 훈민정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으나,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의 묘한 것에 있어서는 편찬자들이 자기들은 능히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였다. ⑩ 세종대왕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제도와 베푸심이 모든 임금에 뛰어나셨다고 하였다. ⑪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으심을 자연에서 이룩하신 창제라 말함과 동시에 세종의 영명한 성덕을 기리었다. ⑫ 끝에 가서 이 해례 서문은 정 인지 자신이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상한에 삼가 썼다고 하였다.
이 책을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실록본」이나「언해본(주해본)」등의 다른 진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원본은 반포된 이후 수백 년 동안 세사에 알려지지 않다가 1940년 7월경에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주하리 이한걸님 집에서 발견되어 서울의 고 전형필님의 서재로 들어가 현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간수되어 있다. 훈민정음 신연구 p.28, 훈민정음 연구 p.113,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p.66, 훈민정음과 문자론 p.96포함
이 책은 1 책으로 된 목판본인데, 책의 크기는 판광이 가로 16.9㎝, 세로 22.9㎝이고, 장수는 33장이며, 종이는 한지로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발견 당시 표지부터 책의 첫머리 두 장이 낙장되어 있어 이 낙장된 부분을 보사하였는데, 붓으로 쓸 때 실수로 세종대왕의 서문 끝부분인 ‘편어일용이’를 ‘편어일용의’라고 하여 ‘이’자를 ‘의’ 자로 잘못 썼고, 또 구두점도 두 군데나 잘못 찍었다. 훈민정음 신연구 p.28, 훈민정음과 문자론 p.96포함
그리고 해례편 중성해 결 서두에 ‘모자지음’을 ‘매자지음’의 오자로 보기도 하나, ‘모자’란 ‘자모자’로 보면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갑인자(1434년, 세종 16년 갑인에 주조된 동활자, 위부인자라고도 함)로 인쇄된 책이 아니라고 하여 혹시 원간본이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회의적은 의견이 있으나, 상하 하향흑어미인 판심이나 글자체로 보아 어떤 한글 문헌보다도 가장 연대가 빠르고 지질 등으로 보아서도 15세기 중엽의 간본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한자음과 그 방점은 1447년(세종 29)에 이루어진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에 어긋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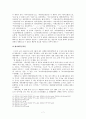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