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가 있다.
아무튼 다시 그의 생애로 돌아가보자. 그는 선비로서의 소신도 매우 강했다. 그래서 정적과의 격론도 적지 않았다. 74세 때는 승하한 효종의 산릉과 조대비의 복제문제로 서인 송시열 등과 대립하다가 또 다시 함경도 삼수로 유배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세 번째 유배이다. 이 때의 귀양도 7년 4개월이나 되는 긴긴 세월이었다.
그의 출사(벼슬길에 나아감)는 9년여에 불과하지만 유배생활은 3차에 걸쳐 14년이 넘는다. 고산의 생애는 자연에 파묻혀 산 은둔생활과 풍류, 고난과 개척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파란 많은 한평생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오다가 유유자적하고 한가한 은둔 생활을 하였고, 그때 어부사시사 같은 걸작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그 한가로움 속에서도 현실 참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점이 주목 할 만하다. 뒷장에서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어부사시사>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어부사시사>의 사상적 배경
고산 윤선도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삶은 벼슬에 나아감과 물러나 유배감이 반복되는 삶이 었다. 이런 질곡의 시간을 보내다 보길도에서 얻은 십수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선계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삶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사시사>의 사상적 배경,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굳이 따져 보면 자연속에서 소요유하는 도가(仙家)쪽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년닙희 밥싸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닫드러라 닫드러라/청약립은 써 잇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난 내 좃난가 제 좃난가” -하사(夏詞)2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는 마치 장자의 호접몽에 관한 고사를 생각나게 한다. 즉 갈매기를 내가 쫓아가는 것인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장자의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고산은 지금 자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의 객체와 주체인 ‘나’ 자신이 하나가된 물아일체의 경지에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선도가 가지고 있는 도가 사상관-특히 신선과 선계에 관한 이미지가 윤선도의 생활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는데 일조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산이 그가 있는 곳을 선계(仙界)와 같은 곳으로 견주어 본다는 생각은 다음의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 진다.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믈(景物)이 달
아무튼 다시 그의 생애로 돌아가보자. 그는 선비로서의 소신도 매우 강했다. 그래서 정적과의 격론도 적지 않았다. 74세 때는 승하한 효종의 산릉과 조대비의 복제문제로 서인 송시열 등과 대립하다가 또 다시 함경도 삼수로 유배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세 번째 유배이다. 이 때의 귀양도 7년 4개월이나 되는 긴긴 세월이었다.
그의 출사(벼슬길에 나아감)는 9년여에 불과하지만 유배생활은 3차에 걸쳐 14년이 넘는다. 고산의 생애는 자연에 파묻혀 산 은둔생활과 풍류, 고난과 개척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파란 많은 한평생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오다가 유유자적하고 한가한 은둔 생활을 하였고, 그때 어부사시사 같은 걸작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그 한가로움 속에서도 현실 참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점이 주목 할 만하다. 뒷장에서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어부사시사>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어부사시사>의 사상적 배경
고산 윤선도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삶은 벼슬에 나아감과 물러나 유배감이 반복되는 삶이 었다. 이런 질곡의 시간을 보내다 보길도에서 얻은 십수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선계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삶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사시사>의 사상적 배경,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굳이 따져 보면 자연속에서 소요유하는 도가(仙家)쪽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년닙희 밥싸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닫드러라 닫드러라/청약립은 써 잇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난 내 좃난가 제 좃난가” -하사(夏詞)2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는 마치 장자의 호접몽에 관한 고사를 생각나게 한다. 즉 갈매기를 내가 쫓아가는 것인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장자의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고산은 지금 자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의 객체와 주체인 ‘나’ 자신이 하나가된 물아일체의 경지에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선도가 가지고 있는 도가 사상관-특히 신선과 선계에 관한 이미지가 윤선도의 생활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는데 일조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산이 그가 있는 곳을 선계(仙界)와 같은 곳으로 견주어 본다는 생각은 다음의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 진다.
“간밤의 눈 갠 후에 경믈(景物)이 달
추천자료
 어부사시사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 : 윤선도
어부사시사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 : 윤선도 어부사시사(작가, 작품 분석, 형식, 의미, 성격, 특징)
어부사시사(작가, 작품 분석, 형식, 의미, 성격, 특징) 고산 윤선도 작품론-금쇄동기,어부사시사,산중신곡
고산 윤선도 작품론-금쇄동기,어부사시사,산중신곡 윤선도 '어부사시사' 연구
윤선도 '어부사시사' 연구 [고산 윤선도][윤선도의 작품][윤선도의 문학][유배][은둔생활]고산 윤선도의 작가론적 및 작...
[고산 윤선도][윤선도의 작품][윤선도의 문학][유배][은둔생활]고산 윤선도의 작가론적 및 작... 고전 시가 어부사시사 윤선도
고전 시가 어부사시사 윤선도 고산 윤선도 연구 - 생애, 시대적 배경, 문학관, 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작품연구, 시조작품론
고산 윤선도 연구 - 생애, 시대적 배경, 문학관, 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작품연구, 시조작품론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강호가도, 훈민가 작품분석, 조...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강호가도, 훈민가 작품분석, 조... [고산 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생애, 작품연구,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 어부사시사의 원문, ...
[고산 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생애, 작품연구,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 어부사시사의 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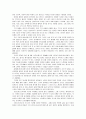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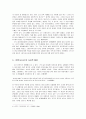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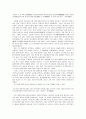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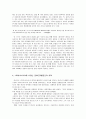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