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결부시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개성적 판단에 의한 어떤 관념을 표상하기 위하여 그것을 임으로 선택하기도 한데에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엄격히 유교적인 윤리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과 직립적인 대결을 보인다든가 생활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유족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이다. 문집《고산선생유고 고산선생유고》에 한시문(한시문)이 실려 있으며, 별집(별집)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된 가첩(가첩)으로〈산중신곡〉,〈금쇄동집고 금쇄동집고〉2책이 전한다. 정철(정철)박인로(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삼대가인(삼대가인)으로 불리는데, 이들과는 달리 가사(가사)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2. 고산의 <어부사시사>
(1) 어부가의 유래와 <어부사시사>
어부가란 어부의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읊은 노래이다.
동아시아 문학에서 어부형상의 초기적 면모는 전국시대 『초사』에 실린 굴원(B.C.343?~287)의 <어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더 소급하면 『초사』의 모태가 되었던 민가 기원의 초시중에서, 굴원의 <어부>의 후반부에 수용된 <창랑가>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은 작품으로 볼 때, 어부 노래는 장강을 중심으로 한 남방문화의 도가적 정서와 낭만적신비적 상상력을 펼친 『초사』의 문학적 전통과 동일한 기반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李亨大, 『漁父形象의 詩歌史的 展開와 世界認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국문학상 어부가라하면 『악장가사』에 전하는 <어부가>와 농암 이현보의 <어부장가>,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으뜸으로 손꼽는다. 『악장가사』의 <어부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부가의 가장 오래된 노래요, 농암의 <어부장가>는 어느 어부가보다 창악으로 널리 보급되어 익히 알려진 것이며,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시적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문학적 표현이 우수하여 훌륭한 시가 문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는 특히 시가 문학상 어부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한다. 朴俊圭, 『湖南詩壇의 硏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기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어부사시사 발문에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다.
<어부사시사>의 발문
동방고유어부사 미지하인소위 이집고시이성강자야 풍영칙강풍해우생아협간 영인표표연 유세독립지의 시이롱암선생호지불권 퇴계부자탄상무기 연음향불상응 어의불심비 개구어 집고 고불면유국촉지흠야 여연기의 용리어작어부사 사시각일편 편십장 여어강조음율고불 감망의 여어창주오도우불감 부 이징택광호편 용여지시사인병후이상도칙역일쾌야 차후지 창주일사 미필불여차심기 이광백세이상감야 추구월세신묘 부용동조 서우세연정악기란변 선상시아조 『孤山遺稿』권 6下, 歌辭, 漁父四時詞, 장 14.
(동방에 예로부터 어부사가 있으되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옛시를 모아서 곡을 붙인 것인데, 이를 읊게 되면 강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뿌리는 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 일어 사람으로 하여금 표연하게 하고 속세를 버리고 홀로 지낼 뜻을 갖게 한다. 이런 까 닭으로 농암선생이 좋아하여 마지 않았으며 퇴계선생이 탄상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 러나 소리와 울림이 서로 응하지 아니하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대개 옛글 을 모으는데 억매였던 관계로 옹색해지는 결합을 면키가 어려웠던 것이다. 내 그 뜻을 더 보태고 우리말을 사용해서 어부사를 만드니 4계절을 각 한 편으로 하고 한 편은 10장으로 했다. 나는 강조와 음률에 대해서는 실로 감히 망녕되이 논의할 바가 못되며 창주에 노니 는 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히 갖다붙일 바가 되지 못하니, 맑은 못과 넓은 호수에 쪽배 로 노닐 적에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맞추어 노젓게 한다면 이 또한 한 가지 즐거움이 며, 또한 나중의 창주일사가 반드시 이와 더불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기대하기 를 백세에 널리 펴서 서로 느끼고자 함이다.)
어부사시사의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창작 동기는 첫째 어부사의 잘못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 둘째는 강호에서 즐길 때 함께 노저으며 부르게 하고자 한다는 것, 셋째는 훗날 창주에 지내는 일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동기는 이 노래의 외연이 어부사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은 고산 자신의 창작의도가 독자적으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인 함께 노래 부르며 노젓게 한다는 진술은 자칫하면 이 노래를 노젓는 소리 즉 노동요의 일종인 것으로 보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고산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계층으로 보아서, 또 고산이 향유했던 음악의 성격으로 보아서 노동요인 노젓는 소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 배제된다. 이 점에서 두 번째의 이유로 밝힌 것은 일종의 관습적인 수사법이거나 아니면 뱃놀이를 할 때에 즐기는 선유가 정도로 그 성격이 제한된다. 그리고 창주에 숨어서 지내는 선비의 심경을 노래한다는 것은 자신의 태도를 천명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담겨 있는 표현이다.
또 하나 첨가한다면 어부사의 영향과 함께 고산이 지닌 문학적 특성과 재능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산이 어부사를 주목하고 그것을 고쳐 짓기로 한 의도는 오히려 외형상의 모방이나 답습보다는 그 의미 지향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시어의 선택
고산을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하기에 이른 단서가 탁월한 시어의 선택 능력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윤제 이래 이병기, 박성의 등을 비롯하여 고산의 작품을 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점이 다루어졌던 것도 실은 그의 시어가 잘 다듬어지고 선택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어부사시사의 외연으로 작용했던 어부가와의 관련에서 그의 시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밤믈은 거의 디고 낟믈이 미러온다 - 조조상락만조래
며기 둘식 세식 오락가락 고야 - 홍료화변백로한
압 뫼히 디니가고
또,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엄격히 유교적인 윤리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과 직립적인 대결을 보인다든가 생활현장으로서의 생동하는 자연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자연이 주는 시련이나 고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유족한 삶만을 누렸기 때문이다. 문집《고산선생유고 고산선생유고》에 한시문(한시문)이 실려 있으며, 별집(별집)에도 한시문과 35수의 시조, 40수의 단가(어부사시사)가 실려 있다. 또, 친필로된 가첩(가첩)으로〈산중신곡〉,〈금쇄동집고 금쇄동집고〉2책이 전한다. 정철(정철)박인로(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삼대가인(삼대가인)으로 불리는데, 이들과는 달리 가사(가사)는 없고 단가와 시조만 75수나 창작한 점이 특이하다.
2. 고산의 <어부사시사>
(1) 어부가의 유래와 <어부사시사>
어부가란 어부의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읊은 노래이다.
동아시아 문학에서 어부형상의 초기적 면모는 전국시대 『초사』에 실린 굴원(B.C.343?~287)의 <어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조더 소급하면 『초사』의 모태가 되었던 민가 기원의 초시중에서, 굴원의 <어부>의 후반부에 수용된 <창랑가>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은 작품으로 볼 때, 어부 노래는 장강을 중심으로 한 남방문화의 도가적 정서와 낭만적신비적 상상력을 펼친 『초사』의 문학적 전통과 동일한 기반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李亨大, 『漁父形象의 詩歌史的 展開와 世界認識』,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국문학상 어부가라하면 『악장가사』에 전하는 <어부가>와 농암 이현보의 <어부장가>,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으뜸으로 손꼽는다. 『악장가사』의 <어부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부가의 가장 오래된 노래요, 농암의 <어부장가>는 어느 어부가보다 창악으로 널리 보급되어 익히 알려진 것이며,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시적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문학적 표현이 우수하여 훌륭한 시가 문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는 특히 시가 문학상 어부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한다. 朴俊圭, 『湖南詩壇의 硏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 <어부사시사>의 창작 동기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어부사시사 발문에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다.
<어부사시사>의 발문
동방고유어부사 미지하인소위 이집고시이성강자야 풍영칙강풍해우생아협간 영인표표연 유세독립지의 시이롱암선생호지불권 퇴계부자탄상무기 연음향불상응 어의불심비 개구어 집고 고불면유국촉지흠야 여연기의 용리어작어부사 사시각일편 편십장 여어강조음율고불 감망의 여어창주오도우불감 부 이징택광호편 용여지시사인병후이상도칙역일쾌야 차후지 창주일사 미필불여차심기 이광백세이상감야 추구월세신묘 부용동조 서우세연정악기란변 선상시아조 『孤山遺稿』권 6下, 歌辭, 漁父四時詞, 장 14.
(동방에 예로부터 어부사가 있으되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옛시를 모아서 곡을 붙인 것인데, 이를 읊게 되면 강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뿌리는 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 일어 사람으로 하여금 표연하게 하고 속세를 버리고 홀로 지낼 뜻을 갖게 한다. 이런 까 닭으로 농암선생이 좋아하여 마지 않았으며 퇴계선생이 탄상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 러나 소리와 울림이 서로 응하지 아니하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대개 옛글 을 모으는데 억매였던 관계로 옹색해지는 결합을 면키가 어려웠던 것이다. 내 그 뜻을 더 보태고 우리말을 사용해서 어부사를 만드니 4계절을 각 한 편으로 하고 한 편은 10장으로 했다. 나는 강조와 음률에 대해서는 실로 감히 망녕되이 논의할 바가 못되며 창주에 노니 는 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히 갖다붙일 바가 되지 못하니, 맑은 못과 넓은 호수에 쪽배 로 노닐 적에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맞추어 노젓게 한다면 이 또한 한 가지 즐거움이 며, 또한 나중의 창주일사가 반드시 이와 더불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기대하기 를 백세에 널리 펴서 서로 느끼고자 함이다.)
어부사시사의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창작 동기는 첫째 어부사의 잘못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 둘째는 강호에서 즐길 때 함께 노저으며 부르게 하고자 한다는 것, 셋째는 훗날 창주에 지내는 일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동기는 이 노래의 외연이 어부사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은 고산 자신의 창작의도가 독자적으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인 함께 노래 부르며 노젓게 한다는 진술은 자칫하면 이 노래를 노젓는 소리 즉 노동요의 일종인 것으로 보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고산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계층으로 보아서, 또 고산이 향유했던 음악의 성격으로 보아서 노동요인 노젓는 소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 배제된다. 이 점에서 두 번째의 이유로 밝힌 것은 일종의 관습적인 수사법이거나 아니면 뱃놀이를 할 때에 즐기는 선유가 정도로 그 성격이 제한된다. 그리고 창주에 숨어서 지내는 선비의 심경을 노래한다는 것은 자신의 태도를 천명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담겨 있는 표현이다.
또 하나 첨가한다면 어부사의 영향과 함께 고산이 지닌 문학적 특성과 재능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산이 어부사를 주목하고 그것을 고쳐 짓기로 한 의도는 오히려 외형상의 모방이나 답습보다는 그 의미 지향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3) 시어의 선택
고산을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하기에 이른 단서가 탁월한 시어의 선택 능력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윤제 이래 이병기, 박성의 등을 비롯하여 고산의 작품을 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점이 다루어졌던 것도 실은 그의 시어가 잘 다듬어지고 선택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어부사시사의 외연으로 작용했던 어부가와의 관련에서 그의 시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밤믈은 거의 디고 낟믈이 미러온다 - 조조상락만조래
며기 둘식 세식 오락가락 고야 - 홍료화변백로한
압 뫼히 디니가고
추천자료
 고산 윤선도에 대하여
고산 윤선도에 대하여 고산 윤선도 - 고산의 전기적 이해, 윤선도의 사상, 윤선도의 시가, 고산의 문학사적 위치
고산 윤선도 - 고산의 전기적 이해, 윤선도의 사상, 윤선도의 시가, 고산의 문학사적 위치 고산윤선도에대해서(PPT)
고산윤선도에대해서(PPT) 고산 윤선도 - 고산 윤선도의 생애, 문학사적 의미, 선구적인 업적들, 작품
고산 윤선도 - 고산 윤선도의 생애, 문학사적 의미, 선구적인 업적들, 작품 고산 윤선도 - 생애 및 사상, 고산유고 (산중신곡, 만흥, 오우가, 어부사시사)
고산 윤선도 - 생애 및 사상, 고산유고 (산중신곡, 만흥, 오우가, 어부사시사) 송강정철 고산윤선도 면앙 송순에 대해서
송강정철 고산윤선도 면앙 송순에 대해서 고산 윤선도
고산 윤선도 [고산 윤선도][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작품][고산 윤선도의 문학][고산 윤선도의 시조작품론]...
[고산 윤선도][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작품][고산 윤선도의 문학][고산 윤선도의 시조작품론]... 녹색비가 내리는 집, 녹우단(綠雨壇) 고산윤선도
녹색비가 내리는 집, 녹우단(綠雨壇) 고산윤선도 고산 윤선도 연구 - 생애, 시대적 배경, 문학관, 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작품연구, 시조작품론
고산 윤선도 연구 - 생애, 시대적 배경, 문학관, 작가 및 작품론적 연구, 작품연구, 시조작품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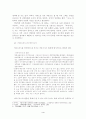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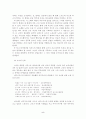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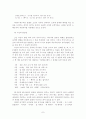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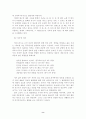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