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목차
第三十四回 安遠侯空出三奇計 呂司馬大破兩路兵
第三十五回 兩皂旗死生報故主 二軍師內外奏膚功
第三十六回 唐月君創立濟南都 呂師貞議訪建文帝
第三十五回 兩皂旗死生報故主 二軍師內外奏膚功
第三十六回 唐月君創立濟南都 呂師貞議訪建文帝
본문내용
리겠습니다.”
呂軍師道:“我到齊王府去, 可速令段布政來, 自當以禮待之。”
여군사가 말했다. “내가 제왕부에 가서 빨리 단포정을 오게 하면 자신이 예우해야 합니다.”
咸寧又飛馬而去。
함녕우비마이거
고함녕은 또 말을 빨리 하여 갔다.
軍師到了王府, 坐於殿中, 令人請齊王, 齊王早知有人保護, 心已放寬, 直趨出來, 俯伏在地。
放 [fangkun] ① 넓히다 ② 완화하다 ③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다 ④ 확장하다
군사는 왕부에 도달해 대전에 앉아 사람에게 제왕을 청하게 하니 제왕이 조기에 보호하는 사람을 알고 마음이 이미 느긋하게 가져 곧장 빨리 나와 땅에 엎드렸다.
軍師扶起道:“殿下金枝玉葉, 何乃自卑若此?”
군사는 빨리 부축하게 하고 말했다. “전하께서는 금지옥엽인데 어찌 이처럼 자신을 낮추십니까?”
方各施禮, 分賓主而坐。
각자 절을 하고 손님과 군주를 나눠 앉았다.
軍師道:“殿下系太祖高皇帝之子, 所以特遣一將來護。但旣附燕藩, 又曾得罪於建文皇帝, 此處不可以留, 且欲借殿下之宮府爲建文皇帝之行殿。煩請於三日內收拾行裝, 學生親送殿下出城。自南自北, 唯其所便。”
行殿:行宮. 제왕이 출행할 때 머물던 궁전.
[fanqng] ① 부탁을 드리다 ② 수고스럽지만…
군사가 말했다. “전하는 태조 고황제의 아들로 그래서 특별히 한 장수를 보내 보호하게 했습니다. 단지 이미 연왕에 붙어 또 일찍이 건문황제께 죄를 얻어 이곳에 머무를수 없고 또 전하의 궁부는 건문황제의 행전으로 빌려주십시오. 3일안에 행장을 수습하고 학생들이 친히 전하를 전송해 성을 나서길 청합니다. 남쪽이던 북쪽이던 편한쪽을 하십시오.”
只見高咸寧領着段布政來, 軍師隨請咸寧與齊王相見。
단지 고함녕이 단포정을 거느리고 옴을 보고 군사는 고함녕과 제왕이 보길 청했다.
設一座於下面, 令段布政坐。
같이 아래에 한 자리를 설치하고 단포정에게 앉게 했다.
段民道:“何以坐爲?不才添方岳之任, 失守疆土, 大負今上之恩, 一死不足塞責。請卽斬我頭, 以示僚屬, 以謝黎民。”
方岳 [fngyue] 중국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4악(岳)
단민이 말했다. “어째 앉습니까? 저는 방악의 임무를 받아 강토를 못 지키고
軍師道:“學生奉建文年號, 所以明大義也。今定鼎於此, 便遣人訪求復位, 尙欲借方伯爲明良之輔, 何苦殉身於燕賊耶?”
定鼎 [dingdng] ① 수도(首都)를 정하다 ② 천하를 장악하다 ③ 왕조를 건립하다
군사가 말했다. “학생이 건문연호를 받들어 대의를 밝힐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수도를 정하고 곧 사람을 보내 복위를 구하니 아직 방백을 빌려 어찌 고생스럽게 연왕 역적에게 순국하려고 하십니까?”
段民道:“不然。建文永樂, 總是一家, 比不得他姓革命。不才受知於永樂, 自與建文迂闊, 肯事二君以史?”
易姓革命: 타성(他姓)에 의한 왕조의 교체.
比不得 [b bu de] 비교할 수 없다
(이지러질 점; -총9획; dian)
단민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문제 영락제는 모두 일가로 역성혁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락제가 알아줘서 스스로 건문제와 멀고 2군주를 섬겨서 청사를 잘못하게 하겠습니까?”
高咸寧再三勸諭, 段民卽欲觸柱。
고함녕이 두세번 권유하니 단민은 기둥에 부딪치려고 했다.
軍師道:“士各有志, 不可相强。可回貴署, 明日與齊殿下同送出郭, 何如?”
군사가 말했다. “선비가 각자 뜻이 있으니 서로 강요할 수 없다. 귀서에 돌아와 내일 제왕 전하와 같이 성곽을 나가게 전송함이 어떠한가?”
段民長歎不答。
단민은 길게 탄식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兩位軍師就出了王府, 馬來至藩署, 封了帑庫, 收了冊籍。
冊籍: 군민(軍民)의 호적(戶籍)과 가구(家口) 수 및 지세(地稅)로 거둬 들인 양곡(糧穀)과 포목(布木), 현금(現金) 등의 출납장부를 말함
두명 군사는 왕부를 나와 말이 번서에 이르니 탕고를 봉쇄하고 책적을 거두었다.
隨至柳升所住之公署, 立了帥字旗, 放三聲, 兩軍師南向坐下。
公署 [gngsh] 관원이 모여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곳, 관공서
류승을 따라 머무른 관공서에 가서 장수 글자 기를 세우고 대포를 3번 쏘니 두 군사는 남쪽을 향하여 앉았다.
早有軍士解到丘福, 已是垂斃。
조기에 군사가 구복에 압송해 이미 곧 죽게 되었다.
軍師道:“丘福素爲燕藩之將, 猶之桀犬吠堯。死後可掩埋之。”
掩埋 [ynmai] 시체를 흙으로 겨우 가릴 정도로 묻음 ① 묻다 ② 매장하다
군사가 말했다. “구복은 평소 연왕의 장수로 걸왕을 위해 성군인 요임금에게 짖는 개와 같다. 사후에 흙으로 겨우 가려 매장하라.”
俄頃, 陸續獻功。
잠시만에 계속 공로를 바쳤다.
劉超活捉到毛遂, 審系建文時德州衛指揮, 降於燕藩者。
유초는 산채로 잡혀 모수에 이르며 건문제 시대 덕주위지휘로서 연왕에게 항복함을 심문했다.
軍師大罵:“賊奴!德州系由南入北三路總要之地, 爾若死守不降, 燕兵何道南馳?”
군사가 크게 욕했다. “역적아! 덕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3길중 중요한 땅으로 네가 만약 사수하고 항복하지 않았다면 연왕이 어떤 길로 남족으로 달렸겠는가?”
命腰斬之。
허리를 베게 했다.
馬靈解到李友直, 火力土解到墨麟, 彭岑解到奈亨, 軍師一一勘訊。
마령도 이우직을 압송해 화력사는 묵린에 압송당하고 팽잠은 나형에 압송당해 군사는 일일이 심문했다.
墨麟系建文時北平巡道, 素與燕邸往來契密者, 亦命腰斬。
密契:mi qi:(1).密朋友;(2).秘密相;(3).密切契合。
묵린은 건문제 시대 북평순도로 평소 연왕과 왕래가 긴밀해 또 허리를 참수당했다.
李友直爲司書吏, 奈亨爲藩司張昺書吏, 昺密奏燕藩謀反, 李友直、奈亨二人偵知, 抄竊疏稿以告燕王。
(말뚝 얼; -총10획; nie)司 [nies]淸代 안찰사의 다른 이름
이주직은 얼사서리로 내형은 번사인 장병서리로 호밀은 연왕 모반에 상주하고 이우직과 나형 2명이 정찰해 알고 상소원고를 도둑질해 연왕에게 보고했다.
軍師大怒道:“此張信之流亞也!謝貴!張昺, 中計慘死, 皆二賊奴致之!”
*주체를 체포하는 임무를 이전에 주체이 수하였던 장신(張信)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장신은 명령을 받은 후, 한동안 머리 아파한다. 자신의 연왕의 하인이므로 당연히 연왕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체를 도우면 자신은 역적이 된다. 일찌감치 주체의 여론선전에 마음이 움직인 모친은 주체가 바로 인망을 얻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呂軍師道:“我到齊王府去, 可速令段布政來, 自當以禮待之。”
여군사가 말했다. “내가 제왕부에 가서 빨리 단포정을 오게 하면 자신이 예우해야 합니다.”
咸寧又飛馬而去。
함녕우비마이거
고함녕은 또 말을 빨리 하여 갔다.
軍師到了王府, 坐於殿中, 令人請齊王, 齊王早知有人保護, 心已放寬, 直趨出來, 俯伏在地。
放 [fangkun] ① 넓히다 ② 완화하다 ③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다 ④ 확장하다
군사는 왕부에 도달해 대전에 앉아 사람에게 제왕을 청하게 하니 제왕이 조기에 보호하는 사람을 알고 마음이 이미 느긋하게 가져 곧장 빨리 나와 땅에 엎드렸다.
軍師扶起道:“殿下金枝玉葉, 何乃自卑若此?”
군사는 빨리 부축하게 하고 말했다. “전하께서는 금지옥엽인데 어찌 이처럼 자신을 낮추십니까?”
方各施禮, 分賓主而坐。
각자 절을 하고 손님과 군주를 나눠 앉았다.
軍師道:“殿下系太祖高皇帝之子, 所以特遣一將來護。但旣附燕藩, 又曾得罪於建文皇帝, 此處不可以留, 且欲借殿下之宮府爲建文皇帝之行殿。煩請於三日內收拾行裝, 學生親送殿下出城。自南自北, 唯其所便。”
行殿:行宮. 제왕이 출행할 때 머물던 궁전.
[fanqng] ① 부탁을 드리다 ② 수고스럽지만…
군사가 말했다. “전하는 태조 고황제의 아들로 그래서 특별히 한 장수를 보내 보호하게 했습니다. 단지 이미 연왕에 붙어 또 일찍이 건문황제께 죄를 얻어 이곳에 머무를수 없고 또 전하의 궁부는 건문황제의 행전으로 빌려주십시오. 3일안에 행장을 수습하고 학생들이 친히 전하를 전송해 성을 나서길 청합니다. 남쪽이던 북쪽이던 편한쪽을 하십시오.”
只見高咸寧領着段布政來, 軍師隨請咸寧與齊王相見。
단지 고함녕이 단포정을 거느리고 옴을 보고 군사는 고함녕과 제왕이 보길 청했다.
設一座於下面, 令段布政坐。
같이 아래에 한 자리를 설치하고 단포정에게 앉게 했다.
段民道:“何以坐爲?不才添方岳之任, 失守疆土, 大負今上之恩, 一死不足塞責。請卽斬我頭, 以示僚屬, 以謝黎民。”
方岳 [fngyue] 중국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4악(岳)
단민이 말했다. “어째 앉습니까? 저는 방악의 임무를 받아 강토를 못 지키고
軍師道:“學生奉建文年號, 所以明大義也。今定鼎於此, 便遣人訪求復位, 尙欲借方伯爲明良之輔, 何苦殉身於燕賊耶?”
定鼎 [dingdng] ① 수도(首都)를 정하다 ② 천하를 장악하다 ③ 왕조를 건립하다
군사가 말했다. “학생이 건문연호를 받들어 대의를 밝힐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수도를 정하고 곧 사람을 보내 복위를 구하니 아직 방백을 빌려 어찌 고생스럽게 연왕 역적에게 순국하려고 하십니까?”
段民道:“不然。建文永樂, 總是一家, 比不得他姓革命。不才受知於永樂, 自與建文迂闊, 肯事二君以史?”
易姓革命: 타성(他姓)에 의한 왕조의 교체.
比不得 [b bu de] 비교할 수 없다
(이지러질 점; -총9획; dian)
단민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문제 영락제는 모두 일가로 역성혁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락제가 알아줘서 스스로 건문제와 멀고 2군주를 섬겨서 청사를 잘못하게 하겠습니까?”
高咸寧再三勸諭, 段民卽欲觸柱。
고함녕이 두세번 권유하니 단민은 기둥에 부딪치려고 했다.
軍師道:“士各有志, 不可相强。可回貴署, 明日與齊殿下同送出郭, 何如?”
군사가 말했다. “선비가 각자 뜻이 있으니 서로 강요할 수 없다. 귀서에 돌아와 내일 제왕 전하와 같이 성곽을 나가게 전송함이 어떠한가?”
段民長歎不答。
단민은 길게 탄식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兩位軍師就出了王府, 馬來至藩署, 封了帑庫, 收了冊籍。
冊籍: 군민(軍民)의 호적(戶籍)과 가구(家口) 수 및 지세(地稅)로 거둬 들인 양곡(糧穀)과 포목(布木), 현금(現金) 등의 출납장부를 말함
두명 군사는 왕부를 나와 말이 번서에 이르니 탕고를 봉쇄하고 책적을 거두었다.
隨至柳升所住之公署, 立了帥字旗, 放三聲, 兩軍師南向坐下。
公署 [gngsh] 관원이 모여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곳, 관공서
류승을 따라 머무른 관공서에 가서 장수 글자 기를 세우고 대포를 3번 쏘니 두 군사는 남쪽을 향하여 앉았다.
早有軍士解到丘福, 已是垂斃。
조기에 군사가 구복에 압송해 이미 곧 죽게 되었다.
軍師道:“丘福素爲燕藩之將, 猶之桀犬吠堯。死後可掩埋之。”
掩埋 [ynmai] 시체를 흙으로 겨우 가릴 정도로 묻음 ① 묻다 ② 매장하다
군사가 말했다. “구복은 평소 연왕의 장수로 걸왕을 위해 성군인 요임금에게 짖는 개와 같다. 사후에 흙으로 겨우 가려 매장하라.”
俄頃, 陸續獻功。
잠시만에 계속 공로를 바쳤다.
劉超活捉到毛遂, 審系建文時德州衛指揮, 降於燕藩者。
유초는 산채로 잡혀 모수에 이르며 건문제 시대 덕주위지휘로서 연왕에게 항복함을 심문했다.
軍師大罵:“賊奴!德州系由南入北三路總要之地, 爾若死守不降, 燕兵何道南馳?”
군사가 크게 욕했다. “역적아! 덕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3길중 중요한 땅으로 네가 만약 사수하고 항복하지 않았다면 연왕이 어떤 길로 남족으로 달렸겠는가?”
命腰斬之。
허리를 베게 했다.
馬靈解到李友直, 火力土解到墨麟, 彭岑解到奈亨, 軍師一一勘訊。
마령도 이우직을 압송해 화력사는 묵린에 압송당하고 팽잠은 나형에 압송당해 군사는 일일이 심문했다.
墨麟系建文時北平巡道, 素與燕邸往來契密者, 亦命腰斬。
密契:mi qi:(1).密朋友;(2).秘密相;(3).密切契合。
묵린은 건문제 시대 북평순도로 평소 연왕과 왕래가 긴밀해 또 허리를 참수당했다.
李友直爲司書吏, 奈亨爲藩司張昺書吏, 昺密奏燕藩謀反, 李友直、奈亨二人偵知, 抄竊疏稿以告燕王。
(말뚝 얼; -총10획; nie)司 [nies]淸代 안찰사의 다른 이름
이주직은 얼사서리로 내형은 번사인 장병서리로 호밀은 연왕 모반에 상주하고 이우직과 나형 2명이 정찰해 알고 상소원고를 도둑질해 연왕에게 보고했다.
軍師大怒道:“此張信之流亞也!謝貴!張昺, 中計慘死, 皆二賊奴致之!”
*주체를 체포하는 임무를 이전에 주체이 수하였던 장신(張信)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장신은 명령을 받은 후, 한동안 머리 아파한다. 자신의 연왕의 하인이므로 당연히 연왕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체를 도우면 자신은 역적이 된다. 일찌감치 주체의 여론선전에 마음이 움직인 모친은 주체가 바로 인망을 얻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추천자료
 채동번의 당나라 역사소설 당사통속연의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81페이지
채동번의 당나라 역사소설 당사통속연의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81페이지 채동번의 당나라 역사소설 당사통속연의46회 47회 48회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84페이지
채동번의 당나라 역사소설 당사통속연의46회 47회 48회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84페이지 채동번의 중국 역사소설 오대사통속연의 77페이지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 역사소설 오대사통속연의 77페이지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위진남북조 역사소설 남북사통속연의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위진남북조 역사소설 남북사통속연의 34회 35회 36회 한문 및 한글번역 여선외사 4회 5회 6회 50페이지 한문 및 한글번역
여선외사 4회 5회 6회 50페이지 한문 및 한글번역 여선외사 7회 8회 9회 한문 및 한글번역 57 페이지
여선외사 7회 8회 9회 한문 및 한글번역 57 페이지 청나라 여웅의 당새아 역사소설 여선외사 16회 17회 18회 한문 및 한글번역 53페이지
청나라 여웅의 당새아 역사소설 여선외사 16회 17회 18회 한문 및 한글번역 53페이지 중국 당새아 여자영웅 여선외사 19회 20회 21회 한문 및 한글번역
중국 당새아 여자영웅 여선외사 19회 20회 21회 한문 및 한글번역 여선외사 31회 32회 33회 한문 및 한글번역
여선외사 31회 32회 33회 한문 및 한글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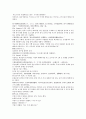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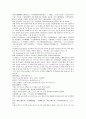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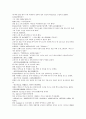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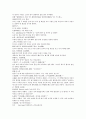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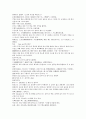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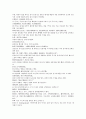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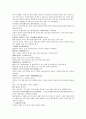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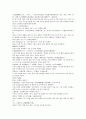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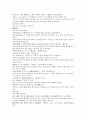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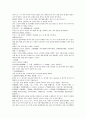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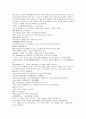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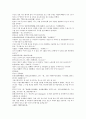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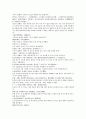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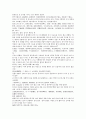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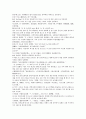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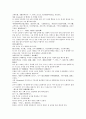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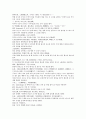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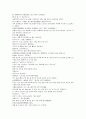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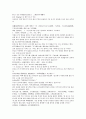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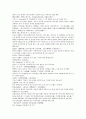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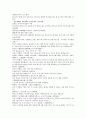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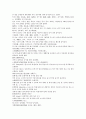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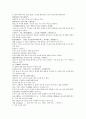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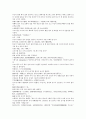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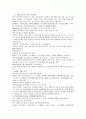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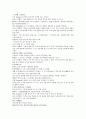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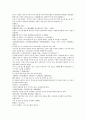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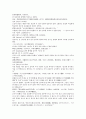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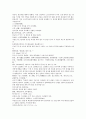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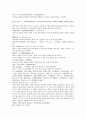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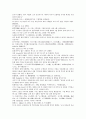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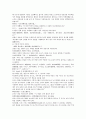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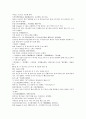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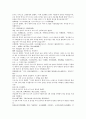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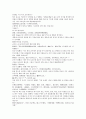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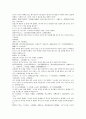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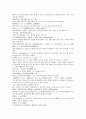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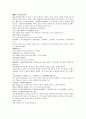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