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목차
제팔십오회 속가우노부득소처 상유전장년비단명
후한통속연의 85회 이어 좋은 배우자를 만난 노부는 어린 처를 얻고 전을 올린 장년에 단명으로 슬퍼하다
제팔십육회 거마아허저효충 영호주유장실계
후한통속연의 86회 마초를 항거한 허저는 충성을 다하고 호랑이를 맞아들인 유장은 잘못된 계책을 쓰다
제팔십칠회 실기성마초분난 핍허궁복후리앙
후한통속연의 87회 기성을 잃은 마초는 난리에서 달아나고 허궁의 복황후를 핍박해 재앙을 당하게 하다
후한통속연의 85회 이어 좋은 배우자를 만난 노부는 어린 처를 얻고 전을 올린 장년에 단명으로 슬퍼하다
제팔십육회 거마아허저효충 영호주유장실계
후한통속연의 86회 마초를 항거한 허저는 충성을 다하고 호랑이를 맞아들인 유장은 잘못된 계책을 쓰다
제팔십칠회 실기성마초분난 핍허궁복후리앙
후한통속연의 87회 기성을 잃은 마초는 난리에서 달아나고 허궁의 복황후를 핍박해 재앙을 당하게 하다
본문내용
武王伐紂, 前歌後舞, 難道不算爲仁主?卿言殊不合理, 可速退去!”
비이주의훈훈 청득통언 흔각역이 변작색도 무왕벌주 전가후무 난도불산위인주마 경언수불합리 가속퇴거
[xnxn]① (술에 취해) 얼근하다 ② 거나하다
유비는 이미 술에 얼근해 방통 말을 듣고 매우 귀에 거슬러 곧 분노해 말했다.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는데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춤췄는데 어진 군주라고 여기기 어려운가? 경의 말이 매우 불합리하니 빨리 물러나라!”
統大笑而出;備亦因醉入寢, 一睡竟夕。
통대소이출 비역인취입침 일수경석
竟夕[jingx]① 온밤 ② 밤 내내
방통이 크게 웃으면서 나오고 유비도 또 취해서 침실에 들어가 밤 내내 잠을 잤다.
翌旦方起, 自覺前言未忘, 深加後悔, 遂延統入廳, 向他謝過;
익단방기 자각전언미망 심가후회 수연통입청 향타사과
다음 새벽에 일어나 앞의 말을 아직 잊지 않음을 자각하고 매우 후회하여 곧 방통을 대청에 들어오게 하여 그에게 사과했다.
統却不答謝, 談笑自若。
통각부답사 담소자약
방통도 답하고 감사하지 않고 말과 웃음이 태연자약했다.
備復說道:“昨日言論, 我爲最失。”
비부설도 작일언론 아위최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어제 말은 내가 가장 큰 실수였소.”
統方答道:“君臣俱失, 何必追憶?”
통방답도 군신구실 하필추억
방통이 대답했다. 군주와 신하가 모두 실수했으니 하필 추억합니까?“
(善於分謗。)
선어분방
비방을 잘 나눈다.
備乃開大笑, 歡如恒。
비내개안대소 환서여항
유비는 파안대소하며 항시처럼 환담을 했다.
旣而劉璋復遣吳懿, 李嚴, 費觀諸將, 出禦備軍, 先後敗挫, 反皆降備, 備軍益强;
기이유장부견오의 이엄 비관제장 출어비군 선후패좌 반개항비 비군익강
挫 bai cuo : 失挫折
이어 유장은 다시 오의, 이엄, 비관의 제반장수를 보내 유비군을 나가 막게 하지만 전후로 패배하여 반대로 모두 유비에게 항복하니 유비군사는 더욱 강성해졌다.
分遣諸將略定蜀地。
분견제장략정촉지
여러 장수를 나눠 보내 촉지역을 평정하게 했다.
冷苞, 鄧賢戰死, 張任, 劉, 退至城, 璋子循奉了父命, 至助守。
냉포 등현전사 장임 유괴 퇴지낙성 장자순봉료부명 지낙조수
(수리부엉이, 가리온 락{낙}; -총14획; luo,le)
냉포와 등현은 전사하고 장임과 유괴가 낙성까지 후퇴하니 유장의 아들 장순이 부친 명령을 받들어 낙성에 이르러서 수비를 도왔다.
任素有膽力, 屢出衝圍, 雖屢被擊退, 氣不少衰;
임소유담력 루출중위 수루피격퇴 기불소쇠
장임은 평소 담력이 있어 자주 포위를 충돌해 나가 비록 자주 격퇴를 당해도 사기가 적어지거나 쇠퇴하지 않았다.
備與龐統商定計策, 誘任出城, 引過雁橋, 把橋斷, 前後夾攻, 害得任進退無路, 爲備所擒。
비여방통상정계책 유임출성 인과안교 파교탁단 전후협공 해득임진퇴무로 위비소금
유비는 방통과 계책을 상의해 장임이 성에 나오게 유인해안교를 지나가게 하여 다리를 절단해 앞뒤로 협공하니 장임은 진퇴양난으로 유비에게 사로잡혔다.
備勸任投降, 任抗聲道:“忠臣豈肯復事二主?速死爲幸。”
비권임투항 임항성도 충신기긍부사이주 속사위행
유비가 장임에게 투항을 권유하니 장임이 항거해 말했다. “충신이 어찌 다시 두 주인을 섬김니까? 빨리 죽여주심이 다행입니다.”
備始令推出斬首, 收屍禮葬;
비시령추출참수 수시예장
유비는 처음 끌어내 참수하게 하여 시체를 거둬 예우로 장례하게 했다.
(任死雁橋, 在龐統未死之前, 史可復按;羅氏《演義》指爲任之受擒出自諸葛, 且雁橋上加一“金”字, 不知何據。)
임사안교 재방통미사지전 사가부안 나씨여의지위임지수금출자제갈 차안교상가일금자 부지하거
장임이 안교에서 죽음은 방통이 아직 죽기전으로 역사는 다시 살펴볼수 있다. 나관중 삼국연의는 장임이 사로잡힌 계책이 제갈량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안교에 한 ‘쇠 금’자를 더했다고 하나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제갈량(諸葛亮)은 낙성을 점령하기 위해 장임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유인에 걸려든 장임을 사로잡게 했다. 붙잡힌 장임은 유비가 설득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결국 죽임을 당했다. 장임이 유비군과 싸운 곳이 삼국지연의에서는 금안교(金雁橋)로 나와 있다.
且命諸軍四面築壘, 力圍城。
차명제군사면축루 병력위성
여러 군사에게 사면으로 망루를 설치해 힘을 다해 성을 포위하게 했다.
劉循, 劉, 不敢再出, 但從嚴防守, 積久未懈, 城中所需糧食, 又由劉璋源源接濟, 故相持逾年, 尙得守住。
유순 유괴 불감재출 단종엄방수 적구미해 성중소수양식 우유유장원원접제 고상지유년 상득수주
源源 [yuanyuan] 연이어 끊이지 않는 모양
接 [jiji] 1. (물자나 금전으로) 원조하다. 돕다. 구제하다. 부조하다. 2. (생활비를) 보내다. 3. 보급하다.
유순과 유괴는 감히 재차 나가지 못하고 단지 엄밀히 방어하여 여러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고 성안에 수요되는 식량은 또 유장이 계속 보내줘서 1년넘게 지탱하여도 수비할수 있었다.
備正在焦急, 忽接到萌關來書, 乃是守將峻, 報稱張魯誘降, 已經叱退;
비정재초급 홀접도가맹관래서 내시수장곽준 보칭장로유항 이경질퇴
유비는 바로 초조했다가 갑자기 가맹관에서 온 서신을 접하니 수비장수인 곽준이 보고하길 장로가 가짜로 항복해 이미 꾸짖어 물리쳤다고 했다.
現由璋將扶禁, 向存等來攻, 正由峻設法抵禦等語。
현유장장부금 상존등래공 정유준설법저어등어
현재 유장의 장수인 부금과 상존등이 공격을 와서 바로 곽준이 방법을 세워 막고 있다는 말을 했다.
原來備自萌關還襲益州, 留中將峻守關, 部兵不過千人, 張魯遣將楊帛招峻, 峻怒叱道:“我頭可得, 城不可得!”
원래비자가맹관환습익주 류중랑장곽준수관 부병불과천인 장로견장양백초준 준노질도 아두가득 성불가득
원래 유비는 가맹에서부터 익주를 다시 습격해 중랑장 곽준을 남겨 관문을 수비하게 하나 부하병사가 천명에 불과해 장로는 부장 양백을 보내 곽준을 불러내게 하나 곽준이 분노로 질타했다. “내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성은 얻지 못한다!”
帛乃退出。
백내퇴출
양백은 물러났다.
嗣由劉璋遣兵萬餘人, 從水上攻, 統將就是扶禁, 向存, 虧得峻戰守有方, 尙得以少制衆。
사유유장견병만여인 종낭수상공 통장취시부금 상존 휴득준전수유방 상득이소제중
(솟을대문 랑{낭}; -총15획; lang,lang)
이어 유장은 병사 만여인을
비이주의훈훈 청득통언 흔각역이 변작색도 무왕벌주 전가후무 난도불산위인주마 경언수불합리 가속퇴거
[xnxn]① (술에 취해) 얼근하다 ② 거나하다
유비는 이미 술에 얼근해 방통 말을 듣고 매우 귀에 거슬러 곧 분노해 말했다.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는데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춤췄는데 어진 군주라고 여기기 어려운가? 경의 말이 매우 불합리하니 빨리 물러나라!”
統大笑而出;備亦因醉入寢, 一睡竟夕。
통대소이출 비역인취입침 일수경석
竟夕[jingx]① 온밤 ② 밤 내내
방통이 크게 웃으면서 나오고 유비도 또 취해서 침실에 들어가 밤 내내 잠을 잤다.
翌旦方起, 自覺前言未忘, 深加後悔, 遂延統入廳, 向他謝過;
익단방기 자각전언미망 심가후회 수연통입청 향타사과
다음 새벽에 일어나 앞의 말을 아직 잊지 않음을 자각하고 매우 후회하여 곧 방통을 대청에 들어오게 하여 그에게 사과했다.
統却不答謝, 談笑自若。
통각부답사 담소자약
방통도 답하고 감사하지 않고 말과 웃음이 태연자약했다.
備復說道:“昨日言論, 我爲最失。”
비부설도 작일언론 아위최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어제 말은 내가 가장 큰 실수였소.”
統方答道:“君臣俱失, 何必追憶?”
통방답도 군신구실 하필추억
방통이 대답했다. 군주와 신하가 모두 실수했으니 하필 추억합니까?“
(善於分謗。)
선어분방
비방을 잘 나눈다.
備乃開大笑, 歡如恒。
비내개안대소 환서여항
유비는 파안대소하며 항시처럼 환담을 했다.
旣而劉璋復遣吳懿, 李嚴, 費觀諸將, 出禦備軍, 先後敗挫, 反皆降備, 備軍益强;
기이유장부견오의 이엄 비관제장 출어비군 선후패좌 반개항비 비군익강
挫 bai cuo : 失挫折
이어 유장은 다시 오의, 이엄, 비관의 제반장수를 보내 유비군을 나가 막게 하지만 전후로 패배하여 반대로 모두 유비에게 항복하니 유비군사는 더욱 강성해졌다.
分遣諸將略定蜀地。
분견제장략정촉지
여러 장수를 나눠 보내 촉지역을 평정하게 했다.
冷苞, 鄧賢戰死, 張任, 劉, 退至城, 璋子循奉了父命, 至助守。
냉포 등현전사 장임 유괴 퇴지낙성 장자순봉료부명 지낙조수
(수리부엉이, 가리온 락{낙}; -총14획; luo,le)
냉포와 등현은 전사하고 장임과 유괴가 낙성까지 후퇴하니 유장의 아들 장순이 부친 명령을 받들어 낙성에 이르러서 수비를 도왔다.
任素有膽力, 屢出衝圍, 雖屢被擊退, 氣不少衰;
임소유담력 루출중위 수루피격퇴 기불소쇠
장임은 평소 담력이 있어 자주 포위를 충돌해 나가 비록 자주 격퇴를 당해도 사기가 적어지거나 쇠퇴하지 않았다.
備與龐統商定計策, 誘任出城, 引過雁橋, 把橋斷, 前後夾攻, 害得任進退無路, 爲備所擒。
비여방통상정계책 유임출성 인과안교 파교탁단 전후협공 해득임진퇴무로 위비소금
유비는 방통과 계책을 상의해 장임이 성에 나오게 유인해안교를 지나가게 하여 다리를 절단해 앞뒤로 협공하니 장임은 진퇴양난으로 유비에게 사로잡혔다.
備勸任投降, 任抗聲道:“忠臣豈肯復事二主?速死爲幸。”
비권임투항 임항성도 충신기긍부사이주 속사위행
유비가 장임에게 투항을 권유하니 장임이 항거해 말했다. “충신이 어찌 다시 두 주인을 섬김니까? 빨리 죽여주심이 다행입니다.”
備始令推出斬首, 收屍禮葬;
비시령추출참수 수시예장
유비는 처음 끌어내 참수하게 하여 시체를 거둬 예우로 장례하게 했다.
(任死雁橋, 在龐統未死之前, 史可復按;羅氏《演義》指爲任之受擒出自諸葛, 且雁橋上加一“金”字, 不知何據。)
임사안교 재방통미사지전 사가부안 나씨여의지위임지수금출자제갈 차안교상가일금자 부지하거
장임이 안교에서 죽음은 방통이 아직 죽기전으로 역사는 다시 살펴볼수 있다. 나관중 삼국연의는 장임이 사로잡힌 계책이 제갈량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안교에 한 ‘쇠 금’자를 더했다고 하나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제갈량(諸葛亮)은 낙성을 점령하기 위해 장임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에게 유인에 걸려든 장임을 사로잡게 했다. 붙잡힌 장임은 유비가 설득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결국 죽임을 당했다. 장임이 유비군과 싸운 곳이 삼국지연의에서는 금안교(金雁橋)로 나와 있다.
且命諸軍四面築壘, 力圍城。
차명제군사면축루 병력위성
여러 군사에게 사면으로 망루를 설치해 힘을 다해 성을 포위하게 했다.
劉循, 劉, 不敢再出, 但從嚴防守, 積久未懈, 城中所需糧食, 又由劉璋源源接濟, 故相持逾年, 尙得守住。
유순 유괴 불감재출 단종엄방수 적구미해 성중소수양식 우유유장원원접제 고상지유년 상득수주
源源 [yuanyuan] 연이어 끊이지 않는 모양
接 [jiji] 1. (물자나 금전으로) 원조하다. 돕다. 구제하다. 부조하다. 2. (생활비를) 보내다. 3. 보급하다.
유순과 유괴는 감히 재차 나가지 못하고 단지 엄밀히 방어하여 여러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고 성안에 수요되는 식량은 또 유장이 계속 보내줘서 1년넘게 지탱하여도 수비할수 있었다.
備正在焦急, 忽接到萌關來書, 乃是守將峻, 報稱張魯誘降, 已經叱退;
비정재초급 홀접도가맹관래서 내시수장곽준 보칭장로유항 이경질퇴
유비는 바로 초조했다가 갑자기 가맹관에서 온 서신을 접하니 수비장수인 곽준이 보고하길 장로가 가짜로 항복해 이미 꾸짖어 물리쳤다고 했다.
現由璋將扶禁, 向存等來攻, 正由峻設法抵禦等語。
현유장장부금 상존등래공 정유준설법저어등어
현재 유장의 장수인 부금과 상존등이 공격을 와서 바로 곽준이 방법을 세워 막고 있다는 말을 했다.
原來備自萌關還襲益州, 留中將峻守關, 部兵不過千人, 張魯遣將楊帛招峻, 峻怒叱道:“我頭可得, 城不可得!”
원래비자가맹관환습익주 류중랑장곽준수관 부병불과천인 장로견장양백초준 준노질도 아두가득 성불가득
원래 유비는 가맹에서부터 익주를 다시 습격해 중랑장 곽준을 남겨 관문을 수비하게 하나 부하병사가 천명에 불과해 장로는 부장 양백을 보내 곽준을 불러내게 하나 곽준이 분노로 질타했다. “내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성은 얻지 못한다!”
帛乃退出。
백내퇴출
양백은 물러났다.
嗣由劉璋遣兵萬餘人, 從水上攻, 統將就是扶禁, 向存, 虧得峻戰守有方, 尙得以少制衆。
사유유장견병만여인 종낭수상공 통장취시부금 상존 휴득준전수유방 상득이소제중
(솟을대문 랑{낭}; -총15획; lang,lang)
이어 유장은 병사 만여인을
추천자료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전한통속연의 85회 86회 87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전한통속연의 85회 86회 87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동한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49회, 50회, 51회 한문 및 한글번역 71페이지
채동번의 동한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49회, 50회, 51회 한문 및 한글번역 71페이지 채동번의 동한역사소설인 후한통속연의 55회, 56회, 57회의 한글번역 및 한문 72페이지
채동번의 동한역사소설인 후한통속연의 55회, 56회, 57회의 한글번역 및 한문 72페이지 채동번의 후한통속연의 중국 동한과 삼국시대 역사소설 70회 71회 72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후한통속연의 중국 동한과 삼국시대 역사소설 70회 71회 72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동한과 삼국지시대 중국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76회 77회 78회 한문 및 한글번역 73...
채동번의 동한과 삼국지시대 중국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76회 77회 78회 한문 및 한글번역 73... 채동번의 중국 동한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82회 83회 84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 동한역사소설 후한통속연의 82회 83회 84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동한 후한통속연의 88회 89회 90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동한 후한통속연의 88회 89회 90회 한문 및 한글번역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삼국지시대 후한통속연의 91회 92회 93회 한문 및 한글번역 (73페이지)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삼국지시대 후한통속연의 91회 92회 93회 한문 및 한글번역 (73페이지)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삼국지시대 후한통속연의 97회 98회 99회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74...
채동번의 중국역사소설 삼국지시대 후한통속연의 97회 98회 99회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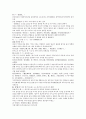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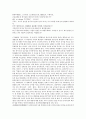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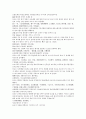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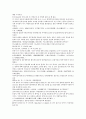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