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향가
2. 향가의 형식
3. 향가작품
4. 향가의 출전
5. 향가 내용
(삼국유사 - 14수)
6. 향가 연구
2. 향가의 형식
3. 향가작품
4. 향가의 출전
5. 향가 내용
(삼국유사 - 14수)
6. 향가 연구
본문내용
날 밤 그의 집에 이르러서 몰래 한께 자고 있었다. 처용은 바깥에 나갔다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둘이서 함께 자고 있는 지라 자기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그 곳을 물러갔다. 이 때에 역신은 모양을 나타내고 처용의 앞에 꿇어 앉아서 \"제가 공의 부인을 흠모하여 지금 범했는데, 공이 보시고도 노여워 안하시고 도리어 노래를 부르시니 이 후로는 공의 화상만 있는 곳이라도 결코 들어가지 않고, 피하리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로부터 나라 풍속에 처용의 화상을 문간에 붙여서 역신의 해를 피하곤 하였다.
<요약 정리>
▶ 형식 : 8구체 향가
▶ 성격 : 축사(逐邪)의 노래, 주술적 무가
▶ 주제 : 역신의 축출
▶ 의의 : ① 벽사진경(벽邪進慶)의 소박한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
② 고려, 조선시대까지 의식무,또는 연희로 계승
③ 향가 해독의 좋은 자료가 됨(고려가요 처용가)
▶ 출전 : <삼국유사>권2 처용랑·망해사
<여러 가지 해석>
1. 민속학의 관점에서 처용을 무속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
처용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노래부르고 춤추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며, 따라서 무격 사회(巫覡社會)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고 방식이다. 우리 무속에서는 병이 든 것은 역신(疫神, 전염병 귀신)이 덮어 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용의 처가 역신과 교접한 것은 실제로는 처용의 처가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든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직능을 수행하는 처용은 바로 의술사로서의 무당인 것이다. 이런 처용의 성격이 처용 설화 끝에 보이는 문신(門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여기에서 8구의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 무속에서 병을 치료하는 굿의 형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주문이나 독경으로서 병마를 물리치는 것이고, 둘째는 삼지창과 같은 무기로 겁을 주어 역신을 퇴치하는 것이고, 셋째는 천연두 퇴치굿인 \'마마별상거리\'에서처럼 곱게 낫게 해 달라고 정성들여 비는 것이다. 그런데 \'역신이 감복했다\'는 대목을 염두에 두면 8구는 세 번째처럼 상심과 체념으로 보아야 옳다. 이 상심과 체념은 역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용가의 8구는 체념적 주사로 처용의 초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2. 정치사의 관점에서 처용을 지방 호족의 아들로 보는 견해
신라 말기의 역사적 현실과 처용 설화 전체 문맥을 결부시켜 해석하는 방법이다. 처용은 중앙의 왕권에 순복하지 않는 지방 호족의 자제이고, 헌강왕의 개운포 출타는 지방 호족의 무마책이고, 동해 용왕의 조화는 지방 호족의 중앙 왕권에 대한 도전의 표시이며, 용의 아들 처용의 입경(入京)과 왕정 보좌는 고려의 기인 제도(其人制度)와 같이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처용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중앙 귀족의 자제의 타락한 모습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처용가」는 지방 호족이 중앙 귀족에게 느꼈던 갈등의 표현으로 보았다.
3. 이슬람 상인으로 보려는 견해
신라 시대 국제 교역상 중심지로서의 울산만을 중시하고, 처용을 울산만에 들어 온 이슬람 상인 중의 한 사람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용의 상징성>
용은 전통적으로 물의 신으로 상징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용이 아버지가 되어 사람과 교통을 하면 반드시 비범한 인물이 출생하곤 했다. 이른바 이물 교접(異物交接)에 의해 신화 속의 주인공이 출생하게 되는데 탈해, 왕건, 서동, 견훤 등이다 그렇다. 용은 또 호국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라 문무왕의 경우가 그렇다. 용은 일반적으로 제왕(帝王)을 의미하여 임금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용(龍)\'이란 글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 용은 봄을 상징하고, 입신 출세를 상징하기도 한다. 등용문(登龍門)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용을 악룡(惡龍)으로 인식하여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우선 향가 「처용가」가 들어 있는 이 설화는 고려시대에 이어져 고려 가요 「처용가」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신라, 고려, 조선에 걸쳐 궁중 무용으로 이어진 처용무라는 춤도 있다. 민속으로서는 처용의 그림을 문 앞에 붙이면 모든 질병이 물러난다는 속신도 조선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현대 문학으로 연결은 김춘수의 「처용 단장」이 있다.
④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
간봄 그리매
모단것사 우리 시름
아람 나토샤온
즈시 살㈓ 디니져
눈 돌칠 사이예
맛보압디 지소리
郞이여 그릴 마사매 녀올길
다
<요약 정리>
▶ 형식 : 8구체 향가
▶ 성격 : 축사(逐邪)의 노래, 주술적 무가
▶ 주제 : 역신의 축출
▶ 의의 : ① 벽사진경(벽邪進慶)의 소박한 민속에서 형성된 무가
② 고려, 조선시대까지 의식무,또는 연희로 계승
③ 향가 해독의 좋은 자료가 됨(고려가요 처용가)
▶ 출전 : <삼국유사>권2 처용랑·망해사
<여러 가지 해석>
1. 민속학의 관점에서 처용을 무속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
처용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노래부르고 춤추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며, 따라서 무격 사회(巫覡社會)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고 방식이다. 우리 무속에서는 병이 든 것은 역신(疫神, 전염병 귀신)이 덮어 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용의 처가 역신과 교접한 것은 실제로는 처용의 처가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든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직능을 수행하는 처용은 바로 의술사로서의 무당인 것이다. 이런 처용의 성격이 처용 설화 끝에 보이는 문신(門神)으로 정착될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여기에서 8구의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 무속에서 병을 치료하는 굿의 형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주문이나 독경으로서 병마를 물리치는 것이고, 둘째는 삼지창과 같은 무기로 겁을 주어 역신을 퇴치하는 것이고, 셋째는 천연두 퇴치굿인 \'마마별상거리\'에서처럼 곱게 낫게 해 달라고 정성들여 비는 것이다. 그런데 \'역신이 감복했다\'는 대목을 염두에 두면 8구는 세 번째처럼 상심과 체념으로 보아야 옳다. 이 상심과 체념은 역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용가의 8구는 체념적 주사로 처용의 초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2. 정치사의 관점에서 처용을 지방 호족의 아들로 보는 견해
신라 말기의 역사적 현실과 처용 설화 전체 문맥을 결부시켜 해석하는 방법이다. 처용은 중앙의 왕권에 순복하지 않는 지방 호족의 자제이고, 헌강왕의 개운포 출타는 지방 호족의 무마책이고, 동해 용왕의 조화는 지방 호족의 중앙 왕권에 대한 도전의 표시이며, 용의 아들 처용의 입경(入京)과 왕정 보좌는 고려의 기인 제도(其人制度)와 같이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처용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중앙 귀족의 자제의 타락한 모습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처용가」는 지방 호족이 중앙 귀족에게 느꼈던 갈등의 표현으로 보았다.
3. 이슬람 상인으로 보려는 견해
신라 시대 국제 교역상 중심지로서의 울산만을 중시하고, 처용을 울산만에 들어 온 이슬람 상인 중의 한 사람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용의 상징성>
용은 전통적으로 물의 신으로 상징되어 왔다. 동양에서는 용이 아버지가 되어 사람과 교통을 하면 반드시 비범한 인물이 출생하곤 했다. 이른바 이물 교접(異物交接)에 의해 신화 속의 주인공이 출생하게 되는데 탈해, 왕건, 서동, 견훤 등이다 그렇다. 용은 또 호국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라 문무왕의 경우가 그렇다. 용은 일반적으로 제왕(帝王)을 의미하여 임금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용(龍)\'이란 글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 용은 봄을 상징하고, 입신 출세를 상징하기도 한다. 등용문(登龍門)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용을 악룡(惡龍)으로 인식하여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우선 향가 「처용가」가 들어 있는 이 설화는 고려시대에 이어져 고려 가요 「처용가」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신라, 고려, 조선에 걸쳐 궁중 무용으로 이어진 처용무라는 춤도 있다. 민속으로서는 처용의 그림을 문 앞에 붙이면 모든 질병이 물러난다는 속신도 조선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현대 문학으로 연결은 김춘수의 「처용 단장」이 있다.
④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
간봄 그리매
모단것사 우리 시름
아람 나토샤온
즈시 살㈓ 디니져
눈 돌칠 사이예
맛보압디 지소리
郞이여 그릴 마사매 녀올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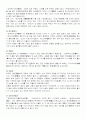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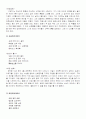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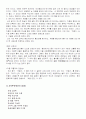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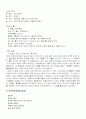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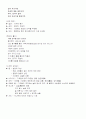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