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 20세기 초 잡가의 부상과 지형의 변동
3. 잡가의 대중성과 통속성
4. 결론
Ⅱ. 잡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작품 위주로)
1. 잡가의 정의
1) 경기 잡가
2) 서도 잡가
3) 남도 잡가
2. 잡가의 특징
1) 유흥성
2) 다양성
Ⅲ. 12잡가를 중심으로
1. 12잡가
2. 12잡가 외의 잡가
3. 경기명창들이 부르는 휘모리잡가
Ⅳ. 맺음말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 20세기 초 잡가의 부상과 지형의 변동
3. 잡가의 대중성과 통속성
4. 결론
Ⅱ. 잡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작품 위주로)
1. 잡가의 정의
1) 경기 잡가
2) 서도 잡가
3) 남도 잡가
2. 잡가의 특징
1) 유흥성
2) 다양성
Ⅲ. 12잡가를 중심으로
1. 12잡가
2. 12잡가 외의 잡가
3. 경기명창들이 부르는 휘모리잡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차 례
Ⅰ.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 20세기 초 잡가의 부상과 지형의 변동
3. 잡가의 대중성과 통속성
4. 결론
Ⅱ. 잡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작품 위주로)
1. 잡가의 정의
1) 경기 잡가
2) 서도 잡가
3) 남도 잡가
2. 잡가의 특징
1) 유흥성
2) 다양성
Ⅲ. 12잡가를 중심으로
1. 12잡가
2. 12잡가 외의 잡가
3. 경기명창들이 부르는 휘모리잡가
Ⅳ. 맺음말
Ⅰ.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0세기 초 근대 벽두 가장 많은 대중을 확보하면서 부상한 장르가 잡가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잡가는 여타의 다른 가악 장르와 함께 싸잡아서 전통음악적 변용을 겪고 그리하여 자생적으로 대중적인 양식으로 솟아오른 것인 까닭이다.
그런데 잡가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잡가가 어떤 토양위에서 성장하였는지 그 역사적 경과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이후 우리 문학사에는 근대를 지향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시가사의 중심장르인 시조는 17세기 말 이후 그 중심 담당층이 사대부에서 중간계층으로 옮겨지면서 여항의 예술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것은 가곡창과 시조창의 악곡적 분화와 더불어 눈부시게 발전하여 여항예술의 꽃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설시조의 등장은 시가사의 지형을 현저하게 변형시켰고, 그것은 평시조를 포함한 여타의 장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사는 대개가 음영물로 전환되었고, 그 중 몇 개의 곡목만이 시조음악에 부수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잡가 역시 이 시기쯤에는 사당패와 같은 하층 유랑 연예인들의 입을 통해 향유,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도시 유흥공간의 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여항예술인 시조 및 가사음악과 민중예술인 잡가 사이에 계층적 경계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중심은 여전히 시조였다. 19세기 들어 시조의 악곡적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현행 가곡창·시조창의 곡목분화와 한바탕이 정립되기에 이른다. 흔히 19세기 후반은 시조의 소멸기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에 여항예술로서 가장 찬연한 빛을 발하게 된다. 수많은 가집의 편찬과 가객들의 활약, 음악에 대한 대중적 수요의 확대 등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러한 번성은 특히 대원군 정권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니 당대를 주름잡던 가객 박효관이나 안민영의 족적은 모두 이 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는 대개 18세기적 현상만 주목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뒤엉킨 양상들을 지극히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19세기 시조의 면모가 전혀 해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복잡다단하게 보이는 이 시기 시가사의 구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전문적인 고급예술’과 ‘통속적 대중예술’로의 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4)
이러한 분화는 이 시기에 편찬된 가집들을 통해 먼저 확인되는 바이니, 가곡원류(1876)의 10여종에 이르는 이본들과 해동악장, 화원악보, 협률대성, 여창가요록 등이 전자의 경향을 대변하고, 최초의 방각본 가집인 남훈태평가(1863)를 비롯하여 시조, 시여, 시가요곡, 調 및 詞, 시
Ⅰ.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 20세기 초 잡가의 부상과 지형의 변동
3. 잡가의 대중성과 통속성
4. 결론
Ⅱ. 잡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작품 위주로)
1. 잡가의 정의
1) 경기 잡가
2) 서도 잡가
3) 남도 잡가
2. 잡가의 특징
1) 유흥성
2) 다양성
Ⅲ. 12잡가를 중심으로
1. 12잡가
2. 12잡가 외의 잡가
3. 경기명창들이 부르는 휘모리잡가
Ⅳ. 맺음말
Ⅰ. 대중가요의 선구, 20세기 초반 잡가 연구
1.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구도
20세기 초 근대 벽두 가장 많은 대중을 확보하면서 부상한 장르가 잡가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잡가는 여타의 다른 가악 장르와 함께 싸잡아서 전통음악적 변용을 겪고 그리하여 자생적으로 대중적인 양식으로 솟아오른 것인 까닭이다.
그런데 잡가의 부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잡가가 어떤 토양위에서 성장하였는지 그 역사적 경과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이후 우리 문학사에는 근대를 지향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시가사의 중심장르인 시조는 17세기 말 이후 그 중심 담당층이 사대부에서 중간계층으로 옮겨지면서 여항의 예술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것은 가곡창과 시조창의 악곡적 분화와 더불어 눈부시게 발전하여 여항예술의 꽃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설시조의 등장은 시가사의 지형을 현저하게 변형시켰고, 그것은 평시조를 포함한 여타의 장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사는 대개가 음영물로 전환되었고, 그 중 몇 개의 곡목만이 시조음악에 부수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잡가 역시 이 시기쯤에는 사당패와 같은 하층 유랑 연예인들의 입을 통해 향유,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도시 유흥공간의 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여항예술인 시조 및 가사음악과 민중예술인 잡가 사이에 계층적 경계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시가사의 중심은 여전히 시조였다. 19세기 들어 시조의 악곡적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현행 가곡창·시조창의 곡목분화와 한바탕이 정립되기에 이른다. 흔히 19세기 후반은 시조의 소멸기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에 여항예술로서 가장 찬연한 빛을 발하게 된다. 수많은 가집의 편찬과 가객들의 활약, 음악에 대한 대중적 수요의 확대 등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러한 번성은 특히 대원군 정권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니 당대를 주름잡던 가객 박효관이나 안민영의 족적은 모두 이 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는 대개 18세기적 현상만 주목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뒤엉킨 양상들을 지극히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19세기 시조의 면모가 전혀 해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복잡다단하게 보이는 이 시기 시가사의 구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전문적인 고급예술’과 ‘통속적 대중예술’로의 분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4)
이러한 분화는 이 시기에 편찬된 가집들을 통해 먼저 확인되는 바이니, 가곡원류(1876)의 10여종에 이르는 이본들과 해동악장, 화원악보, 협률대성, 여창가요록 등이 전자의 경향을 대변하고, 최초의 방각본 가집인 남훈태평가(1863)를 비롯하여 시조, 시여, 시가요곡, 調 및 詞,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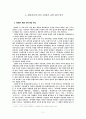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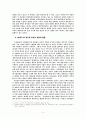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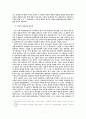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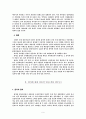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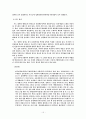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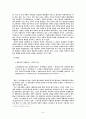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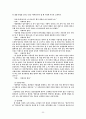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