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1. 고대국어 표기법 - 차자표기 ……2
2. 중세국어 표기법 ……3
3. 근대국어 표기법 ……4
4. 개화기 표기법 ……6
5. 일제시대 표기법 ……6
6. 조선어 학회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7
7. 현대 국어 표기법 ……7
Ⅲ. 결 론 ……8
* 참고문헌 ……9
Ⅱ. 본 론
1. 고대국어 표기법 - 차자표기 ……2
2. 중세국어 표기법 ……3
3. 근대국어 표기법 ……4
4. 개화기 표기법 ……6
5. 일제시대 표기법 ……6
6. 조선어 학회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7
7. 현대 국어 표기법 ……7
Ⅲ. 결 론 ……8
* 참고문헌 ……9
본문내용
서 표기하면 ‘음차표기’, 뜻(훈)을 빌려서 표기하면 ‘훈차표기’라고 한다. 주로, 한자를 이용하여 어휘를 표현하였고, 특히 국어의 고유명사를 표기하였다. 주로, 인명이나 지명에 국한하여 쓰였고, 관직명은 이미 한문 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 권 제47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 (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자의 의미를 버리고 음만 빌리는 경우에서는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素那’로 적고 그 음을 빌려왔다. 반면, 한자의 음을 버리고 의미만 빌리는 경우는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金川’으로 적고 그 뜻을 빌렸다.
② 구결
15세기에 ‘세종실록’이나 언해본 문헌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한문 원문을 읽을 때에 우리말과 한자가 어순이 다르고 조사나 어미의 존재여부를 고려한 문법이다. 즉, 곧바로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 구절과 구절 사이에 들어가서 문맥의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쓰인다.
寧爲小人所忌毁毋爲小人所媚悅(영위소인소기훼무위소인소미열)
위와 같은 문장은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까? 위의 문장에 구결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寧爲小人所忌毁언정 毋爲小人所媚悅하라.(영위소인소기훼무위소인소미열)
즉, ‘언정’이나 ‘-하라’와 같은 조사나 어미를 문장 중간에 삽입하여 어려운 한문 원문의 이해를 돕는다.
③ 이두
우리말을 한문으로 적으면서 조사와 어미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것이다. 단어 혹은 어구를 문장 구조에 따라 같은 뜻을 가진 한자로 배열시킨 글자이다. 아전들이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목적에서 설총으로부터 만들어진 형태이다. 명칭은 ‘이토, 이도, 이서’ 등으로 불리었다. 또한,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기 위해 정확한 문맥을 나타냄으로써 확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대명률직해’에 “무릇 성이 같고(이고)=凡同姓是遣”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말 ‘이고’를 한자로 기록하였는데, ‘是’는 뜻을 사용하고 ‘遣’은 음을 사용했다.
④ 향찰
신라 시대 때에 한자의 음 또는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향찰은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선조들이 고안한 기록 방식 중 가장 종합적 체계를 갖췄고 주로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향찰은 향가 이외에도 비석의 비문이나 게송(불교노래), 초기 가사 작품(승원가, 혜원가)에서도 발견된다. 이두가 주로 실용문에 쓰였다면, 향찰은 주로 문예문에 쓰인다.
예를 들면, 처용가에서 ‘東京 明欺月良’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서 東京(동경)은 ‘셔불, 세벌, 새벌, 서울’이라는 뜻 이다. 또, 明(밝다), 月(달)은 뜻을, 欺(기), 朗(랑)는 음을 사용하였다.
2. 중세국어 표기법
15세기 국어의 표기가 잘 나타난 문헌은 ‘훈민정음’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전통적 표기 관습을 따랐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변모양상을 살펴보자.
① 이어적기(연철)
훈민정음은 한 음절이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모두 합해져야 한 음절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종성(받침)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 그런데 발음상에서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에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있다.
만약 소리 나는 대로 ‘사라미’와 같이 적을 경우에는 쓰기에는 쉬우나 형태가 고정되지 않아 독해에는 매우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사라미’를 ‘사람이’로, ‘머거’를 ‘먹어’로 표현한 것처럼 형태소 단위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분철(끊어적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에는 이어적기인 연철이 성행하였고, 끊어적기는 ‘월인천강지곡’에서 ‘안아, 눈에’와 같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② 8종성법
훈민정음에서는 제자상의 원리로 초성과 종성을 모두 공통된 자음으로 쓸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이 당시 ‘8종성’으로 제한되었다.
然 ㄱㆁ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也 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 ‘훈민정음’ 종성해
위의 글의 ‘곶, , 갗’ 등의 종성 ‘ㅈ, ㅿ, ㅊ’은 ‘ㅅ’으로 하여 ‘곳, 엿, 갓’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기 문헌인 ‘월인천강지곡’(1447)에서 8종성법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곶’, ‘낮’, ‘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 (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자의 의미를 버리고 음만 빌리는 경우에서는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素那’로 적고 그 음을 빌려왔다. 반면, 한자의 음을 버리고 의미만 빌리는 경우는 ‘소나’를 표기하기 위해서 ‘金川’으로 적고 그 뜻을 빌렸다.
② 구결
15세기에 ‘세종실록’이나 언해본 문헌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한문 원문을 읽을 때에 우리말과 한자가 어순이 다르고 조사나 어미의 존재여부를 고려한 문법이다. 즉, 곧바로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 구절과 구절 사이에 들어가서 문맥의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쓰인다.
寧爲小人所忌毁毋爲小人所媚悅(영위소인소기훼무위소인소미열)
위와 같은 문장은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까? 위의 문장에 구결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寧爲小人所忌毁언정 毋爲小人所媚悅하라.(영위소인소기훼무위소인소미열)
즉, ‘언정’이나 ‘-하라’와 같은 조사나 어미를 문장 중간에 삽입하여 어려운 한문 원문의 이해를 돕는다.
③ 이두
우리말을 한문으로 적으면서 조사와 어미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것이다. 단어 혹은 어구를 문장 구조에 따라 같은 뜻을 가진 한자로 배열시킨 글자이다. 아전들이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목적에서 설총으로부터 만들어진 형태이다. 명칭은 ‘이토, 이도, 이서’ 등으로 불리었다. 또한,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기 위해 정확한 문맥을 나타냄으로써 확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대명률직해’에 “무릇 성이 같고(이고)=凡同姓是遣”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말 ‘이고’를 한자로 기록하였는데, ‘是’는 뜻을 사용하고 ‘遣’은 음을 사용했다.
④ 향찰
신라 시대 때에 한자의 음 또는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향찰은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선조들이 고안한 기록 방식 중 가장 종합적 체계를 갖췄고 주로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향찰은 향가 이외에도 비석의 비문이나 게송(불교노래), 초기 가사 작품(승원가, 혜원가)에서도 발견된다. 이두가 주로 실용문에 쓰였다면, 향찰은 주로 문예문에 쓰인다.
예를 들면, 처용가에서 ‘東京 明欺月良’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서 東京(동경)은 ‘셔불, 세벌, 새벌, 서울’이라는 뜻 이다. 또, 明(밝다), 月(달)은 뜻을, 欺(기), 朗(랑)는 음을 사용하였다.
2. 중세국어 표기법
15세기 국어의 표기가 잘 나타난 문헌은 ‘훈민정음’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전통적 표기 관습을 따랐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변모양상을 살펴보자.
① 이어적기(연철)
훈민정음은 한 음절이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모두 합해져야 한 음절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종성(받침)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 그런데 발음상에서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에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있다.
만약 소리 나는 대로 ‘사라미’와 같이 적을 경우에는 쓰기에는 쉬우나 형태가 고정되지 않아 독해에는 매우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사라미’를 ‘사람이’로, ‘머거’를 ‘먹어’로 표현한 것처럼 형태소 단위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분철(끊어적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당시에는 이어적기인 연철이 성행하였고, 끊어적기는 ‘월인천강지곡’에서 ‘안아, 눈에’와 같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② 8종성법
훈민정음에서는 제자상의 원리로 초성과 종성을 모두 공통된 자음으로 쓸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이 당시 ‘8종성’으로 제한되었다.
然 ㄱㆁ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也 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 ‘훈민정음’ 종성해
위의 글의 ‘곶, , 갗’ 등의 종성 ‘ㅈ, ㅿ, ㅊ’은 ‘ㅅ’으로 하여 ‘곳, 엿, 갓’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기 문헌인 ‘월인천강지곡’(1447)에서 8종성법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곶’, ‘낮’,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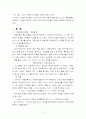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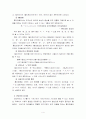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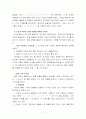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