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1910년대 시 경향
1. 한국 근대시의 배경으로서의 1910년대
1) 소성(小星) 현상윤 <요게 무어야?> / <웅커리로서>
2) 유암(流暗) 김여제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 <삼월일일(三月一日)>
3) 소월(素月) 최승구 <보월(步月)>
2. 최남선과 이광수
Ⅱ. 1920년대 시 경향
1. 3.1운동 이후 시의 생산과 수용
2. 1920년대 시 전개의 세 갈래
1) 낭만시 지향
1)-1. 주요한 <빗소리> / <샘물이 혼자서>
1)-2. 이상화 <비음(緋音)> / 박종화 <사의 예찬>
2) 카프 계열
2)-1. 이상화 <조소(嘲笑)> / <통곡(慟哭)>
2)-2. 김형원 <벌거숭이의 노래>
3) 민요시
3)-1. 김억 <오다가다>
3)-2. 김소월 <길>
3)-3. 한용운 <수의 비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1910년대 시 경향
Ⅰ. 1910년대 시 경향
1. 한국 근대시의 배경으로서의 1910년대
1) 소성(小星) 현상윤 <요게 무어야?> / <웅커리로서>
2) 유암(流暗) 김여제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 <삼월일일(三月一日)>
3) 소월(素月) 최승구 <보월(步月)>
2. 최남선과 이광수
Ⅱ. 1920년대 시 경향
1. 3.1운동 이후 시의 생산과 수용
2. 1920년대 시 전개의 세 갈래
1) 낭만시 지향
1)-1. 주요한 <빗소리> / <샘물이 혼자서>
1)-2. 이상화 <비음(緋音)> / 박종화 <사의 예찬>
2) 카프 계열
2)-1. 이상화 <조소(嘲笑)> / <통곡(慟哭)>
2)-2. 김형원 <벌거숭이의 노래>
3) 민요시
3)-1. 김억 <오다가다>
3)-2. 김소월 <길>
3)-3. 한용운 <수의 비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1910년대 시 경향
본문내용
서>
2) 유암(流暗) 김여제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 <삼월일일(三月一日)>
3) 소월(素月) 최승구 <보월(步月)>
2. 최남선과 이광수
Ⅱ. 1920년대 시 경향
1. 3.1운동 이후 시의 생산과 수용
2. 1920년대 시 전개의 세 갈래
1) 낭만시 지향
1)-1. 주요한 <빗소리> / <샘물이 혼자서>
1)-2. 이상화 <비음(緋音)> / 박종화 <사의 예찬>
2) 카프 계열
2)-1. 이상화 <조소(嘲笑)> / <통곡(慟哭)>
2)-2. 김형원 <벌거숭이의 노래>
3) 민요시
3)-1. 김억 <오다가다>
3)-2. 김소월 <길>
3)-3. 한용운 <수의 비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1910년대 시 경향
1. 한국 근대시의 배경으로서의 1910년대
19세기 말 일제 강점기로 인한 서구 문화와의 접촉으로, 우리나라에는 서구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다. 서구의 시 문학 형식도 그 중의 하나로 이러한 서구시의 경험은 한국 근대시를 촉발하는 외부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근대시에서 근대성이라 함은, 특히 개화기 시가에서 두드러졌던 개인의 감각이나 개성 표현 보다는 이념과 관념을 전달하는 타설적인 형식에서,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앞세운 자설적 형식으로의 변화이다. 자설적 형식은 곧 시에서의 “자아의 발견과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발이자 억압받던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이후 1920년대 시에서 자아의 발견 및 강조, 과거에의 회귀, 낭만적 정열, 에로스적 충동과 같은 도피 모티브 등 한국시의 근대성을 이루는 서정성 두드러진 것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시의 근대성을 본격적으로 표방한 주체가 1920년대의 시인들이라고 해도, 근대적인 시의 형식을 최초로 자각한 주체는 1910년대 시인들이었다. 즉,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오는 순간 근대적 시의 형식이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10년대부터 여러 시인들에 의해 인식되어 온 것이다. 1910년대의 신문과 잡지, 특히 학지광에 실린 시들은 자설적 형식과 매우 비슷한 시들이었는데, 대다수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활동에 그쳤고 내용면에서도 지극히 사사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격히 말해 근대시의 형식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는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개화기 시류의 시풍인 타설적 형식이 아직 남아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설적 형식의 추구가 혼재하는 근대시의 과도기이자 이후 1920년대의 시 특징으로 넘어가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를 흔히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대라고 여기지만 이 시기에는 두 시인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소년, 청춘, 학지광, 신문계 등 잡지나 신문을 통해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남선과 이광수는 물론이고 현상윤, 김억, 최승구, 김여제 등의 문인들은 서구 문화를 경험한 신지식인들로서 1910년대 시 문단을 주도하였다.
1) 소성(小星) 현상윤
현상윤은 평북 정주 출생으로 이광수최남선과 함께 활동한 문인이다. 주로 학지광과 청춘에 시, 소설, 수필, 평문을 다수 발표했다. <친구야 아느냐> 등의 그의 초기 시는 44조의 음수율을 기조로 하는 개화가사형의 작품들이나 후기로 가면서는, <웅커리로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형률을 벗어나 점차 자유시 형에 가까워져 간다. 그의 주제의식 또한 다소 주정적이고 개아적인 것들로, 시상을 어느 정도 내면화 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그의 후기 시는 1920년대에 본격화 되는 자유시에 이르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밖에 그는 러시아 산문시의 영향으로 산문시를 쓰기도 했고, 때로는 시조형의 시를 시도하기도 했다.
<요게 무어야?>
소리업시 자취업시 티미러오르는 요내가슴!
불이냐 안개냐 답답도하다
불이면은 끌것이요 안개이면 헤칠 것이로다.
그러나 불도안이오 안개도 안인듯,
그러면 연애(戀愛냐) 안이, 명리(名利)냐 안이
안이 무언가?
아아 심령(心靈)아 말하여라.
끝업고 얼굴업는 요게 무어라고
<웅커리로서>
배주리고 허울버슨 인자들아
웅커리로서 나아오라
영생의 양식, 영화의 옷이 여기에 싸여잇다.
고롬과 압흠에서 끗까지 익히고 끗까지 떨쳐보라-너희의 피 너희의 고기로
목마르고 속타하는 인자들아
웅커리로서 나아오라
생명의 샘 맑은 물이 여기에 훌러간다
절망과 낙심에서 마조막까지
참고 마조막까지 구하여라
너희의 힘 너희의 정성으로
현상윤은 식민지 조선현실을 낙원 상실의 이미지로 제시한 다음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서의 실력양성론을 강력주의라 이름하고 실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주의는 옳은 삶을 살겠다는 자기 다짐일수는 있어도 삶의 구체적인 전망이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처럼 현실 부정의 끝에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을 때 시인은 자신의 부조리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관념적인 이상주의로 치달아 가게 된다. 시 <요게 무어야?>가 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훈적 설교조의 <웅커리로서> 후자 경향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형태적으로 볼 때 두 시는 매우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는데, <요게 무어야?>가 1920년대 이후 일반화되는 개인 내면 묘사의 자유시 형을 아주 고급스럽게 선취하고 있다면 후자인 <웅커리로서>는 육당의 오류라고 부를 만한 정형률에의 강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시가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들이 자유시형의 완성기를 살아낸 시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 그 시형을 찾아가야 하는 근대 이행기 시인들이었음을 반증한다.
2) 유암(流暗) 김여제
김여제는 현상윤과 마찬가지로 평북 정주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많은 시 작품을 짓지는 않았으나, 학지광 5호에 실린 <산녀>를 비롯한 <한끗>, <잘짜> 등 몇 편의 시 작품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문제시 되는 작품들이다. 최남선이광수에 뒤이어 현상윤최소월김안서 등과 함께 1910년대 신체시단의 일원으로서 과도기적 징검다리 역할을 한 시인이다.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그대의 적은韻律이
萬人의 가슴을 흔들든 져날.
가즉이 그대의 발알에 없
2) 유암(流暗) 김여제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 <삼월일일(三月一日)>
3) 소월(素月) 최승구 <보월(步月)>
2. 최남선과 이광수
Ⅱ. 1920년대 시 경향
1. 3.1운동 이후 시의 생산과 수용
2. 1920년대 시 전개의 세 갈래
1) 낭만시 지향
1)-1. 주요한 <빗소리> / <샘물이 혼자서>
1)-2. 이상화 <비음(緋音)> / 박종화 <사의 예찬>
2) 카프 계열
2)-1. 이상화 <조소(嘲笑)> / <통곡(慟哭)>
2)-2. 김형원 <벌거숭이의 노래>
3) 민요시
3)-1. 김억 <오다가다>
3)-2. 김소월 <길>
3)-3. 한용운 <수의 비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1910년대 시 경향
1. 한국 근대시의 배경으로서의 1910년대
19세기 말 일제 강점기로 인한 서구 문화와의 접촉으로, 우리나라에는 서구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다. 서구의 시 문학 형식도 그 중의 하나로 이러한 서구시의 경험은 한국 근대시를 촉발하는 외부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근대시에서 근대성이라 함은, 특히 개화기 시가에서 두드러졌던 개인의 감각이나 개성 표현 보다는 이념과 관념을 전달하는 타설적인 형식에서,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앞세운 자설적 형식으로의 변화이다. 자설적 형식은 곧 시에서의 “자아의 발견과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발이자 억압받던 인간성의 회복이었다. 이후 1920년대 시에서 자아의 발견 및 강조, 과거에의 회귀, 낭만적 정열, 에로스적 충동과 같은 도피 모티브 등 한국시의 근대성을 이루는 서정성 두드러진 것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시의 근대성을 본격적으로 표방한 주체가 1920년대의 시인들이라고 해도, 근대적인 시의 형식을 최초로 자각한 주체는 1910년대 시인들이었다. 즉,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오는 순간 근대적 시의 형식이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10년대부터 여러 시인들에 의해 인식되어 온 것이다. 1910년대의 신문과 잡지, 특히 학지광에 실린 시들은 자설적 형식과 매우 비슷한 시들이었는데, 대다수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활동에 그쳤고 내용면에서도 지극히 사사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격히 말해 근대시의 형식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는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개화기 시류의 시풍인 타설적 형식이 아직 남아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설적 형식의 추구가 혼재하는 근대시의 과도기이자 이후 1920년대의 시 특징으로 넘어가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를 흔히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대라고 여기지만 이 시기에는 두 시인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소년, 청춘, 학지광, 신문계 등 잡지나 신문을 통해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남선과 이광수는 물론이고 현상윤, 김억, 최승구, 김여제 등의 문인들은 서구 문화를 경험한 신지식인들로서 1910년대 시 문단을 주도하였다.
1) 소성(小星) 현상윤
현상윤은 평북 정주 출생으로 이광수최남선과 함께 활동한 문인이다. 주로 학지광과 청춘에 시, 소설, 수필, 평문을 다수 발표했다. <친구야 아느냐> 등의 그의 초기 시는 44조의 음수율을 기조로 하는 개화가사형의 작품들이나 후기로 가면서는, <웅커리로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형률을 벗어나 점차 자유시 형에 가까워져 간다. 그의 주제의식 또한 다소 주정적이고 개아적인 것들로, 시상을 어느 정도 내면화 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그의 후기 시는 1920년대에 본격화 되는 자유시에 이르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밖에 그는 러시아 산문시의 영향으로 산문시를 쓰기도 했고, 때로는 시조형의 시를 시도하기도 했다.
<요게 무어야?>
소리업시 자취업시 티미러오르는 요내가슴!
불이냐 안개냐 답답도하다
불이면은 끌것이요 안개이면 헤칠 것이로다.
그러나 불도안이오 안개도 안인듯,
그러면 연애(戀愛냐) 안이, 명리(名利)냐 안이
안이 무언가?
아아 심령(心靈)아 말하여라.
끝업고 얼굴업는 요게 무어라고
<웅커리로서>
배주리고 허울버슨 인자들아
웅커리로서 나아오라
영생의 양식, 영화의 옷이 여기에 싸여잇다.
고롬과 압흠에서 끗까지 익히고 끗까지 떨쳐보라-너희의 피 너희의 고기로
목마르고 속타하는 인자들아
웅커리로서 나아오라
생명의 샘 맑은 물이 여기에 훌러간다
절망과 낙심에서 마조막까지
참고 마조막까지 구하여라
너희의 힘 너희의 정성으로
현상윤은 식민지 조선현실을 낙원 상실의 이미지로 제시한 다음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서의 실력양성론을 강력주의라 이름하고 실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주의는 옳은 삶을 살겠다는 자기 다짐일수는 있어도 삶의 구체적인 전망이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처럼 현실 부정의 끝에 구체적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을 때 시인은 자신의 부조리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관념적인 이상주의로 치달아 가게 된다. 시 <요게 무어야?>가 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훈적 설교조의 <웅커리로서> 후자 경향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형태적으로 볼 때 두 시는 매우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는데, <요게 무어야?>가 1920년대 이후 일반화되는 개인 내면 묘사의 자유시 형을 아주 고급스럽게 선취하고 있다면 후자인 <웅커리로서>는 육당의 오류라고 부를 만한 정형률에의 강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시가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들이 자유시형의 완성기를 살아낸 시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 그 시형을 찾아가야 하는 근대 이행기 시인들이었음을 반증한다.
2) 유암(流暗) 김여제
김여제는 현상윤과 마찬가지로 평북 정주 출신의 시인이다. 그는 많은 시 작품을 짓지는 않았으나, 학지광 5호에 실린 <산녀>를 비롯한 <한끗>, <잘짜> 등 몇 편의 시 작품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문제시 되는 작품들이다. 최남선이광수에 뒤이어 현상윤최소월김안서 등과 함께 1910년대 신체시단의 일원으로서 과도기적 징검다리 역할을 한 시인이다.
<萬萬波波息笛을 울음>
그대의 적은韻律이
萬人의 가슴을 흔들든 져날.
가즉이 그대의 발알에 없
키워드
추천자료
 1930년대 근대소설의 발전
1930년대 근대소설의 발전 [인문과학] 1970년대 문학의 내용과 문학사적 의의
[인문과학] 1970년대 문학의 내용과 문학사적 의의 30년대 모더니즘 시와 문학사적 의의
30년대 모더니즘 시와 문학사적 의의 1970년대 문학의 내용과 문학사적 의의
1970년대 문학의 내용과 문학사적 의의 [1960년대 한국 문학][1960년대][한국 문학][문학][실존주의][사회참여]1960년대 한국 문학(1...
[1960년대 한국 문학][1960년대][한국 문학][문학][실존주의][사회참여]1960년대 한국 문학(1... 1970년대한국문학비평사
1970년대한국문학비평사 [현대시]1930년대 프로시론 연구-김기진, 임화, 권환을 중심으로
[현대시]1930년대 프로시론 연구-김기진, 임화, 권환을 중심으로 1910~1920년대의 문학
1910~1920년대의 문학  1930년대 주지주의와 이미지즘 [현대문학의 태동] (모더니즘에 대해)
1930년대 주지주의와 이미지즘 [현대문학의 태동] (모더니즘에 대해)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론 - 김기림의 시론을 중심으로 -
1930년대 모더니즘 시론 - 김기림의 시론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 1930~1945년의 노동운동 - 시대적 상황과 노동자의 환경, 노동운동의 양상,...
[한국민족운동사] 1930~1945년의 노동운동 - 시대적 상황과 노동자의 환경, 노동운동의 양상,... 1930년대 프로시론
1930년대 프로시론 [현대문학사] 1930년~1945년대 전반의 시대적 배경과 시
[현대문학사] 1930년~1945년대 전반의 시대적 배경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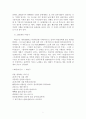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