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나례의 형태로 계속 전승되엇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 향가의 처용가와 고려 속요의 처용가는 모두 처용무나 처용희의 형태로 조선시대의 나례에 이르기까지 민속의 하나로 계속 전승되었을 뿐 아니라 처용희는 구나의식무(驅儺儀式舞)이면서 연극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즉 가면을 쓰고 잡귀를 물리치는 것은 구나의식의 부편적인 방식의 하나이며, 부락굿에서도 그러한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처용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고 역신과 대결한다는 점에서는 처용희를 연극이라고 할 만하다. 굿에서도 연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처용희의 근본적인 성격이겠으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복합되어 실제 공연되던 처용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처용희는 용신(龍神)ㆍ산신(山神)ㆍ불교(佛敎) 의식의 복합이다. 『악학궤범』에 전하는 처용희는 처용이 오방(五方) 처용으로 되고, 연화대학무(蓮花臺鶴舞)와 복합되 어있으며 여기(女妓)가 처용가에 이어서 <봉황음>, <삼진작> 등의 다른 노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의 처용희는 주로 궁중에서 거행되는 세말(歲末)의 나례(儺禮)에서 공연되었으나, 민간인의 처용희도 있었다. 의식무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기는 했으나, 놀이로서의 성격이 확대되었다. 영조(英祖) 이후에는 중단되었다가 1920년대에 <악학궤범>에 의거해서 다시 시작해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다.
원 문
전문 해석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샷다
(中葉) 어와 아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 향가의 처용가와 고려 속요의 처용가는 모두 처용무나 처용희의 형태로 조선시대의 나례에 이르기까지 민속의 하나로 계속 전승되었을 뿐 아니라 처용희는 구나의식무(驅儺儀式舞)이면서 연극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즉 가면을 쓰고 잡귀를 물리치는 것은 구나의식의 부편적인 방식의 하나이며, 부락굿에서도 그러한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처용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고 역신과 대결한다는 점에서는 처용희를 연극이라고 할 만하다. 굿에서도 연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처용희의 근본적인 성격이겠으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복합되어 실제 공연되던 처용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처용희는 용신(龍神)ㆍ산신(山神)ㆍ불교(佛敎) 의식의 복합이다. 『악학궤범』에 전하는 처용희는 처용이 오방(五方) 처용으로 되고, 연화대학무(蓮花臺鶴舞)와 복합되 어있으며 여기(女妓)가 처용가에 이어서 <봉황음>, <삼진작> 등의 다른 노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고려와 조선의 처용희는 주로 궁중에서 거행되는 세말(歲末)의 나례(儺禮)에서 공연되었으나, 민간인의 처용희도 있었다. 의식무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기는 했으나, 놀이로서의 성격이 확대되었다. 영조(英祖) 이후에는 중단되었다가 1920년대에 <악학궤범>에 의거해서 다시 시작해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다.
원 문
전문 해석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大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以是人生애 相不語시란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샷다
(中葉) 어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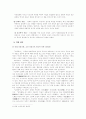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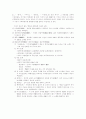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