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조 성립 시기 논의
Ⅱ. 16세기 시조 성립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Ⅲ. 16세기~18세기 시조 발전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1. 기녀시조
2. 전쟁관련 시조
3. 강호한정시조
4. 사설시조
Ⅳ. 19세기 시조 쇠퇴 및 소멸
Ⅴ. 정리표
Ⅵ. 참고문헌
Ⅱ. 16세기 시조 성립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Ⅲ. 16세기~18세기 시조 발전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1. 기녀시조
2. 전쟁관련 시조
3. 강호한정시조
4. 사설시조
Ⅳ. 19세기 시조 쇠퇴 및 소멸
Ⅴ. 정리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조 문학 양식의 史的 흐름에 대해서
- 목 차 -
Ⅰ. 시조 성립 시기 논의
Ⅱ. 16세기 시조 성립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Ⅲ. 16세기~18세기 시조 발전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1. 기녀시조
2. 전쟁관련 시조
3. 강호한정시조
4. 사설시조
Ⅳ. 19세기 시조 쇠퇴 및 소멸
Ⅴ. 정리표
Ⅵ. 참고문헌
지금부터 시조 문학 양식의 史的 흐름에 대해 얘기 하겠다.
지금까지 시조의 성립 시기에 대한 논의로는 고려 말 발생설, 15세기 발생설, 16세기 발생설 등 수없이 많은 발생설이 있었지만 이중에서도 나는 시조가 16세기에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성리학 이념과 시조 발생과의 상관성에서 성리학의 도입시기가 비록 고려이긴 하지만, 정착은 조선시대 이뤄졌으므로 오히려 시조의 형성 시기를 고려 말 보다는 조선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하여가(何如歌)」,「단심가(丹心歌)」는 노래로 한글이 발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단이 없어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조는 김천택의 청구영언에 실려 있는 것으로 18세기에 처음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과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기록된 작품이 원형 그대로 기록되었을 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 창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정몽주를 죽였을 때, 정몽주뿐만 아니라 무신 변한열 장군도 그 뜻을 달리하여 같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 변한열 장군이 부른 ‘불굴가’는 장시조 형태고 정몽주의 ‘단심가’는 단시조 형태로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같은 시기-장소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 형태가 비슷해야 하는데, 다르다는 것은 둘 중 한 쪽이 변형을 했다는 얘기인데, 장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불굴가가 변형되었다고 해도 ‘단심가’와 ‘하여가’는 변형이 안 되고, ‘불굴가’만 변형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시조의 고려 말 발생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역사 속의 사건으로 미뤄봤을 때 그렇게 한가롭게 정적끼리 만나 노래를 주고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후대의 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15세기에 시조가 발생하기에는 그 당시 조선사회가 사대부와 절대 권력을 쥐려는 임금과의 사이에 힘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대, 격변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 시조라는 정형화된 형식, 새로운 형식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조는 음악과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말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원을 악곡 ‘대엽조’라고 봤을 때, <현금동문유기>라는 문헌에 대엽조가 16세기에 성악곡으로서 불리었다는 구절이 있으니 여기서 시조가 16세기에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시조의 성립기는 나라의 기틀이 잡힌, 사회적 안정기인 16세기에 와서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시조들은 백성들의 시조사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의작해서 시조사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16세기, 성립기 때의 시조는 대체로 내용적으로는 유교사상과 노장사상이 융합된 관조적인 세계와 체념적이며 유유자적한 한정의 노래, 자연을 읊은 노래, 그리고 유교적 교의에 입각한 선비들의 교훈적 시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연시조도 보였지만, 대체로 3장 4음보격이며, 45자 내외로 된 비연시인 3행의 정형의 형태- 단시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16세기에는 단형의 시조와 장형의 시조가 모두 공존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16세기에 시조가 성립이 됐다고 말하려면 그 기준작품이 흔히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되는데, 이 작품의 형식이 연시조라는 것이다. 즉, 시조 형식이 장형시조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형시조에서 단형시조로 전개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난, 성립기 시조의 첫 출발은 이황의 ‘도산십이곡’으로 장형의 시조였지만 사대부 계층들이 유교적 교의에 대해 얘기하고, 한정의 노래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장형보다는 단형의 형식이 더 알맞아 ‘도산십이곡’ 작품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단시조로 전개됐다고 생각한다. 즉,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연시조로서 하나의 실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와 향유자 모두 지식층인 사대부 계층, 양반계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더불어 이러한 노래를 전승해준 기녀들도 향유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황, 이이, 이현보, 송순, 정철, 조식 등을 들 수 있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황
(1)이런 엇더며 뎌런 엇다료
草野愚生(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료
려 泉石膏(천석 고황)을 고텨 므슴료
(2)煙霞(연하)로 지블 삼고 風月(풍월)로 버들사마
太平聖代(태평 성대)예 病(병)으로 늘거나뇌
이듕에 바라 이른 허믈이나 업고쟈
(3)淳風(순풍)이 죽다니 眞實(진실)로 거즈마리
人生(인생)이 어디다 니 眞實(진실)로 올 마리
天下(천하)애 許多英才(허다 영재)를 소겨 말솜가
- 중 략-
(10)當時(당시)예 녀던 길흘 몃를 려 두고
어듸 가 니다가 이제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듸 마로리
(11)靑山(청산) 엇뎨야 萬古(만고)애 프르르며
流水(유수) 엇뎨야 晝夜(주야)애 긋디 아니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 호리라
(12)愚夫(우부)도 알며 거니 긔 아니 쉬운가
聖人(성인)도
- 목 차 -
Ⅰ. 시조 성립 시기 논의
Ⅱ. 16세기 시조 성립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Ⅲ. 16세기~18세기 시조 발전 (내용, 형식, 작가, 향유자, 작품)
1. 기녀시조
2. 전쟁관련 시조
3. 강호한정시조
4. 사설시조
Ⅳ. 19세기 시조 쇠퇴 및 소멸
Ⅴ. 정리표
Ⅵ. 참고문헌
지금부터 시조 문학 양식의 史的 흐름에 대해 얘기 하겠다.
지금까지 시조의 성립 시기에 대한 논의로는 고려 말 발생설, 15세기 발생설, 16세기 발생설 등 수없이 많은 발생설이 있었지만 이중에서도 나는 시조가 16세기에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성리학 이념과 시조 발생과의 상관성에서 성리학의 도입시기가 비록 고려이긴 하지만, 정착은 조선시대 이뤄졌으므로 오히려 시조의 형성 시기를 고려 말 보다는 조선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하여가(何如歌)」,「단심가(丹心歌)」는 노래로 한글이 발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단이 없어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조는 김천택의 청구영언에 실려 있는 것으로 18세기에 처음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과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기록된 작품이 원형 그대로 기록되었을 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 창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정몽주를 죽였을 때, 정몽주뿐만 아니라 무신 변한열 장군도 그 뜻을 달리하여 같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 변한열 장군이 부른 ‘불굴가’는 장시조 형태고 정몽주의 ‘단심가’는 단시조 형태로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같은 시기-장소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그 형태가 비슷해야 하는데, 다르다는 것은 둘 중 한 쪽이 변형을 했다는 얘기인데, 장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불굴가가 변형되었다고 해도 ‘단심가’와 ‘하여가’는 변형이 안 되고, ‘불굴가’만 변형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시조의 고려 말 발생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역사 속의 사건으로 미뤄봤을 때 그렇게 한가롭게 정적끼리 만나 노래를 주고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후대의 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15세기에 시조가 발생하기에는 그 당시 조선사회가 사대부와 절대 권력을 쥐려는 임금과의 사이에 힘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대, 격변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 시조라는 정형화된 형식, 새로운 형식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조는 음악과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말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원을 악곡 ‘대엽조’라고 봤을 때, <현금동문유기>라는 문헌에 대엽조가 16세기에 성악곡으로서 불리었다는 구절이 있으니 여기서 시조가 16세기에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시조의 성립기는 나라의 기틀이 잡힌, 사회적 안정기인 16세기에 와서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시조들은 백성들의 시조사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의작해서 시조사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16세기, 성립기 때의 시조는 대체로 내용적으로는 유교사상과 노장사상이 융합된 관조적인 세계와 체념적이며 유유자적한 한정의 노래, 자연을 읊은 노래, 그리고 유교적 교의에 입각한 선비들의 교훈적 시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연시조도 보였지만, 대체로 3장 4음보격이며, 45자 내외로 된 비연시인 3행의 정형의 형태- 단시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16세기에는 단형의 시조와 장형의 시조가 모두 공존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16세기에 시조가 성립이 됐다고 말하려면 그 기준작품이 흔히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되는데, 이 작품의 형식이 연시조라는 것이다. 즉, 시조 형식이 장형시조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형시조에서 단형시조로 전개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난, 성립기 시조의 첫 출발은 이황의 ‘도산십이곡’으로 장형의 시조였지만 사대부 계층들이 유교적 교의에 대해 얘기하고, 한정의 노래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장형보다는 단형의 형식이 더 알맞아 ‘도산십이곡’ 작품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단시조로 전개됐다고 생각한다. 즉,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연시조로서 하나의 실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와 향유자 모두 지식층인 사대부 계층, 양반계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더불어 이러한 노래를 전승해준 기녀들도 향유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황, 이이, 이현보, 송순, 정철, 조식 등을 들 수 있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황
(1)이런 엇더며 뎌런 엇다료
草野愚生(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료
려 泉石膏(천석 고황)을 고텨 므슴료
(2)煙霞(연하)로 지블 삼고 風月(풍월)로 버들사마
太平聖代(태평 성대)예 病(병)으로 늘거나뇌
이듕에 바라 이른 허믈이나 업고쟈
(3)淳風(순풍)이 죽다니 眞實(진실)로 거즈마리
人生(인생)이 어디다 니 眞實(진실)로 올 마리
天下(천하)애 許多英才(허다 영재)를 소겨 말솜가
- 중 략-
(10)當時(당시)예 녀던 길흘 몃를 려 두고
어듸 가 니다가 이제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듸 마로리
(11)靑山(청산) 엇뎨야 萬古(만고)애 프르르며
流水(유수) 엇뎨야 晝夜(주야)애 긋디 아니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 호리라
(12)愚夫(우부)도 알며 거니 긔 아니 쉬운가
聖人(성인)도
키워드
추천자료
 송강 정철의 생애와 그의 문학
송강 정철의 생애와 그의 문학 기녀문학(妓女文學)에 대해
기녀문학(妓女文學)에 대해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한국 고대 중세 근대의 문학적 특성
한국 고대 중세 근대의 문학적 특성 중국 고대문학
중국 고대문학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학사적 의의 연구
'해에게서 소년에게' 문학사적 의의 연구 노계 박인로의 생애와 문학사상
노계 박인로의 생애와 문학사상 [시][시문학][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1950년대(][1980년대][1990년대]1920년대 시(시...
[시][시문학][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1950년대(][1980년대][1990년대]1920년대 시(시... 시가(시가문학)와 전환기시가, 시가(시가문학)와 개화기시가, 시가(시가문학)와 신라시대시가...
시가(시가문학)와 전환기시가, 시가(시가문학)와 개화기시가, 시가(시가문학)와 신라시대시가... [현대시, 현대시 양상, 현대시 전개, 현대시와 정전, 현대시와 환유, 현대시와 문학, 현대시...
[현대시, 현대시 양상, 현대시 전개, 현대시와 정전, 현대시와 환유, 현대시와 문학, 현대시... [고산 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생애, 작품연구,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 어부사시사의 원문, ...
[고산 윤선도]고산 윤선도의 생애, 작품연구,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 어부사시사의 원문, ... [작품해석][작품][해석][여류시조][금오신화][고려가요 가시리][청산별곡][시인 홍희표]여류...
[작품해석][작품][해석][여류시조][금오신화][고려가요 가시리][청산별곡][시인 홍희표]여류...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공통] '고전'의 가치와 잡지 문장파 근대예술가들의 지향점을 나름대...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공통] '고전'의 가치와 잡지 문장파 근대예술가들의 지향점을 나름대... 황진이 문학과 대중매체에 반영된 그녀
황진이 문학과 대중매체에 반영된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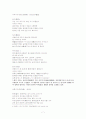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