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역언어(방언, 사투리)의 정의
Ⅲ. 지역언어(방언, 사투리)의 가치
Ⅳ.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필요성
1. 지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
2. 지역 언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함
3. 지역 언어 및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름
4. 지역 언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Ⅴ.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전제
Ⅵ.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내용
Ⅶ. 향후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지역언어(방언, 사투리)의 정의
Ⅲ. 지역언어(방언, 사투리)의 가치
Ⅳ.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필요성
1. 지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
2. 지역 언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함
3. 지역 언어 및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름
4. 지역 언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Ⅴ.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전제
Ⅵ.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내용
Ⅶ. 향후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한 언어의 하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이 어려서 깨치게 되는 언어는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서, 이 지역 언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라는 지역의 언어로서, 더 좁게는 진주 사람들은 진주 지역의 언어를 통하여 그 지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저 막연한 것이요, 그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아리송한 것일 뿐이다. 이 정체성을 좀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어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해당 지역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깨쳐 알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역 언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함
지역 언어 교육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끼리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 교육이 필요하듯이 지역 언어도 이를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통된 어형을 사용하고, 공통된 의미로 사용하고, 공통된 문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도해야만 지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언어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역 언어 및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름
또한 지역 언어 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역할은 한다. 지역 언어란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두루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말을 잘 알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게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말에 대한 애착을 갖고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지역 언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지역 언어는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유산임은 물론이요, 지역 언어 속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언어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화를 잘 계승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 언어의 특정한 어휘 체계는 지역민들의 오랜 삶의 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잘 계승되어야만 그 지역민이 오래 세월을 겪으며 형성해 온 세계관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 언어에는 그 지역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다. 이 결함은 공통어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음은 물론이요, 그 지역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경상도 방언에는 모음의 수효가 6개인 지역이 많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음 ‘ㅔ’와 ‘ㅐ’가 변별되지 않아서 ‘게 : 개, 배 : 베, 제목 : 재목, 산새 : 산세’의 대립이 없어 이들 각각이 동음이의어가 되어 있다. 또 모음 ‘ㅡ’와 ‘ㅓ’도 변별되지 않아 ‘늘 : 널, 확증 : 확정, 긋다 : 걷다, 들다 : 덜다’도 대립되지 않고 동음이의어로 문맥에 따라서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경남 방언에서는 자음 뒤에 이중모음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아서 ‘대표’는 ‘대포’로, ‘발표’는 ‘발포’로, ‘형주’는 ‘행주’로, ‘휴지’는 ‘후지’로 발음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구분들을 공통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어와 같이 발음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론 매체의 영향과 표준어 교육에 의해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교육은 지역 언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Ⅴ.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전제
국어의 표준어는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만든「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사용해 오다, 1988년 1월 19일에 문교부에서「표준어규정」을 고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표준어가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2부는 표준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표준이 되는 단어를 사정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제2부에서는 표준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규정」에 명시된 표준어를 말한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어는 방언과 여러 모로 다르다. 음운도 다르고, 어휘, 문법도 다르다. 먼저 음운을 보면, 자음 체계의 경우는 어느 방언이든지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경상도 방언의 경우만, 동부 지역의 자음 체계에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음 체계는 단모음의 경우, 표준어는 10개의 단모음으로 되어 있으나, 방언의 경우는 6개~10개로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모음도 단모음의 수가 다름에 따라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운소의 경우는 표준어는 장단이 어휘를 변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경상도 방언은 고저로 어휘가 변별된다. 음운의 결합 방식은 표준어와 방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경상도 방언의 경우만 초성에 이응 음이 실현되고 있다. 음운의 변동은 표준어와 방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남 방언의 경우를 보면, 표준어에는 없는 모음 완전 동화 규칙, /ㅎ/의 /ㄱ/되기, 전설모음화가 있으며, 표준어와는 양상이 다른 겹받침 줄이기, /ㅣ/치닮기, 모음조화 등이 있고, 표준어에 있는 /ㅂ/불규칙 활용, /ㅅ/불규칙 활용이 없다.
어휘에 있어서는 각 방언은 표준어와 어형이 다른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며, 옛말 중에서 방언에만 살아남은 어휘가 있으며, 특정 방언에서만 쓰이는 어휘들이 있다. 경남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어와 다른 어형으로는 통시적 구개음화를 겪어 형성된 ‘밀찌울/밀찌불/밀찌부리/밀찌부리기(밀기울), 올체/올치(올케), 저드랑(이)/저트랑(이)(겨드랑(이)), 저실/저을(겨울[冬]),
그런데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저 막연한 것이요, 그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아리송한 것일 뿐이다. 이 정체성을 좀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어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해당 지역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깨쳐 알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역 언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함
지역 언어 교육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끼리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어를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 교육이 필요하듯이 지역 언어도 이를 더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통된 어형을 사용하고, 공통된 의미로 사용하고, 공통된 문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도해야만 지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언어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역 언어 및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름
또한 지역 언어 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역할은 한다. 지역 언어란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두루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말을 잘 알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게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말에 대한 애착을 갖고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지역 언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지역 언어는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유산임은 물론이요, 지역 언어 속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언어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화를 잘 계승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 언어의 특정한 어휘 체계는 지역민들의 오랜 삶의 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잘 계승되어야만 그 지역민이 오래 세월을 겪으며 형성해 온 세계관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 언어에는 그 지역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다. 이 결함은 공통어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음은 물론이요, 그 지역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경상도 방언에는 모음의 수효가 6개인 지역이 많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음 ‘ㅔ’와 ‘ㅐ’가 변별되지 않아서 ‘게 : 개, 배 : 베, 제목 : 재목, 산새 : 산세’의 대립이 없어 이들 각각이 동음이의어가 되어 있다. 또 모음 ‘ㅡ’와 ‘ㅓ’도 변별되지 않아 ‘늘 : 널, 확증 : 확정, 긋다 : 걷다, 들다 : 덜다’도 대립되지 않고 동음이의어로 문맥에 따라서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경남 방언에서는 자음 뒤에 이중모음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아서 ‘대표’는 ‘대포’로, ‘발표’는 ‘발포’로, ‘형주’는 ‘행주’로, ‘휴지’는 ‘후지’로 발음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구분들을 공통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어와 같이 발음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론 매체의 영향과 표준어 교육에 의해 다소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교육은 지역 언어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Ⅴ. 지역언어(방언, 사투리)교육의 전제
국어의 표준어는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만든「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사용해 오다, 1988년 1월 19일에 문교부에서「표준어규정」을 고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표준어가 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는 표준어 사정 원칙, 제2부는 표준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표준이 되는 단어를 사정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제2부에서는 표준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규정」에 명시된 표준어를 말한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어는 방언과 여러 모로 다르다. 음운도 다르고, 어휘, 문법도 다르다. 먼저 음운을 보면, 자음 체계의 경우는 어느 방언이든지 표준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경상도 방언의 경우만, 동부 지역의 자음 체계에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음 체계는 단모음의 경우, 표준어는 10개의 단모음으로 되어 있으나, 방언의 경우는 6개~10개로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모음도 단모음의 수가 다름에 따라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운소의 경우는 표준어는 장단이 어휘를 변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경상도 방언은 고저로 어휘가 변별된다. 음운의 결합 방식은 표준어와 방언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경상도 방언의 경우만 초성에 이응 음이 실현되고 있다. 음운의 변동은 표준어와 방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남 방언의 경우를 보면, 표준어에는 없는 모음 완전 동화 규칙, /ㅎ/의 /ㄱ/되기, 전설모음화가 있으며, 표준어와는 양상이 다른 겹받침 줄이기, /ㅣ/치닮기, 모음조화 등이 있고, 표준어에 있는 /ㅂ/불규칙 활용, /ㅅ/불규칙 활용이 없다.
어휘에 있어서는 각 방언은 표준어와 어형이 다른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으며, 옛말 중에서 방언에만 살아남은 어휘가 있으며, 특정 방언에서만 쓰이는 어휘들이 있다. 경남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어와 다른 어형으로는 통시적 구개음화를 겪어 형성된 ‘밀찌울/밀찌불/밀찌부리/밀찌부리기(밀기울), 올체/올치(올케), 저드랑(이)/저트랑(이)(겨드랑(이)), 저실/저을(겨울[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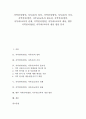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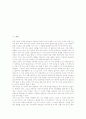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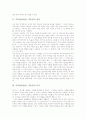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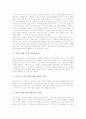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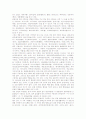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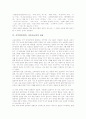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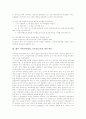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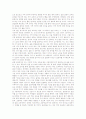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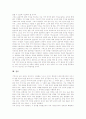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