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목차
第四十九回 端禮門立碑誣正士 河湟路遣將復西蕃
제사십구회 단례문립비무정사 하황로견장복서번
송사통속연의 제 49회 단례문에 비석을 세워 바른 선비를 헐뜯고 하황로에 장수를 보내 서번을 회복하다.
第五十回 應供奉朱勔承差 得奧援蔡京復相
제오십회 응공봉주면승차 득오원채경복상
제 50회 응당 주면을 받들어 사신으로 보내서 채경을 배경으로 다시 재상으로 된다.
제사십구회 단례문립비무정사 하황로견장복서번
송사통속연의 제 49회 단례문에 비석을 세워 바른 선비를 헐뜯고 하황로에 장수를 보내 서번을 회복하다.
第五十回 應供奉朱勔承差 得奧援蔡京復相
제오십회 응공봉주면승차 득오원채경복상
제 50회 응당 주면을 받들어 사신으로 보내서 채경을 배경으로 다시 재상으로 된다.
본문내용
第四十九回 端禮門立碑誣正士 河湟路遣將復西蕃
제사십구회 단례문립비무정사 하황로견장복서번
송사통속연의 제 49회 단례문에 비석을 세워 바른 선비를 헐뜯고 하황로에 장수를 보내 서번을 회복하다.
說徽宗信鄧洵武言,欲重用蔡京,且因京入都陳言,力請紹述,遂再詔改元,定爲崇寧二字,隱示尊崇 尊崇 [znchong] : 존숭하다, 우러러 존경하다
熙寧的意思。
각설휘종기신등순무언 욕중용채경 차인경입도진언 력청소술 수재조개원 정위숭녕이자 은시존숭희녕적의사.
각설하고 휘종이 이미 등순무의 말을 믿고 채경을 중용하려고 하며 채경을 도읍에 들어와 말을 하게 하며 힘주어 전통계승을 청하니 곧 다시 개원을 조서로 내려 숭녕이란 두 글자로 하니 은밀히 희녕 연호때를 존중 숭상한다는 뜻이 있다.
擢洵武爲中書舍人給事中,兼職侍講,復蔡卞、邢恕、呂嘉問、安惇、蹇序辰官 辰官: 국무 행정 각부의장
.
탁순무위중서사인급사중 겸직시강 부채변 형서 여가문 안돈 건서진관
등순무를 중서사인급사중으로 발탁하며 직시강을 겸하게 하며 채변, 형서, 여가문, 안돈 , 건서를 진관으로 삼았다.
罷禮部書稷,出知蘇州,再罷書左僕射韓忠,出知大名府.
파예부상서풍직 출지소주 재파상서좌복야한충언 출지대명부.
예부상서인 풍직을 파면해 소주지사로 내보내며 재차 상서좌복야인 한충언을 대명부지사로 강등했다.
追貶司馬光、文博等四十四人官階,籍元佑、元符黨人,不得再與差遣 差遣:사람을 시켜서 보냄
。
추폄사마광 문언박등사십사인관계 적원우 원부당인 부득재여차견.
사마광, 문언박등의 44명의 관직등급을 폄하하며 원우, 원부의 당 사람의 적에 있으면 다시
又詔司馬光等子弟,毋得官京師。
우조사마광등자제 무득관경사.
또 사마광등의 자제에 조서를 내려 수도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게 했다.
進許將爲門下侍,許益爲中書侍,蔡京爲書左丞,趙挺之爲書右丞。
진허장위문하시랑 허익위중서시랑 채경위상서좌승 조정지위상서우승.
허장을 문하시랑으로 허익을 중서시랑으로, 채경을 상서좌승으로 조정지를 상서우승으로 승진시켰다.
自韓忠去位,惟曾布當國,力主紹述,因此熙邪黨,陸續進用。
자한충언거위 유증포당국 력주소술 인차희풍사당 육속진용.
한충언은 지위를 버리고 간 뒤로 오직 증포가 나라를 담당하며 힘주어 계승발전을 주창하니 이로 기인하여 희풍의 사악한 당파는 계속 승진과 등용되었다.
蔡京亦由布引入,但京本與布有隙,反日夜圖布,陰作以牛易羊的思想.
채경역유포인입 단경본여포유극 반일야도포 음작이우역양적사상
布亦稍稍覺着,奈京已深得主眷,一時無從逐 (쫓을 련{연}; -총18획; nian)逐 [ninzhu] 뜻 쫓아내다
,只好虛與委蛇 委蛇 [wiyi] :구불구불한 모양, 순종하는 모양, 따르다
虛與委蛇:겉으로만 추종(追從)함 또는 짐짓 좋은 체한다는 뜻이다.
出典: 장자(莊子) 제7 응제왕(應帝王)편.
정(鄭)나라에 계함(季咸)이라는 신들린 무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 자신의 일을 예언할까 두려워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열자(列子)는 계함을 만나고 몹시 기분이 좋아서, 스승인 호자(壺子)에게 이 일을 말했다.
열자는 스승 호자와 함께 계함에게 점을 쳐달라고 했다. 계함은 점을 펴보더니 이렇게 열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스승에게서 괴상한 상을 보았는데, 그는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오.\"
열자가 호자에게 이 말을 전하자, 호자는 말했다.
\"그럴 것이다. 아까 나는 계함에게 산처럼 육중하여 움직이지도 멈추지도 않는 땅의 상(相)을 보였다. 그는 아마 그 상을 보았으리라. 내일 다시 그를 불러 시험해보도록 해라.\"
다음 날, 계함은 호자를 만나고 나서 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오. 당신의 스승은 아주 생기가 있었소. 그의 병은 다 나은 것이오.\" 열자가 계함의 말을 호자에게 전하자, 호자는 말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하늘의 상을 보여주었으니, 그는 아마 나의 생명의 기미를 보았을 것이다. 내일 다시 그를 불러 보아라.\"
사흘 째 되던 날, 계함은 호자의 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상을 볼 수가 없소. 그의 상은 늘 변하여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오.\"
다음 날, 열자는 계함과 함께 호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계함은 호자의 모습을 보자 곧 도망하였다. 열자가 쫓아갔는데 그를 잡지 못하였다. 호자가 열자에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사물의 변화에 따라 순순히 따랐으므로, 계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吾與之虛而委蛇, 不知其誰何]. 그는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흐르는 대로 흐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다. .... \" 열자는 자기의 학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삼 년 동안 문밖을 나오지 않고, 그의 아내 대신 밥을 짓기도 하고, 돼지 먹이기를 사람 먹이듯 했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특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인위를 버리고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 마치 생각도 마음도 없는 흙과 같은 모습을 한 채 우뚝 서서 모든 것을 혼돈에 맡기고 그대로 평생을 마쳤다
。
포역초초각착 즘내경이심득주권 일시무종련축 지호허여위이
증포도 또한 조금씩 깨달아 가나 어찌 채경이 이미 깊이 주상의 총애를 얻어서 일시에
제사십구회 단례문립비무정사 하황로견장복서번
송사통속연의 제 49회 단례문에 비석을 세워 바른 선비를 헐뜯고 하황로에 장수를 보내 서번을 회복하다.
說徽宗信鄧洵武言,欲重用蔡京,且因京入都陳言,力請紹述,遂再詔改元,定爲崇寧二字,隱示尊崇 尊崇 [znchong] : 존숭하다, 우러러 존경하다
熙寧的意思。
각설휘종기신등순무언 욕중용채경 차인경입도진언 력청소술 수재조개원 정위숭녕이자 은시존숭희녕적의사.
각설하고 휘종이 이미 등순무의 말을 믿고 채경을 중용하려고 하며 채경을 도읍에 들어와 말을 하게 하며 힘주어 전통계승을 청하니 곧 다시 개원을 조서로 내려 숭녕이란 두 글자로 하니 은밀히 희녕 연호때를 존중 숭상한다는 뜻이 있다.
擢洵武爲中書舍人給事中,兼職侍講,復蔡卞、邢恕、呂嘉問、安惇、蹇序辰官 辰官: 국무 행정 각부의장
.
탁순무위중서사인급사중 겸직시강 부채변 형서 여가문 안돈 건서진관
등순무를 중서사인급사중으로 발탁하며 직시강을 겸하게 하며 채변, 형서, 여가문, 안돈 , 건서를 진관으로 삼았다.
罷禮部書稷,出知蘇州,再罷書左僕射韓忠,出知大名府.
파예부상서풍직 출지소주 재파상서좌복야한충언 출지대명부.
예부상서인 풍직을 파면해 소주지사로 내보내며 재차 상서좌복야인 한충언을 대명부지사로 강등했다.
追貶司馬光、文博等四十四人官階,籍元佑、元符黨人,不得再與差遣 差遣:사람을 시켜서 보냄
。
추폄사마광 문언박등사십사인관계 적원우 원부당인 부득재여차견.
사마광, 문언박등의 44명의 관직등급을 폄하하며 원우, 원부의 당 사람의 적에 있으면 다시
又詔司馬光等子弟,毋得官京師。
우조사마광등자제 무득관경사.
또 사마광등의 자제에 조서를 내려 수도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게 했다.
進許將爲門下侍,許益爲中書侍,蔡京爲書左丞,趙挺之爲書右丞。
진허장위문하시랑 허익위중서시랑 채경위상서좌승 조정지위상서우승.
허장을 문하시랑으로 허익을 중서시랑으로, 채경을 상서좌승으로 조정지를 상서우승으로 승진시켰다.
自韓忠去位,惟曾布當國,力主紹述,因此熙邪黨,陸續進用。
자한충언거위 유증포당국 력주소술 인차희풍사당 육속진용.
한충언은 지위를 버리고 간 뒤로 오직 증포가 나라를 담당하며 힘주어 계승발전을 주창하니 이로 기인하여 희풍의 사악한 당파는 계속 승진과 등용되었다.
蔡京亦由布引入,但京本與布有隙,反日夜圖布,陰作以牛易羊的思想.
채경역유포인입 단경본여포유극 반일야도포 음작이우역양적사상
布亦稍稍覺着,奈京已深得主眷,一時無從逐 (쫓을 련{연}; -총18획; nian)逐 [ninzhu] 뜻 쫓아내다
,只好虛與委蛇 委蛇 [wiyi] :구불구불한 모양, 순종하는 모양, 따르다
虛與委蛇:겉으로만 추종(追從)함 또는 짐짓 좋은 체한다는 뜻이다.
出典: 장자(莊子) 제7 응제왕(應帝王)편.
정(鄭)나라에 계함(季咸)이라는 신들린 무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 자신의 일을 예언할까 두려워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열자(列子)는 계함을 만나고 몹시 기분이 좋아서, 스승인 호자(壺子)에게 이 일을 말했다.
열자는 스승 호자와 함께 계함에게 점을 쳐달라고 했다. 계함은 점을 펴보더니 이렇게 열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스승에게서 괴상한 상을 보았는데, 그는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오.\"
열자가 호자에게 이 말을 전하자, 호자는 말했다.
\"그럴 것이다. 아까 나는 계함에게 산처럼 육중하여 움직이지도 멈추지도 않는 땅의 상(相)을 보였다. 그는 아마 그 상을 보았으리라. 내일 다시 그를 불러 시험해보도록 해라.\"
다음 날, 계함은 호자를 만나고 나서 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오. 당신의 스승은 아주 생기가 있었소. 그의 병은 다 나은 것이오.\" 열자가 계함의 말을 호자에게 전하자, 호자는 말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하늘의 상을 보여주었으니, 그는 아마 나의 생명의 기미를 보았을 것이다. 내일 다시 그를 불러 보아라.\"
사흘 째 되던 날, 계함은 호자의 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상을 볼 수가 없소. 그의 상은 늘 변하여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오.\"
다음 날, 열자는 계함과 함께 호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계함은 호자의 모습을 보자 곧 도망하였다. 열자가 쫓아갔는데 그를 잡지 못하였다. 호자가 열자에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사물의 변화에 따라 순순히 따랐으므로, 계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吾與之虛而委蛇, 不知其誰何]. 그는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흐르는 대로 흐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다. .... \" 열자는 자기의 학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삼 년 동안 문밖을 나오지 않고, 그의 아내 대신 밥을 짓기도 하고, 돼지 먹이기를 사람 먹이듯 했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특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인위를 버리고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 마치 생각도 마음도 없는 흙과 같은 모습을 한 채 우뚝 서서 모든 것을 혼돈에 맡기고 그대로 평생을 마쳤다
。
포역초초각착 즘내경이심득주권 일시무종련축 지호허여위이
증포도 또한 조금씩 깨달아 가나 어찌 채경이 이미 깊이 주상의 총애를 얻어서 일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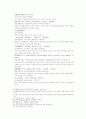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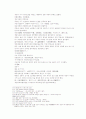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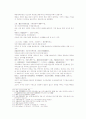







소개글